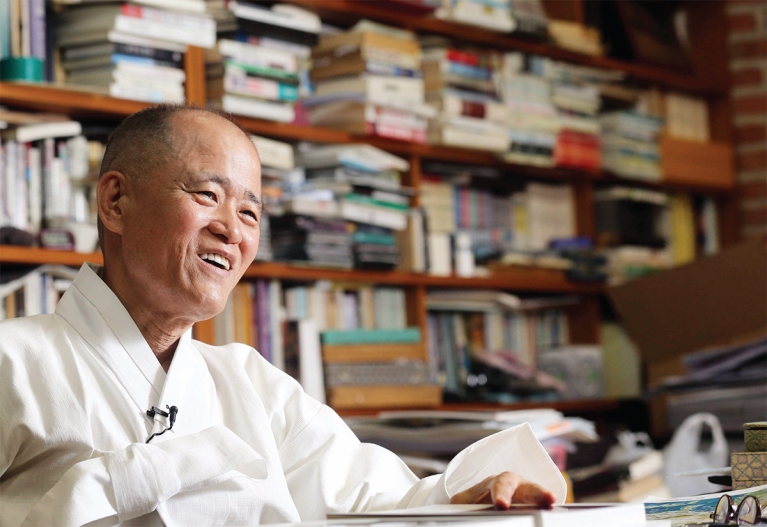그리스인의 ‘생명론적 시간’에 한반도 시운(時運) 살필 수 있는 예지 깃들어…
자기보존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북한을 여유 있게 조망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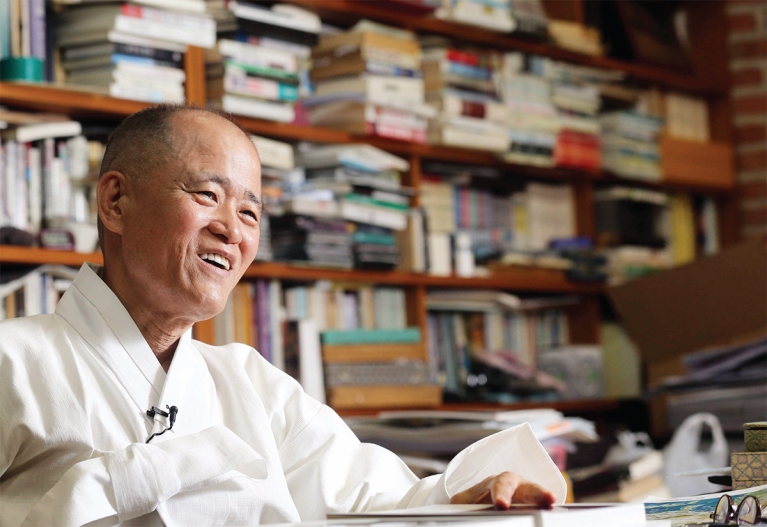
▎도올 김용옥은 특별기고를 통해 “우리민족의 중대한 위기는 오직 우리민족 스스로의 무지가 만들고 있을 뿐”이라 일갈했다. / 사진·중앙포토 |
|
4월 창간호부터 도올 김용옥의 장녀 김승중 토론토대 교수(그리스 미술고고학)가 <그리스 예술과 문명, 그 절정의 순간들>을 연재한다. 김승중 교수는 미 프린스턴대에서 천체물리학 박사, 이어 콜럼비아대학의 예술사고고학과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은 독보적 재원이다. 도올은 김승중 교수의 연재글이 갖는 ‘시간사적’ 의미를 그리스 미술사의 독창적 개관을 통해 웅대하게 전개했다. 20세기야말로 시공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만개한 백화노방의 시기다. 도올이 특별기고를 통해 주목한 것도 김승중 교수가 개진한 그리스인의 ‘생명론적 시간의 계기’다. 도올은 한반도 역시 평화와 생명의 분수령적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본다. 필요한 것은 발상의 대전환이다. 그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국운이 열린다는 도올의 주장을 독자와 함께 경청해본다. <편집자>
▎사모스 섬에 남아 있는 헤라 신전.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을 모신 신전으로 BC 7~6세기에 건립되었다. 그리스 신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한다. 여러 번 파괴되고 수복되어 34개의 기둥만 남았다. / 사진·중앙포토 |
|
그리스미술사는 사계의 학자들에 의하여 대강 다음의 몇 시기로 구분되어 논의된다.(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암흑기(Dark Age): BC 12세기~BC 9세기2) 기하학적 시기(Geometric Period): BC 900년경~BC 700년경3) 동방화 시기(Orientalizing Period): BC 700년경~BC 600년경4) 아르케익(상고) 시기(Archaic Period): BC 650~BC 480년경5) 초기 고전시대(Early Classical Period): BC 500년경~BC 450년경6) 전성기 고전시대(High Classical Period): BC 450년경~BC 400년경7) 후기 고전시대(Late Classical Period): BC 400년경~BC 323년8) 헬레니스틱 시대(Hellenistic Age): BC 323~BC 30년‘암흑기(Dark Age)’라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희랍적 예술을 탄생시키기 위한 태동기를 말하는 것이며, 이 시기까지의 희랍문명[정확하게 말하면 에게문명(Achaeans)]의 주축은 아테네가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미케네(Mycenae)였다. 미케네 문명은 리니어B문자(Linear B script: 크레테Crete 섬에서 BC 3000년부터 BC 1100년까지 융성한 미노아 문명Minoan Civilization이 남긴 리니어A문자Linear Ascript와 대비하여 부르는 고문자. 이 문자들은 모두 희랍어의 조형인데, B는 A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재 A문자는 해독이 어렵고, B문자는 1952년 미카엘 벤트리스 Michael Ventris에 의하여 해독되었다. 이 B문자는 희랍방언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최고最古의 형태이며 호머의 언어의 조형임을 알 수 있다. 희랍언어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데 지극히 중요하다)를 남겼기 때문에 최근 그 문명의 실제 모습에 관하여 일상적 생활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미케네 문명을 특징짓는 것 중의 하나가 ‘말’이다. 미케네의 전사는 항상 전차를 활용한다. 포세이돈(Poseidon: 히포스Hippos, 히피오스Hippios) 숭배의 족보는 미케네 문명으로 올라간다. 말의 관념은 희랍인의 신화적 상상력의 복합구조 속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말은 습기(moisture), 지하수, 지하세계, 풍작(fertility), 바람, 폭풍, 구름, 태풍과 연상되어 있다.기원전 15세기부터 미케네 사람들은 에게 바다를 건너 크레테의 미노아 문명을 정복한다(BC 1450년경). 그리고 이집트를 치고, 히타이트 제국을 공략한다. 그리고 로도스(Rhodes) 섬을 정복하여 식민지를 건설하고, 아나톨리아(지금의 터키 지역)의 에게 바다 해안 도시들을 식민지로 삼는다. 아마도 트로이전쟁(Troyan War)은 이 팽창시기에 이루어진 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트로이는 히타이트 제국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강력한 도시국가였다. ‘미케네 사람들(the Mycenaeans)’이라는 이름은 호머의 대서사시 속에서 아가멤논왕(King Agamemnon)의 수도로서 그려진 언덕 위의 성채, 미케네(Mycenae)에서 따온 것이다. 아가멤논이 희랍사람들의 연합세력을 이끌고 트로이전쟁을 주도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다. 전통적으로 고전희랍사가 들은 이 전쟁을 BC 1184년의 사건으로 말하는데, 그보다는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사건일 것이다.미케네 사람들은 지중해 동부지역과 매우 활발한 무역을 행하였으며 말타, 시실리, 이탈리아 등 서부지역과도 활발히 교역했다. 그러나 미케네 문명은 BC 13세기 말엽부터 서서히 퇴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12세기경에는 미케네 문명의 모든 중심도시들이 문명의 사이클이 과시하는 쇠락의 보편적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BC 1100년경, 미케네 문명은 ‘바닷사람들’(the Sea Peoples: 19세기 사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어로서 청동시기 말기, BC 12세기에 미케네 문명과 히타이트제국과 레반트 도시들을 멸망시킨 세력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반드시 ‘해양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민족대이동이 있었던 것이다)에 의하여 멸망되었다.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킨 세력을 우리는 보통 발칸반도에서 내려온 도리아인(Dorians)이라고 추정한다.
미케네 문명 멸망한 자리에 개화한 희랍문명
▎크레타 섬의 동굴. 크레타 섬의 백악 지층에는 천여 개의 해안 동굴이 있다. 레아가 막내 아들 제우스를 동굴에 숨겨 살림으로써 그리스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사진·중앙포토 |
|
잠깐,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희랍’, ‘그리스’ 이런 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희랍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리스’라고 부르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헬라스’로 불리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희랍(希臘: 시라, Xila)’은 ‘헬라’라는 말의 중국식 음역이다. ‘그리스’라는 영어 명칭은 라틴어 ‘Graecia’에서 유래한 것이다. 로마인들이 처음 알게 된 헬라스인들이 아드리아 해(Mare Adriaticum) 건너편의 서북부 헬라스에 살고 있던 ‘그라이코이(Graikoi)’ 부족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곳을 ‘그라이키아’라고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다.이에 비하면 ‘ 헬라스’라는 말은 ‘ 헬렌의 후 손들(Hellenes)’이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것이다. 희랍신화에도 <구약>의 대홍수에 비견되는 대홍수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홍수와 관련된 주인공은 노아가 아닌 데우칼리온(Deukalion: 프로메테우스의 아들)과 퓌라(Pyrrha: 에피메테우스의 딸)이다.제우스가 이 세계를 홍수에 잠기게 만들었는데, 데우칼리온과 퓌라는 프로메테우스의 충고에 따라 상자(larnax)를 짓고 그 안에서 9일 밤과 9일 낮을 지내다가 테살리(Thessaly)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 부부의 아들 헬렌(Hellen)이 테살리에 세운 나라를 ‘헬라스(Hellas)’라고 불렀다. 이 헬렌에게는 세 아들, 도로스(Doros), 크수토스(Xouthos), 아이올로스(Aiolos)가 있었는데, 도로스의 후손이 도리아 부족이 되었고, 아이올로스의 후손은 아이올리아 부족이 되었다. 그리고 크수토스에게는 두 아들 아카이오스(Achaios)와 이온(Iōn)이 있었는데, 전자의 후손이 아카이아 부족이 되었고 후자의 후손이 이오니아 부족이 되었다. 훗날 이들 모두를 합쳐 ‘헬렌의 후손들’이라 일컬었고, 이 후손들이 산 지역 전체를 헬라스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스보다는 헬라스라는 명칭이 보다 정통성 있는 이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두 이름이 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방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것은 희랍지역의 원래 문명은 미노아-미케네 문명이었고, 이것은 실상 비희랍적인 문명이었다는 것이다. 이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희랍어를 쓰는 도리아족이 새롭게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열었다. 대홍수의 전설도 제우스의 분노가 그 주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질서(a new world-order)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의 담지자다. 그 불의 상징인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 물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동방의 천지수화론(天地水火論)적 사유의 한 실마리를 엿볼 수도 있다.미케네 문명의 특징은, 리니어B문자 문서의 해독이 전해주는 바로는, 지독하게 관료주의적이면서 독재적인 왕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쟝 삐에르 페르낭트Jean-Pierre Vernant는 <희랍사유의 기원>에서 미케네 왕권 Mycenaean Royalty을 ‘a bureaucratic royalty’라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관료주의적’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나 여기서 말하는 관료는 근대적 국가질서의 관료가 아니라, 왕에게 직속된 복종적인 궁정관료였으며 이들은 매우 치밀하고, 철저하게 국민에 대한 압제를 행하였다. 이러한 미케네 궁정의 왕을 와나카(wa-na-ka=와낙스 wanax)라고 불렀는데, 이 와나카는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종교의 모든 활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정치체제의 중심이었다.와낙스는 충직한 특수군인귀족계급(warrior aristocracy)에 의하여 지원되었고, 그들은 와낙스에 대한 복종으로 인하여 특권을 누렸다. 지방의 농촌공동체는 다모스(damos)라고 불리는 자체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모스는 궁정에 철저히 복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궁정의 조직은 매우 치밀한 행정체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서기들이 남긴 방대한 문헌들만 보아도 얼마나 세세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을 직접 관리하고 기록을 남기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케네의 궁정 중심의 권위주의적 행정체계는 도리아인의 침략으로 붕괴되고 와낙스(wanax)는 정치적 어휘로부터 사라지게 된다.그리고 와낙스의 자리를 바실레우스(basileus)라는 단어가 차지하게 된다. 바실레우스(lord, master, householder, chief)는 결코 모든 형태의 권력을 한 몸에 집중시킨 한 개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왕적인 기능만을 상징하며 복수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들은 사회적 위계의 최상부를 점령하는 그룹이었으며, 귀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와낙스로부터 바실레우스에로의 변화는 폐쇄적인 사회로부터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그리고 최고의 지배권력은 반드시 시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쌍방적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와낙스의 폐지와 더불어, 서민들에게 보편화될 수 없었던 리니어B문자(궁정서기들의 문자: 그 음절기호 syllabic signs가 90개가 되며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하다)가 사라지고, 페니키아의 22개 문자를 차용한 순수한 표음문자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 필기의 방식은 서민문화의 성격을 완전히 혁명시켰다. 문자의 사용이 궁정 와낙스의 사적 목적을 위한 아카이브의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되었다. 새로운 문자체계는 시민의 사회적·정치적 삶의 다양한 측면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노출되는 것을 허락했다. 표음문자는 매우 단순하고 정확하게 사람의 말을 시각화해 주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왜 폴리스 철학정신을 사수했나?
▎네덜란드 화가 아드리안 반 데르 베르프(1659~1722)의 <파리스의 심판>을 일부 변형했다. 파리스가 미(美)를 다투는 헤라·아프로디테·아테나를 심판한 그리스신화를 담고 있다. / 사진·중앙포토 |
|
인간의 ‘말(speech)’, 즉 언설이라는 것은 애초에는 매우 신비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타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타인을 지배하는 강력하고도 신령스러운 수단이었다. 언설은 폴리스 공동체의 가장 탁월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왕의 선포는 마지막 심판으로 들렸다. 인간의 언어 자체가 신격화되고 종교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희랍의 폴리스에서 말은 더 이상 종교적 의례를 구성하는 신비적 힘이 아니었다. 모든 선포는 논박될 수 있었다. 그것은 공적인 개방포럼을 통하여 토의되고, 논박되고 쟁의되어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연설은 일자가 타자를 승극(勝克)하는 것이며, 위대한 연설은 더 많은 공적 감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야만 했다.따라서 폴리스의 정치는 비밀스러운 과정이 아닌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지식과 가치, 그리고 모든 정신적 기술이 공동 문화의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의 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폴리스의 분위기를 전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또 왜 소크라테스가 유감없이 사약을 들이키면서까지 그의 폴리스 철학정신의 이상을 고수하려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이러한 희랍문명이 새롭게 탄생되는 전환의 시기를 제1의 시기인 암흑기라고 규정하게 된다. ‘암흑기’라는 의미는 다양한 비희랍적인 선행요소들이 새로운 놀이판에 자리 잡으면서 아직 가시적인 희랍문화를 태동시키지 않고 있을 시기였다.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이 강력한 주축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다. 그 침묵을 깨치고 태어난 최초의 그리스예술이 기하학적 스타일의 문양을 지닌 다양한 도기였다. 도기뿐만 아니라 테라코타와 작은 청동조각들이 있다. 이 기하학적 문양은 단순한 선모양(뇌문雷紋meander, 지그재그, 삼각형, 스와스티카, 크레넬레이션crenellation 등의 패턴)을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점차 인간과 동물의 형상이 선율패턴과 엮여 들어갔으며, 아주 복잡한 신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해주는 구도로 발전해나갔다.이 도기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저장용의 단지로 쓰이기도 하고, 드링킹 파티(심포지움, symposium)를 위한 여러 목적의 용기로 쓰이기도 했고, 개인의 치장이나 목욕을 위한 물단지·기름단지,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제기로도 쓰였다. 사이즈와 형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이름이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의 회화양식이 결정되었다. 초기에는 코린트에서 유래된 ‘까만형상도기(black-figure pottery)’가 유행하였는데(700년경부터 530년경까지) 후대로 오면서(6세기 후반에서 4세기 말까지) ‘붉은형상도기(red-figure pottery)’로 대치되었다. 까만형상도기는 광택 나는 까만 물감을 자연점토 표면 위에 발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러나 붉은형상도기는 광택 나는 붉은 물감으로 형상을 나타낸 후에 배경은 모두 까만 물감으로 처리한다. 까만형상도기의 경우, 디테일은 칼로 파서 점토 자체의 색깔로 선을 나타내는 기법을 썼지만, 붉은형상도기의 경우에는 붉은 형상 위에 자유롭게 까만 물감으로 디테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고 생동하는 표현을 창출해낼 수 있었다. 도기는 자기만큼 고온의 소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페인트 문양이 더 정교하게 구워지는 과정에서 보존될 수 있었다. 그리스 베이스 페인팅은 그 나름대로 유니크한 문화적 특성과 섬세함, 예술성을 과시한다.그리스는 자원이 풍족하지 못한 나라이며, 광물자원이 적고, 토지 또한 넓지도 비옥하지도 않다. 기원전 8세기에는 증가하는 인구와 그들의 새로운 욕구에 걸맞은 물질적 만족을 위해 외국으로 시선을 돌려야 했다. BC 700년경으로부터 600년경에 이르는 시기에는 동방의 다양한 문명의 성과, 그리고 이집트의 예술이 집중적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동방의 영향으로 그리스 예술은 타 문명의 문양이나 신화적 요소,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과감한 표현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문명은 단지 그리스인의 고유한 색깔에 의하여 그림 그려진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문명의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면서 발전적으로 형성되어간 것이다. 그리스 문명의 위대함은 바로 그러한 이색적 요소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번 생각해보라! 피타고라스의 기하학은 엄밀한 연역적 사유의 소산이거나, 과학적 추상성의 논리가 아니었다. 괴이한 종교적 터부와 윤회사상(transmigration thought), 그리고 관조(contemplation)의 사상이 결부된 신비주의였다. 피타고라스에 있어서는 수학은 신비였고, 신비로운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였다. 수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엑스타시였다. 우리는 수학을, 특수한 몇몇 천재가 아니고서는, 매우 지겨운 사고의 훈련으로 생각한다. 입시공부하기 위하여 거쳐야만 하는 끔찍한 오딜(ordeal, 시련)의 관문일 뿐이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시대와 같이 ‘대학입시’가 없었던 자유로운 사유의 황무지 속에서는 수학처럼, 경험적 관찰이나 사실의 유무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일시에 거대한 우주를 조직하고 통찰하고 발견하는 황홀경을 제시하는 그런 체험은 없었다.
“수학적 깨달음은 황홀한 기쁨이었다”우리는 오르지(orgy, 오르기아)라는 말을 알고 있다. 혼음의 축제, 바카스제식의 황홀경, 모든 비밀스러운 제식과 관련된 말이다. 그런데 이론(theory)을 의미하는 테오리아라는 말이 있다. 이 테오리아라는 단어도 오르기아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 이 둘은 모두 오르페우스 종교의 고유한 어휘에 속한다. ‘테오리아’를 희랍철학의 권위자인 콘퍼드(F.M. Conford, 1874~1943)는 “정열과 공감에 휩싸인 관조(passionate sympathetic contemplation)”라고 해석하였다. 그것은 매우 정적인 관조인 듯이 보이지만 기실 열정과 수난과 감정이입의 격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관조자는 수난을 겪는 신과 동일한 존재로 취급되며 신의 죽음 속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신의 새로운 탄생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피타고라스에게 있어서 정열과 공감에 휩싸이는 관조는 지성적 관조(intellectual contemplation)였다. 그것은 결국 수학적 인식의 경지를 의미했다.테오리아는 황홀경 속에 드러난 계시이며, 수학적 깨달음은 황홀한 기쁨이었다. 그것은 돈오(頓悟)의 도취적인 열락(悅樂)이었다. 경험만을 맹신하는 철학자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에 얽매이는 노예로 전락하지만, 순수한 수학자는 음악가처럼 질서정연한 미의 세계를 창조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희랍어의 ‘테오리아’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봄(a looking at)’을 의미한다. 이 봄은 일차적으로 눈의 시각작용을 통하여 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리를 본다,” 즉 불교에서 ‘견성(見性)’이라 할 때의 ‘견’ 즉 ‘다르사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견성은 견불(見佛)의 경지인 것이다. 결국 테오리아나 다르사나나 같은 함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옥스포드대학의 희랍어사전을 펼쳐보면, 테오리아의 두 번째 의미는 ‘관조(contemplation), 사색(speculation)’이 된다. 보는 것은 곧 관조하는 것이다. 즉 수학과 같은 명철한 사유에 의하여 우주를 통찰하는 것이다. 사전에 나오는 세 번째 의미는 ‘극장이나 공적 게임에 있어서 관조자가 됨(the being a spectator at the theatre or the public games)’이다.다시 말해서, 테오리아는 희랍인들이 흔히 인간세에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한 분류방식에 있어서 최상층을 점유하는 사람들의 특권에 속한다. 가장 낮은 계층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그 위의 계층은 경기 속에서 능동적으로 활약하는 경기참가자들이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편안한 스탠드에 앉아서 경기를 총체적으로 관조하는 스펙테이터다.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전시됐던 강의 신 일리소스의 머리 없는 조각상. 1800년대 초 영국의 엘긴 경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내 영국에 반입한 조각상, 이른바 ‘엘긴 마블스’ 중 하나다. / 사진·중앙포토 |
|
이 스펙테이터의 마음의 상태가 곧 테오리아인 것이다. 현대의 대중사회(mass society)에서는 경기참가자들(연예·스포츠계의 스타들)이야말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요즈음 사람들은 이 관조적 삶의 우위라는 테제를 이해하기 어려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폴리스 공동체의 대전제는 노예계급의 엄존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개명한 사상가도 노예와 여자는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천성적으로, 자연적으로 결여한 존재로서 규정하였다. 지배당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였다. 노예제를 묵인한 사회체제 속에서 관조적 삶의 이상은 순수수학의 창조를 이끌어내었으며, 이 관조의 특권은 신학·윤리학·형이상학·정치학의 모든 분야에서 지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수학적 예지는 상기(Reminiscence)의 소산
▎한 관광객이 그리스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에서 의회 건물 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중앙포토 |
|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있어서 질료와 형상이 뒤엉킨 가치의 사다리(entelekheia)도 결국 형상 없는 질료(formless matter), 즉 순수질료(pure matter)와 질료 없는 형상(matterless form), 즉 순수형상(pure form)을 양극으로 설정한 우주의 장(場)에 펼쳐진 복합체들의 가치론적 배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장(場)은 또다시 인간의 몸(Mom)이라는 소우주로 축약될 수도 있다. 인간의 몸에 있어서 가치론적으로 저열한 하초(下焦)에 순수질료라는 극이 성립하고, 가치론적으로 고귀한 상초(上焦)에 순수 형상이라는 극이 성립한다고 보면, 인간의 가장 순결한 정신(nous)은 순수수학(질료가 없는 순수형식적 사유)을 펼쳐내는 자유로운 지성이며, 이러한 지성은 바쿠스의 무녀들(Bakchai)의 광란, 즉 엔투시아스모스(enthousiasmos)를 벗어난 관조의 해탈을 지향한다.관조는 하초의 신들림이 아닌, 상초 즉 이성 및 지성의 신들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피타고라스주의에서 파생된 지류다. 플라톤 역시 피타고라스-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ontology)의 홍류 속에서 벗어나는 인물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기하학주의를 탈피하여 보다 생성론적인 생물학주의를 자설의 본류로 삼았다고는 하나 파르메니데스의 이원론적 존재론의 틀은 상재(尙在)한다.플라톤의 이데아설은 그의 인식론인 상기설(the Doctrine of Reminiscence)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데, 그것 역시 영혼의 불멸, 즉 영혼의 윤회라는 우주론적 인식체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다. 윤회의 핵심에는 영혼의 아이덴티티가 육체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지속된다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절대적 같음(absolute equality)은 현상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 근접한 같음(approximate equality)만이 경험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인 같음의 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전생에서 절대적인 같음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학적 예지가 모두 배움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상기의 소산인 것이다. 존 버넷트(John Burnet, 1863~1928)는 그의 역저 <초기희랍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우리는 이 세상에 다니러 온 손님이고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세의 무덤에서 탈출하려 자살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인 신의 종복들로서 신의 명령이 없다면 무덤을 떠날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올림픽경기의 상인, 경기참가자, 관람객) … 가장 고귀한 인간은 단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화활동(purification) 가운데 최고 단계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공평한 학문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학문에 헌신하는 철학자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자신을 생사의 수레바퀴(the wheel of birth)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플라톤의 상기론적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의 논리도 똑같이 설교되고 있다. 결국 무여열반의 성취는 이데아를 추구하는 플라톤의 정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조에서 달성된다. 이데아론적 지혜만이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희랍인들의 사유는 결국 <요한복음> 제1장에 나타나는 로고스적 사유와 동일한 패러다임에 있으며 소크라테스의 삶과 예수의 삶은 동일한 문명의 동일한 패러다임의 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임마누엘 칸트의 실천이성론의 정언명령(Kategorischer Imperativ)의 절대성에까지 일관되게 계승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의 법칙’은 예지계에 속하는 것이며, 개별적 행위의 자연스러운 경향성(Neigung)은 감성계에 속한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감성계의 인과법칙에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자기 속에 내재하는 이성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이성자의 자기한정이며, 그것이 곧 ‘자율(die Autonomie)’이다. 다시 말해서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인 정언명령에 입각하여 행동함으로써 끊임없는 이성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는 하나의 ‘요청(postulation)’이다.내가 말하려 하는 것은 희랍사상에 통관되어 있는 플라톤적 이원론(Platonic Dualism)은 화이트헤드가 말했듯이 서구사상사 전체를 일관하는 것이며, 그 뿌리에는 윤회나 혼백의 분리와 같은 매우 소박한 인간의 원시 관념이 내장되어 있는데 그 원형은 동방문명과 교류되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희랍미술사에 나타나는 동방화 시기라는 것도 단순히 디자인이나 문양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상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아테네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리스가 미국의 J 폴 게티 미술관으로부터 반환받은 두 점의 유물. 왼쪽이 기원전 4세기 무렵 제작된 황금 화관, 그 옆은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진 젊은 여성의 대리석상이다. / 사진·중앙포토 |
|
동방화 시기 다음에 아르케익 시기가 따라온다. 동방화 시기에는 다에달릭 조각(Daedalic sculpture: 전설적인 크레테 예술가 다에달루스Daedalus에게서 비롯된 조각양식)이 그 특징으로서 대변되고 있는데 아르케익 시기에 오면 쿠로스(kouros=복수는 쿠로이kouroi, 여성조각은 코레kore라고 한다)라는 웅장한 통돌조각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집트와 교역이 활발히 진행되면서(BC 672년경부터) 이집트의 조각양식이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조각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쿠로스 조각상은 보통 2m가 넘는 거대한 석상인데 초기작품은 매우 양식적이며 배리에이션이 별로 없다. 조각상은 완벽하게 입체적인 통조각이며, 똑바로 정면을 향해 있다. 어깨가 널찍하고 허리는 건장하게 잘록하며 팔은 양 옆으로 몸에 가깝게 드리워져 있으며 주먹은 쥐고 있다. 두 다리는 뻣뻣하게 땅을 밟고 있으며 무릎이 곧게 펴져 있다(rigid).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왼발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며, 얼굴에는 대체적으로 ‘아르케익(Archaic) 미소’라고 하는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이 쿠로스 상은 그리스 세계 내에서 표준이 된 상호교류의 상징, 즉 그리스다움(Greekness)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쿠로이 조각들은 이집트의 조각과는 달리 종교적인 목적을 나타내거나, 종교적 제식이나 건조물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때로는 아폴로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그들은 그들 지역 자체의 로컬한 영웅들이나 출중한 운동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쿠로스 상이 기원전 6세기 말까지 총 2만여 개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은 당시의 이 양식 하나를 얼마나 치열하게 세련시키기 위해 노력했는가, 그리고 당시 그리스 세계가 문명의 진보를 위해 얼마나 활발히 노력했는가를 말해준다. 초기의 이집트 양식적 표현은 점점 희랍화되어 간다. 즉 경직된 양식이 보다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이다. 희랍인들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신체의 활동과 밸런스, 그 역동적 순간을 자유롭게 포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나갔다. 여성조각인 코레(복수 코라이korai)는 머리를 땋고 옷을 입었는데, 초기에는 페플로스(peplos)와 같은 헤비한 튜닉을 입었으나 점점 키톤(chiton)과 같은 가벼운 튜닉으로 바뀌어갔다. 이 치마들은 점점 자연스러운 주름과 맵시를 과시하게 된다.고전시대(Classical Period)라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보통 ‘희랍문명’이라고 부르는 인상의 총체, 그 철학과 미술, 조각, 건축, 그리고 특이한 정치체제 등등의 모든 것을 집약하여 부르는 것이다. 초기 고전시대의 출발은 아테네가 BC 490년과 479년 두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대제국의 침공을 극적으로 물리치면서 BC 500년경부터는 자기확신의 새로운 느낌으로 충만한 문명을 건설하면서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희랍문명이야말로 전 유럽세계문명의 모태이며 근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상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상 희랍문명의 외연은 아테네 도시문명과 일치되는 것도 아니며, 고전시대 이전의 희랍문명은 자체로 축적된 것이 별로 없었다. 오리엔트나 이집트의 육중한 문명의 축적에 비하면 청동기시대의 아테네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다.앞서 논의한 대로, 우리가 보통 희랍문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 발아는 에게 문명권의 중심 노릇을 한 크레타섬의 미노아 문명이었다. 문자와 도시, 그리고 무역기술을 갖추었던 이 문명은 다시 미케네 문명에 흡수되었고, 이 미케네 문명은 다시 도리아인의 침공으로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전시대 이전의 아테네는 희랍문명의 리더가 아니었다. 희랍문명권은 지정학적으로 산맥들에 의하여 갈라진 지형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국가의 출현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군사공동체인 폴리스가 수백 개 밀집되어 있는 형국이었는데, 이들은 혈연공동체라기보다는 전우애를 통한 로고스적 결합을 한 인위적 공동체였다. 따라서 농경생활의 터부에서 생겨난 씨족신을 섬기기보다는 군신(軍神)들의 판테온인 올림푸스를 숭배하였던 것이다. 이 수많은 폴리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과 체제와 문화를 갖춘 두 개의 폴리스가 스파르타와 아테네였다. 아테네의 전성기라고 해봐야, 그 시민의 인구는 10만 정도였다(외국인 1만 명, 노예 15만 명을 합치면 26만~30만 명 정도).
솔론은 희랍인의 이상적 덕성을 구현한 인물이러한 소국이 당시 다리우스 대왕의 영도력 아래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페르시아 대제국의 대군을 패퇴시킨 기적적인 이야기는 마라톤전투(Battle of Marathon, BC 490년 9월)의 무용담으로 우리에게도 잘 전달되고 있다. 마라톤전투 이래로도 그레코-페르시안 전쟁은 BC 449년까지 집요하게 계속된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에서 아테네는 계속 승리의 행운을 누린다. 이것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아테네를 잘 도왔기 때문에도 가능했지만, 페르시아 군대는 해전에 약했을 뿐 아니라, 천기(天氣)의 상태가 항상 페르시아에게 불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아테네는 운이 좋았던 것이다. 결국 이 페르시아전쟁에서의 아테네의 승리가 세계 역사의 주축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페르시아제국의 문화적 성취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오직 혁혁한 아테네문명의 현시만이 인류문명의 연속태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아테네의 천운(天運)은 결코 우연일 수만은 없다. 결국 운이란 그것을 준비하고 발견하고 활용하는 자에게만 찾아오게 마련이다. 우리는 아테네야말로 모든 ‘전통의 원천’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실 아테네는 무전통의 황무지에서 갑자기 솟아난 전통의 집결지라는 성격으로 보다 정확히 규정될 수 있다. 비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모든 모이라(moira, 운명의 신)를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타 인간세가 구현해보지 못한 제도와 예술, 그 문명의 모험(Adventure of Civilization)을 감행할 수 있었다.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Politica)>에서 인간세의 국제(國制)를 6개로 나누어 다양한 논변을 펼친다. 국제를 6개로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배자의 사이즈에 관한 것이다. 지배자가 한 사람인가, 소수인가, 다수인가라는 척도이고, 또 하나의 척도는 지배자가 지배를 행할 때, 그것이 보편적 이익, 즉 공동의 복지(common welfare)를 위한 것인가, 또는 지배자의 사적 이익(private interest)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보편적 이익을 위한 일자, 소수, 다자의 정치는 군주제(monarchy), 귀족제(aristocracy), 입헌공동체(polity, politeia)라고 부른다. 이 삼자는 모두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다. 그런데 이 정체들이 사적 이익을 위한 나쁜 정부(bad government)로 바뀌면, 군주제는 참주제(tyranny)로, 귀족제는 과두제(oligarchy)로, 입헌공동체는 민주제(democracy)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 정체 중에서 제일 나쁜 정부의 형태가 민주제일 수가 있다. 민주제의 구체적 의미는 빈민 다수의 자유를 위한 것인데,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수는 현명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던 것이다. 과두정치도 소수 부자의 부가 유지되는 것이 최대목표이므로 좋을 수가 없다. 참주정치란 우리가 흔히 체험하고 있는 독재정치(despotic government)를 말하는 것이므로 좋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그런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허무맹랑한 이론적·논리적 열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테네 역사의 연변을 근거하여 논의한 것이다. 아테네는 기원전 8세기경까지는 왕제(monarchy)였다. 그런데 그 왕제가 왕권을 제약하고자 하는 대귀족들의 대두로 인하여 귀족제(aristocracy)로 이행해간다. 이 귀족제가 과두제(oligarchia, timocratia)로 변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적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두제는 다시 참주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어리석은 참주가 다수에 의하여 타도되면 민주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아테네는 이미 솔론(Solon, BC 630~560, BC 594년경 아르콘archon으로 집정하여 20년간 전권을 행사하였다)의 시대 때부터 빈민을 해방시키는 경제적 개혁(빚 탕감)을 감행하였고, 동전화폐와 도량형의 혁신을 이룩하였다. 정치적으로도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너럴 어셈블리(the general Assembly)인 에클레시아(Ecclesia)를 제도화시켰고 또 이 에클레시아의 준비회의인 400인회의(Council of Four Hundred)에 빈민들이 자기들의 과제상황을 호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정치적 권력이 혈연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모든 통로를 제도적으로 단절시켰다. 그리고 이전의 드라코(Draco: BC 621년경의 법령제정자)의 철권 같은 가혹한 법조문을 보다 인간적인 법으로 개혁하였고, 모든 시민이 소송하고 검찰할 수 있게 만들었다.솔론의 개혁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아무 계층(부자나 빈자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각자의 비애일 뿐이다. 헤로도토스는 솔론을 성자며 법률의 창조자이며 시인으로서 예찬한다. 솔론은 중용이라는 희랍인의 이상적 덕성을 구현한 인물이며 진정한 최초의 아테네 시인(아테네적인 컬러와 언어를 구사하는)이었다. 그는 자유로운 농민계층을 창조하여, 귀족정의 기반을 무너뜨렸고, 시민공회의 권력을 강화하였으며, 보다 민주적인 사법제도를 확립하였다. 솔론은 아테네가 향후 자유롭고도 찬란한, 그리고 안정된 고전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시간의 피로에 감염되지 않는 그 화려한 자태여!
▎아테네 아고라에서 올려다본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 / 사진·중앙포토 |
|
하여튼 전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모나키(monarchy) 아니면 타이러니(tyranny)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근원적 개혁을 시도할 생각을 하지 못한 암울한 시대에, 아테네가, 아무리 문제성을 내포한다 할지라도(데모스demos라는 개념에 노예나 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크라티아kratia라는 개념에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데모크라시의 시도를 했다는 것, 즉 치자가 일방적으로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어떤 제도를 확립하려 했다는 그 노력에 대해 우리는 경외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비록 장시간 지속되지 않은 매우 특수한 실험(experimentation)이었다 할지라도, 리얼한 것이었다.이러한 리얼리티는 페리클레스(Pericles, BC 495~429)라는 탁월한 정치가의 역사적 실존성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페리클레스야말로 아테네의 민주정치와 아테네의 제국화를 성취한 패러곤이었다. 페리클레스 한 개인의 존재가 아테네를 희랍세계의 정치문화 중심으로 격상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시 데모크라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치(法治)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상황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반드시 ‘기인(其人: 그 사람, <중용> 제20장의 개념)을 기다려서만 성취되는 인치(人治)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른다.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 460년경에 태어나 404년 이후에 죽음. 희랍사가로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펠로폰네소스전쟁사>를 썼다. 투키디데스는 페리클레스에 비해 40세가량 어렸으므로 페리클레스 생애 전기前期에 관해서는 직접적 지식이 없었다)는 페리클레스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 언급도 거부한다. 사가에게 그러한 존경심을 얻는다는 것은 페리클레스가 실제로 얼마나 위대한 정치가였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해준다. 500년 후에 <페리클레스의 생애, The Life of Perikles>(AD 100년경)라는 위대한 저작물을 통해 페리클레스를 더 리얼하게 그려낸 플루타크는 다음과 같은 멋들어진 평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아~ 페리클레스가 창조한 건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움의 꽃을 피우고 있네. 시간의 피로에 감염되지 않는 그 화려한 자태여! 언제나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의 꽃, 나이를 먹지 않는 신비로운 기운이 아테네의 작품들에는 스며들어 있다네.”이것은 페리클레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아테네를 이 지구상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콤팩트하고 가장 장엄하고 가장 완벽한 설계구도를 가진 도시로 변모시키려 한 그 열정적 작업을 예찬하는 한 구절이다. 신도시 아테네의 중심에 솟은 아크로폴리스, 또다시 그 중심에 위치한 위대한 신전, 파르테논(Parthenon)의 위용 하나만으로도 그 웅대한 스케일과 정교한 운치의 극상, 그 문명의 전형을 전관할 수 있게 해준다.파르테논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 이 파르테논은 아테나 여신(goddess Athena)을 모시기 위해 지은 신전인데 도리아식 오더(order는 기둥양식과 엔타블라쳐entablature 양식을 함께 지칭하는 건축용어다. 오더에는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투스칸식, 혼합식의 5종이 있다)의 장엄한 절정을 이루고 있다. 파르테논의 어원은 ‘처녀 아테나’에서의 ‘처녀(Parthenon)’를 의미한다. 실제는 처녀성보다는 아테네의 수호신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런데 이 신전은 BC 447년에 착수하여 그 전체 모습이 BC 438년에 완성되었고, 바로 그해에 아테나의 순금과 상아로 치장된 거대한 상이 봉헌되었다. 이토록 장엄한 신전이 불과 9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육체노동이라는 인간능력에 과연 한계를 설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페리클레스 본인이 총지휘를 맡았고 피디아스(Phidias)라는 조각가의 감독 아래 이크티누스(Ictinus)와 칼리크라테스(Callicrates)라는 두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것이다. 아테나 여신의 상은 피디아 본인의 작품이다. 이 건물의 외부 치장은 BC 432년까지 계속되었다.파르테논의 완성미에 관해서는 지금 그 디테일을 내가 논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 이 건물은 단지 건조물일 뿐 아니라,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술양식의 정화라 할 수 있는 문화복합체다. 아테네에 지어진 건물과 예술품들은 대부분 불과 50여 년의 그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것은 아테네의 기술력과 노동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희랍세계 전체의 조각가, 석공, 화가, 건축가, 도공 등 온갖 예술가가 합심하여 이룩한 것이다. 이 위대한 예술이 불과 고전시대 전성기 50년 사이에 꽃을 피웠다는 이 사실이 말해주는 진리는 너무도 명백하다. 예술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의 존중만이 그 걸작의 표현을 얻는다.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예술적 창진의 모태
▎파르테논 신전은 완전한 대칭을 이루기 위해 각 면들이 9대 4의 비율로 지어져 있다. 도리아식 기둥은 높이 3분의 1 부분이 불룩한 배흘림(엔타시스) 기법으로 사람의 착시현상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 / 사진·중앙포토 |
|
더구나 돌의 조각이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인간노동의 정성과 숙련과 예술적 감성의 응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플루타크가 평한 대로, ‘새로움의 개화(bloom of newness)’를 과시하는 그러한 창진의 과정 속에 융화되는 계기들은 페리클레스라는 탁월한 리더의 민주정신(democratic spirit)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될 길이 없다. 아테네의 민주야말로 아테네 예술의 창진(creative advance)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 어느 미친 예술가가 강제로 끌려와 독재정권의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그토록 발랄하고 다양한 걸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으랴!파르테논만 해도 그 조성 연대와 예술가들의 이름이 확실히 전해오는 역사적 구체적 리얼리티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나는 이 파르테논을 19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가본 적이 없었던 그 시절에 가보았다. 그때 아크로폴리스의 폐허 위에서 홀로 느낀 나의 감성은 나의 생애를 지배하는 어떤 영감의 구조로 남았다.파르테논은 기원후 5세기까지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피디아스의 거대한 금조각 아테네 여신상이 이방인의 우상으로 간주되어 파괴되고 기독교교회로 변모할 때까지 존속되었던 것이다. 7세기에는 일부분 기독교 교회로서의 구조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458년 터키가 이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면서, 2년 후 이 신전은 모스크(이슬람 사원)로 바뀌었고 남서 코너에 ‘알라 아크바르’를 외치는 미나레(minaret)가 세워졌다. 1687년 베니스공국 군대가 터키와 싸울 때, 이 건물의 중심부가 폭파되었다. 터키군대가 이 신전 안에 화약을 쌓아두었던 것이다. 1801~1803년 사이에 영국귀족 토마스 부르스(Thomas Bruce)와 로드 엘진(Lord Elgin, 엘진 경은 당시 오토만제국의 영국대사였다)이 터키 정부의 허락을 받아 폐허의 돌조각을 영국으로 운반해갔고, 1816년에 런던 영국박물관에 팔아 넘겼다(자기자신이 투입한 전체비용의 반값에).나는 부서진 파르테논을 온전한 파르테논보다 더 사랑한다. 불완전한 기둥 사이로 투과되는 기운의 싱그러움이 모든 종교적 색조를 퇴색시키고 오로지 그 조각가와 예술가의 원시적 족적만을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새벽에 올라가서 보는 싱그러움과 황혼에 물들여진 그 거대한 공간, 그 폐허에는 천지대자연의 조화된 질서가 끝없는 괘상(卦象)을 그리고 있다.페리클레스의 전성시기는 펠 로폰네소스전쟁(BC 431~BC 404)이라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비극적 싸움으로 곧 쇠락하고 만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과두정치의 타락으로 역사의 장을 넘기고 만다. 펠로폰네소스전쟁의 궁극적 승자가 스파르타라고는 하지만, 이 전쟁은 영웅들의 휘브리스(hybris, 오만)가 아닌, 절정에 달한 국가들의 휘브리스가 모든 그리스세계 사람의 파멸을 몰고 온 사건이다. 스파르타에 의하여 아테네의 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은 희랍세계의 모든 문화의 꽃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전 희랍 세계가 마케도니아의 말발굽 아래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알렉산더대왕(Alexander the Great, BC 356~BC 323) 이전의 고전시대를 보통 헬레닉 에이지(Hellenic Age)라 하고, 그 이후를 헬레니스틱 에이지(Hellenistic Age)라 부른다. 전자는 폴리스의 시대라고 한다면 후자는 코스모폴리스의 시대다.헬레니스틱 시대의 예술품들은 고전시대의 작품들을 변용한 것이고 매우 화려한 표현이 그 나름대로 유니크한 희랍 예술의 색채를 보전하고 있지만 창조성(creativity)이라는 의미에서는 고전시대에 못 미친다. 우리가 잘 아는 미로의 비너스(Venus de Milo, BC 150년경)나 사모트라케의 니케(Nike of Samothrace, BC 200년경), 바티칸 박물관의 라오쿤(Laocoon, BC 2세기)과 같은 작품이 모두 이 시기의 것이다. 사실 그 이후의 로마시대의 작품들은 모두 이 헬레니스틱 시대의 양식을 카피한 것이다. 그들의 고전시대에 대한 동경은 모두 헬레니스틱 시대의 표현을 통해서 연출된 것이다.
서구 예술의 2000여 년 지배한 그리스 예술형식
▎그리스의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이어지는 국도변에 마라톤의 기원이 된 페이디피데스의 청동상이 있다. 그는 실존했던 인물은 아니었다고 한다. / 사진·중앙포토 |
|
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의 말대로, 고차원의 창조적 양식을 지향하는 불완전성은 답습된 저차원의 완벽성보다 훨씬 더 고등한 가치의 소산이다(There are in fact higher and lower perfections, and an imperfection aiming at a higher type stands above lower perfections). 이미 고전시대의 창조성은 헬레니스틱 에이지의 반복 속에 목이 조였다. 그 생명 없는 반복은 끊임없이 로마세계를 통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 정치도 습관적 경건을 고수하는 고례만을 반복하였고, 철학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았고, 문학은 깊이를 상실했고, 과학은 의심되지 않는 전제로부터의 연역만을 정교하게 일삼았다. 모험의 우직함을 상실한 감성의 세련만이 서구예술의 2000여 년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19세기말 인상파의 혁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구예술은 희랍예술의 형식적 완벽성을 해탈하기 시작한다.김승중(金承中)은 나의 맏딸이다. 나는 1972년에 고려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을 다니다가 대만대학 철학연구소(석사과정)로 유학을 갔다. 그곳에서 중문학연구소 중국언어학 박사반 학생이었던 최영애(崔玲愛)를 만나 곧바로 사랑에 빠졌다. 이듬해에 잠깐 귀국하여 이화대학교 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1973년 1월 27일), 바로 그해 겨울에 김승중이 태어났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학위과정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아내만 귀국하여 김승중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젖도 주지 못하고 갓난아기를 바로 나의 모친에게 맡긴 채 다시 대만으로 돌아와 학업을 계속했다. 승중이는 타이베이의 기운 속에서 생성되어 서울의 하늘 아래서 할머니의 가호를 받으며 자라났다.나는 대만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도쿄대학으로 다시 유학을 갔고,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도쿄대학 문학부 중국철학과 대학원에 정규 학생으로 입학했다. 도쿄대학에 입학한 후 와세다대학 근처의 신쥬쿠쿠(新宿區) 토츠카마치(戶塚町)라는 곳에 2층짜리 테라스 하우스를 한 채 빌렸다. 아주 일본적인 작은 골목이 오순도순 뻗쳐있는 조용한 마치였다. 아내는 75년 가을, 대만대학 중문과에서 외국학생으로는 처음 중국어학 방면으로 박사논문을 완성하고 영예로운 학위를 획득했다. 그리고 서울로 가서 할머니 슬하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던 승중이를 데리고 내가 공부하고 있던 도쿄 집으로 합류했다. 그때 승중이는 두 돌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매우 똘똘했다. 할머니가 승중이를 떼어 보내면서 무척 서운하여 우셨다고 했다.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졌나 보다 하고 승중이가 떠나간 공허감을 달래는데 근 1년 넘게 고통을 겪으셨다고 했다.나는 승중이를 하네다공항에서 처음 보았는데 ‘아버지’라는 낯선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나의 어머니께서 초록색 영국 털실로 예쁘게 뜨개질하여 만든 옷을 입었고 빵모자까지 쓰고 있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우리 세 사람이 단란한 살림을 꾸려나가기에 도쿄는 너무도 아름답고 질서 있는, 매우 평화로운 곳이었다. 나는 생활하기에 충분한 장학금을 독일 에큐메니칼 재단으로부터 받았고, 또 일본 로타리장학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유학생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독채 집을 세내어 꿈같은 초혼의 감미로움을 만끽했다. 회상해보면 인생의 모든 단계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지만 나의 삶의 모든 로맨스가 극대화되어 있었던 순결한 시기로서는 도쿄에서의 2년을 꼽을 수밖에 없다.주말이면 승중이를 목마 태우고 도쿄의 모든 공원과 박물관을 다니곤 했던 추억은 항상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나의 의식을 스친다. 그리고 나는 도쿄대학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고전학자로서의 모든 엄밀한 스칼라십의 기초를 굳건하게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승중이는 쿠야쿠쇼(신쥬쿠 구청)에서 직영하는, 집에서 가까운 보육원을 전액장학금으로 다녔는데, 보육원의 교육이 매우 훌륭했다. 선생님들의 인품과 교양이 진실로 탁월했다. 승중이는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일본노래를 100개 이상 암송하여 불렀다. 보육원의 하루가 노래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승중이의 무의식 속에는 일본어의 저류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내 딸 김승중 교수의 성장과정승중이는 내가 하버드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버드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퍼블릭 스쿨이지만 아주 유서 깊은 명문으로 알려진 애거시즈 스쿨(Agassiz School)을 다녔다. 옥스포드 스트리트(Oxford Street) 변의 아주 고색창연한 아담한 건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초등학교였다. 승중이 동급반 학생으로 아주 절친한 친구 이름이 에탄 굴드(Ethan Gould)였는데, 바로 그 유명한 진화론의 대가 스테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 1941~2002)의 아들이었다. 나는 아침마다 조깅하는 길에 그의 부인과 만나(꼭 같은 시간에 그녀도 나와 같은 코스를 뛰었다)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나는 그녀를 에탄의 엄마로만 알았지, 그 남편이 위대한 학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데보라 리(Deborah Lee)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매우 섬세하고 동양적인 감각이 있는 미녀였는데 아티스트라고 했다. 그때 굴드는 생물학과의 강사였고, 전혀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때 내가 굴드를 사귀었더라면 그가 말하는 ‘펑츄에이티드 이퀼리브리엄’(punctuated equilibrium: 단속 평형설. 진화는 다윈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학설. 제이 굴드는 이 학설의 완성자로 평가받는다. 단속 평형설에 의하면 진화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에 의해 야기되나 일단 그 변화가 완료되면 다시 안정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다-편집자)에 관하여 조기에 통찰을 얻었을지 모르겠다. 하여튼 승중이가 다닌 애거시즈 스쿨의 분위기가 하버드의 교수나 천재 학자들의 자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다는 것이다.승중이는 애거시즈 프리스쿨(pre-school)부터 다녔는데, 1학년을 마칠 즈음 재미난 고사가 하나 발생했다. 승중이는 그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과외활동으로 짐내스틱스(gymnastics, 체조)를 선택했는데, 아크로바트(곡예)에 가까운 묘기를 보여줄 정도로 학습을 잘했다. 승중이는 그 학교 다니는 것을 몹시 사랑했다. 그런데 1학년을 마치었을 때, 담임선생이 승중이는 2학년을 다닐 필요가 없으니 3학년으로 월반시키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승중이의 학습능력이 좋아 2학년을 하게 되면 지루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월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교장실에 가서 신청하라는 것이다.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 고상하게 생긴 중년부인이 앉아있는데 매우 거만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사정을 말한 즉,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학교업무상 예외를 허락할 수 없으니 그냥 2학년을 다니게 하라는 무뚝뚝한 대답뿐이었다. 잘라 말하는 품새가 더 이상의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자세였다. 나는 내 몰골에서 풍기는 동양인의 모습에 대하여 그녀가 인종차별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때만 해도 동양인은 극소수였고 미국은 충분히 개화되어 있질 않았다.나는 다시 담임선생을 찾아가 상의를 했더니, 내일 모레 캠브리지 교육위원회의 카운슬(council) 열린다는 것이다. 캠브리지 퍼블릭 라이브러리(Cambridge Public Library) 옆에 있는 캠브리지 린지 앤 래틴 스쿨(Cambridge Rindge and Latin School)의 체육관에서 대회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호소해보라는 것이다. 퍼블릭 스쿨이기 때문에 퍼블릭 카운슬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대회의장에 가서 말하는 것이 어색할 것 같아 내 딸의 교육에 관한 나의 근본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일종의 선언문 같은 명문을 밤새 집필하였다. A4 사이즈 종이에 두 장 가득 담길 내용이었는데, 미국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소망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담임선생의 권고에 의한 월반에 대한 요청이 이렇게 묵살되는 상황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전통에 위배되는 불행한 일이라고 호소하였고, 나는 토마스 제퍼슨의 문장까지 인용해가면서 나의 호소가 관철되기를 희망한다고 정중한 문투로 마감했다. 사실 나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몰랐다. 뭔가 공백이 있다 싶은 순간에 나는 일어나서 내 페이퍼를 읽었던 것이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낭랑했고, 또 나의 문장이 매우 심각한 고전투의 명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저지하지 못했다(불행하게도 이 명문장은 이사통에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그 자리에 승중이를 데리고 갔다.낭독이 끝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승중의 월반은 결정이 났다. 교장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나에게 찾아와 바로 월반시켜주겠다고 했던 것이다. 승중이는 애거시즈에서 4학년까지 다녔다. 떠날 때 승중에게 짐내스틱스를 가르쳐주었던 선생이 나에게 승중이는 정말 고집이 세면서도 사리가 밝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매우 예언자적인 말을 했다: “노 원 캔 트램플 온 허(No one can trample on her).” 그 선생님은 페미니스트 같은 느낌을 주는 멋있는 여인이었는데, 승중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에게든지 짓밟힐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뜻으로 나에게 말한 것이다.
하늘의 감각으로 땅의 예술을 공부하다승중이는 귀국하여 금란여고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박창범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내가 어느 날 박 교수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나의 방대한 서재를 구경하면서, <한서> <후한서>의 선장본 책들을 보더니, 말로만 들어왔던 천문학 정보가 담겨 있는 고전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가슴이 뛴다고 고백했다. 그때만 해도 박창범 교수는 고사료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의 저자로서 일반인에게도 천문학이라는 과학적 성과와 고문헌의 천문자료를 결합하여 고대사의 강역이나 사료들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많은 가설을 세운 학자로서 잘 알려져 있다. 사료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없이 너무 쉽게 가설적 사유만으로(비록 그것이 수리적으로 입증된다 할지라도) 그 역사적 사태의 실재성을 단언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는 하나, 그의 연구의 성과는 학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승중이가 프린스턴대학 천문학과에 들어가 천체물리학의 여러 분야 중, 우주론(cosmology)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박창범 교수의 지도와 추천의 힘이 컸다고 말할 수 있겠다. 승중이는 프린스턴대학의 아스트로피직스(Astrophysics, 천체물리학) 분야에서 학위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논문제목은 ‘Clusters of Galaxies in the Sloan Digital Sky Survey’였다.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SDSS)라는 것은 뉴멕시코의 아파치 포인트 관측소에 설치한 2.5m 너비의 광학망원경을 사용하여 다중필터 이미징과 스펙트로스코픽 레드쉬프트 서베이(spectroscopic redshift survey)를 행하는 천체관측 프로젝트다. 이 데이터 콜렉션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미징 데이터는 전천(全天)의 35% 이상의 범위를 관측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이 시설을 만드는 데 자금을 댄 알프레드 슬로안 재단(Alfred P. Sloan Foundation)에서 따온 것이다.승중이의 논문은, 이 새로운 데이터방식이 기존의 천체 관측의 4배 정도의 면적을 커버하고 우주를 매우 깊고 넓게 관측할 수 있으므로, 그 많은 정보를 육안으로만 식별하는 작업이 한계가 있다는 전제 아래, 우주 은하단을 식별하는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자신의 선구자적 작업을 학문적으로 소개한 것이다.승중이는 아인슈타인이 강론한 그 훌륭한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얻은 후, 발티모아의 죤스 홉킨스 대학의 천문학과에 박사과정 후 연구교수(post-doctoral research fellow)로서 좋은 직장을 구해 2년간 근무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만 들여다보고 있자니 공허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땅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 땅의 역사, 미술사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어쩌다가 철학과 고전을 공부하게 되었지만 나에게는 숨길 수 없는 천부적인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 나의 부인 최영애도 성운학(聲韻學)이라는 매우 딱딱한 학문을 평생 전업으로 삼았지만 본시 화가 지망생이었다. 이러한 핏줄의 영향 탓인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숨길 수 없는 예술적 재능이 있다. 나는 세 자녀와 아내와 함께 세계의 어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하나의 작품을 놓고 한없이 담론을 펼치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나는 승중에게 미술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누구나 전공하는 근현대미술사를 기웃거리지 말고, 아예 서구문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고대미술사를 전공해보라고 권유했다. 희랍 미술사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전공하는 학도가 거의 없고, 또 세계적으로도 동양인으로서 그 방면에 성취가 큰 인물이 별로 없으니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했다. 하늘의 감각을 가지고 땅의 예술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희랍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그래서 승중이가 먼저 도전한 곳이 버지니아대학의 미술 사학과 석사코스였다. 버지니아대학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에 의하여 1819년에 만들어진 유서 깊은 대학이래서 고전학에 대한 매우 깊은 존중이 있다. 희랍 철학과 예술 방면으로 매우 훌륭한 학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다. 승중이는 이 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는 동안 훌륭한 교수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로마에 관한 스칼라십이 수만 개가 되는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통계학을 이용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구한 석사논문을 썼다. 승중은 버지니아대학에 있을 동안 많은 현지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고고학의 생생한 지식을 얻었다. 승중은 곧 콜럼비아대학의 예술사고고학과의 박사과정에 풀 스칼라십을 얻어 들어갈 수 있었다. 제2의 박사반 인고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희랍미술사 연구에 영감 준 천체물리학적 감각
▎그리스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산토리니, ‘빛에 씻긴 섬’이라 불리며 파란 하늘과 하얀 건물의 조화가 아름답다. / 사진·중앙포토 |
|
승중이가 토론토대학의 희랍미술고고학 교수가 된 것은 본인의 실력도 출중했지만 행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미국의 일류대학에서 박사를 딴다고 해서 다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자리가 나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희랍미술고고학 방면이라는 것은 학생 수도 적으니만큼 교수자리가 전 세계에 손꼽을 만큼 적다. 그런데 토론토대학에서 2012년 겨울에 그 방면에 테뉴어 트랙(tenure track: 조교수로 채용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심사에 통과하면 종신교수직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의 교수 한 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낸 것이다. 그 한 자리에 전 세계의 우수한 박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은 뻔한 이치였다. 그런데 승중이는 당시 박사반 학생이었고 아직 논문도 끝내지 못한 상태였다. 하버드, 컬럼비아, 예일, 시카고, 버클리 등 유수 대학 출신의 쟁쟁한 박사들이 모두 지원서를 냈다.승중이가 생각하기에도 그 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은 모두 학회에서 만난 쟁쟁한 인물들이었다. 승중이는 자신이 없다고 했다. 2012년 11월에 토론토에 집결하여 한 사람당 2일에 걸치는 집중심문, 토론, 공개 강의가 벌어지는데 승중이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 지역을 강타하여 막대한 재산·인명피해를 내고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승중의 인터뷰만 다음 해 다른 시기로 미루어졌던 것이다. 승중은 오히려 차별화될 수 있었고, 인터뷰에 새롭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다. 그런데 더더욱 고마운 것은 컬럼비아대학의 스태프 7명이 모여 승중에게 모의 인터뷰 회합을 열어준 것이다. 그래서 승중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교수들의 질문에 응대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주었다. 승중이는 완벽한 마음의 준비를 지니고 교수채용 인터뷰 강단에 설 수 있었다. 승중이는 완벽한 바이링구얼(bilingual, 2개국어 사용자)이라서 영어가 외국인 티가 나질 않는다. 이틀에 걸친 심사가 끝날 즈음, 학과장이 뉴욕보다 토론토가 살기가 더 좋다는 등 농담을 던지더라는 것이다. 교수채용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접한 순간, 맨해튼의 늦은 오후, 승중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컬럼비아대학 교정을 올라가 선생님이 계신 연구실을 노크했다.그리고 그 순간 선생과 학생이 같이 따스한 시선을 던지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에도 이러한 사제지정이 있다. 인간의 감정이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임용 사건 하나가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을까? 한 진실한 학자를 만들어가는 교육체제가 아직도 미국에는 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중이의 컬럼비아대학 학위논문은 토론토대학의 교수생활을 시작하면서 완성한 것인데(2014년), 그 논지의 핵심이 이 잡지에 같이 실렸으므로 부연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승중의 논문제목은 [Concepts of Time and Temporality in the Visual Tradition of Ancient Greece ─고대 희랍의 시각 전통에 있어서 시간과 시간성의 개념들]이다.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원하는 ‘사드’는 탐지거리가 최대 2000㎞에 달하는 레이더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 / 사진·중앙포토 |
|
천체물리학(Astrophysics)이라는 학문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간의 개념, 그 인식론적 층차에 관하여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승중이는 희랍미술사를 전공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추상적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뉴턴이 절대공간·절대시간을 말한 것은 매우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이미 시간·공간을 추상적인 주제로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공간의 개념은 칸트에 있어서 의식내부의 사건, 의식외적 사건이라는 인식론적 테제로 철학화되었고, 이 시·공의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시공연속체로 발전하면서 무수한 철학적 변양을 일으켰다. 20세기야말로 시공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만개한 백화노방의 시기라 할 것이다. 승중이는 이러한 20세기의 인식론적 성과를 빌어 희랍인들의 생명론적 시간의 계기를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로서 <신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마가복음> 1:15에 예수의 말로서 다음과 같은 외침이 적혀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체포된 직후였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북한 어린이들이 지난 2월 22일 개성시내 도로변에 모여 놀이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월 11일 전면 가동 중단된 후 폐쇄된 상태다. / 사진·중앙포토 |
|
여기서 막상 “때가 찼다(The time is fulfilled)”라는 표현은 깊게 생각해보면 참으로 난해한 것이다. ‘때’가 마치 객관적인 물체처럼 대상화되어 있고 그것이 주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인식의 속성이 아닌 것처럼. ‘때’를 물병에 비유한다면 때라는 물병에 물이 다 찼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여기서 ‘때’가 곧 승중이가 말하는 ‘카이로스(Kairos)’다. 크로노스가 양적인 개념이라면 이 카이로스는 질적인 개념이고, 보편적인 균일한 시간의 개념이 아닌 특정한 시점, 그것은 인간의 ‘삶의 시간’과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의 최대의 특징은 철저히 ‘현재화’된다는 것이다. 예수에게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임재하는 기회이며, 그것을 맞이하는 인간의 인식이 바뀌어야(메타노이아: 생각의 회전, ‘회개’라는 죄의식 개념은 오역이다)하는 시점이며, 좋은 뉴스(복음)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각이다.동학의 창시자 최수운(崔水雲, 1824~1864) 선생은 1861년 남원(南原) 서쪽 교룡산성 은적암에서 수도할 때 다음과 같은 칼춤 노래(검결, 劍訣)를 지었다.
시호(時乎)! 호! 이내 시호!부재래지(不再來之) 시호(時乎)로다!만세일지(萬世一之) 장부(丈夫)로서오만년지(五萬年之) 시호(時乎)로다!용천검(龍泉劍) 드는 칼을아니 쓰고 무엇하리.무수장삼(舞袖長衫) 떨쳐 입고이칼저칼 넌줏 들어호호망망(浩浩茫茫) 넓은 천지일신(一身)으로 비껴 서서칼노래 한 곡조를시호 시호 불러내니용천검 날랜 칼은일월(日月)을 희롱하고게으른 무수장삼(舞袖長衫)우주(宇宙)에 덮여있네만고명장(萬古名將) 어데 있나장부당전(丈夫當前) 무장사(無壯士)라!좋을시고 좋을시고이내 신명(身命) 좋을시고!여기서 말하는 ‘시호 시호’의 ‘시(時)’가 바로 카이로스이다. 이 카이로스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때요, 만세(萬世)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장부에게 5만 년 만에 찾아온 카이로스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수운은 이러한 기개로서 조선의 근세 최대 규모의 혁명을 완수시켰다. 동학이 없이 우리는 조선민족의 근대성(modernity)을 말할 수 없다. 동학이 없이 3·1독립항쟁을 말할 수 없고, 3·1독립항쟁이 없이는 우리의 헌법 전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헌법전문이 무시되는 한 우리 민족에게 민주주의는 찾아오지 않는다. 일본민족이 메이지유신(1868~1912)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민족은 인내천의 근대적 동학사상을 완수했다. 그것이 비록 정치제도적인 결실을 당대에 못 맺었다 해도 그 사상에 깔려있는 만민평등적 휴머니즘과 인간 개개인의 존재성을 신과 동격으로 규정한 인내천의 존엄평등주의는 서구의 어떠한 민주사상의 인식론·존재론도 뛰어넘는다.지금 우리는 수운의 우주적 기개를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다!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월을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네(칼춤을 추는 소매 적삼의 늘어진 천이 우주를 휘덮는다는 뜻). 만고명장 어데 있나 장부당전 무장사라(나 장부를 당해낼 장사는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이다. 장부는 평화요 장사는 폭력을 상징한다).지금 우리 민족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위기는 항상 기회였다. 그것은 만세일지 장부에게 찾아온 오만년지 카이로스였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카이로스를 놓치기만 했다. 이제 우리는 그 ‘때’가 찼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때가 왔다! 조선의 민중이여! 생각(노이아)을 바꾸라(메타)!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신질서(바실레이아)가 도래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지금 우리의 문제는 야(野)의 문제도, 여(與)의 문제도 아니다. 한 개인의 정치적 권세나 안락이나 정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국운(國運)’ 전체의 문제이다. 국운이란 곧 국가 전체의 카이로스라는 의미이다. 왜 우리는 이 카이로스를 잡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카이로스를 전관(全觀)할 수 있는 총체적 비전을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도 결핍한 인간들이 되었는가? 왜 카이로스의 비전을 결하고 있는가? 그 이유 또한 매우 단순하다! 민족 전체가 가위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다. 왜 가위에 눌렸는가? 그 이유 또한 매우 단순하다. 첫째는 일제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이요(국체상실의 체험), 둘째는 6·25를 거쳤기 때문이다(동족의 상잔, 相殘). 첫째로 우리는 대일본(對日本) 굴종주의의 비속함을 배웠고, 둘째로 우리는 미국의 메시아니즘에 대한 환상을 배웠다. 전자는 자기배반의 역사를 만들었고, 후자는 맹목과 절대의 반 공주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 모두가 역사적 현실에 뼈저린 뿌리를 둔 것이나, 이 진흙 속에 머무르면 우리는 흑암의 미로만을 헤맬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 미로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몸부림치는 북한, 여유 가지고 조망해야북한의 핵문제는 우리의 반공사상의 어리석음이 조장(助長)해온 것이요, 미국의 친일·반중적 아시아정책이 장조(長助) 해온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 그 책임소재를 밝히자면 오직 미국의 무지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무지라는 것은 한민족에 대한 무시를 의미하는 것이요, 미·일공조를 통한 세계대축의 이득을 위해 중·러·한을 가지고 놀자는 천박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타 지역에서는(유럽·쿠바·중동·이란 등등) 근원적으로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려고 하는 미국이 이 동아시아지역에서만은 철저히 냉전적 사고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의 묘미를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기에는 미국은 아직 냉전의 꿀맛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군사제국의 권위와 체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상의 대적세력을 살려놓아야 한다.생각해보라! 클린턴만 해도 임기 말년에 북한을 친히 방문하여 근원적인 화해를 성취하고자 했다. 북한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대립국면으로만 치닫는 이유는 그 제1의 이유가 미국의 세계질서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있는 것이요, 그러한 인식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민족이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어찌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남북한이 화해와 양보의 미덕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가? 정치, 외교가 고작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막대한 출혈도 불사하는 용기를 가진 정부라면 왜 백악관에 찾아가서 카스트로를 응대하듯 보다 근원적인 대응책을 찾아 달라고 호소하고 세계인들의 평화지원을 호소하지 않는가? 내가 독방에 앉아 관념의 망상을 짓고 있는 것일까? 사드(THAAD)는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우리 편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핸들링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카드이거늘, 어찌하여 그패를 까버리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협상하며 우리를 가지고 놀게 만드는가?지금 우리 민족의 중대한 위기는 오직 우리민족 스스로의 무지가 만들고 있을 뿐이다. 북한을 대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여쁜 마음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가냘픈 생명이 자기보존과 자기인식을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가련한 모습을 어찌하여 막강한 상전으로 모시고만 있느뇨?아~ 이 민족은 정녕코 또다시 멀어져만 가는 카이로스의 민 대머리 뒤통수만 쳐다볼 것이냐! 모두가 반성할 때다!
도올 김용옥 - 도올 김용옥은 우리시대의 문제의식을 다양한 학문 분야의 시각에서 천착해가면서 6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낸 철학자·의사·예술가·교육자다.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동서양의 고전을 공부한 후 오랜 유학의 길을 떠났다. 국립대만대학 철학과에서 노자철학으로 석사, 일본 도쿄대학 중국철학과에서 명말청초의 사상가 왕 후우즈(王夫之, 1619~1692)의 우주론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왕 후우즈의 <주역> 해석을 둘러싼 문제들을 동·서 고전철학의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만 10년간의 유학생활을 통해 그는 황 똥메이(方東美), 후쿠나가 미쯔지(福永光司), 야마노이 유우(山井湧), 벤자민 슈왈츠(Benjamin I. Schwartz) 등 세계학계의 거장 밑에서 배움을 얻었다.1982년 고려대 철학과 부교수로 부임해 1985년에는 정교수로 승진했고, 1986년 군사정권에 항거하여 양심선언을 발표하며 교수직을 떠났다. 그 뒤로 올해까지 30년간 타협 없는 학문의 길을 걸었다. 1999년 EBS 노자강의를 시작으로 KBS, MBC, SBS, EBS 등에서 행한 수백 회의 고전강의는 인문학의 대중소통시대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 3월 6일부터는 JTBC에서 <차이나는 도올> 강연을 시작하며 방송에 복귀했다. 2014년 중국 옌벤대에서 객좌교수로 1년간 강의하며 얻은 새로운 식견과 통찰이 방송 강의의 테마다. 그 성과물인 <도올의 중국일기>도 마침 5권까지 나와 지식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