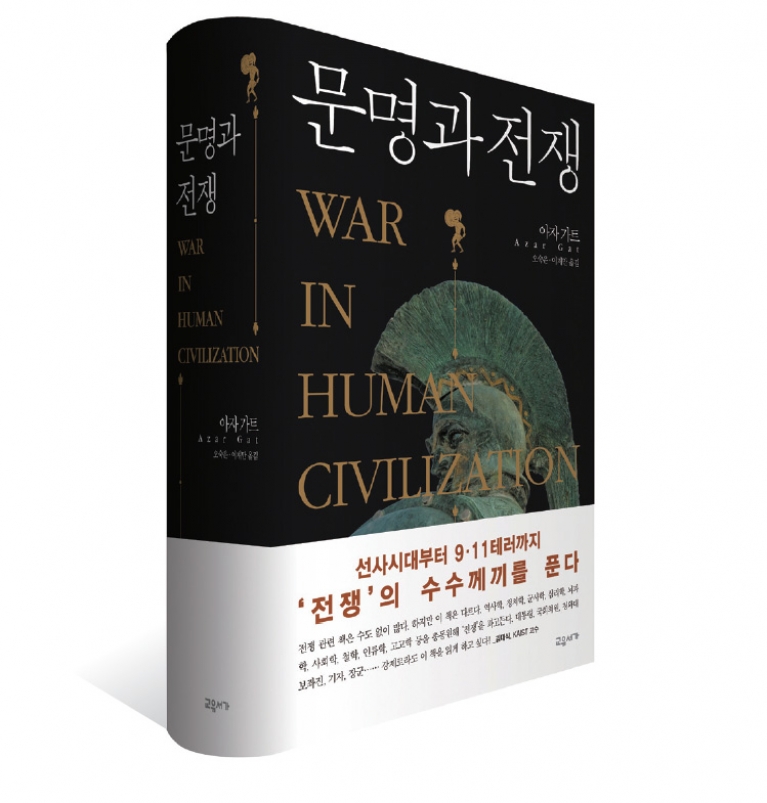평화의 승리를 점치는 것은 환상… 온갖 사악함에도 불구, 전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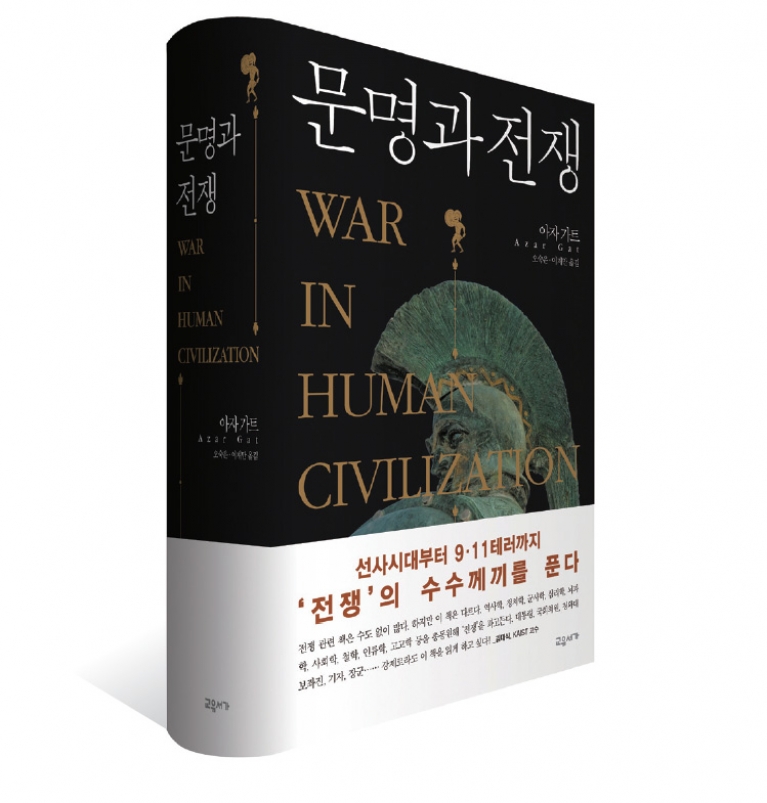
▎문명과 전쟁 / 아자 가트 지음┃오숙은·이재만 옮김 교유서가┃5만3000원 |
|
전쟁이라는 유령이 한반도를 배회한다. 그 유령이 좀비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두 사람이 벌이는 ‘전쟁 굿판’이다. 그래서 불안감은 더하다.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던 제1차 세계대전의 황당한 캐치프레이즈가 떠오른다. 불과 20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을 부른 그 전쟁 말이다.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전쟁이 존재했던 시대는 이미 100년 전에 사라진 것 아닌가. 더 첨예한 갈등을 부르는 차원이라면 그래도 견딜 만하다. 거의 완전한 파괴, 지구 전체의 종말을 예비하는 핵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호언하는 전쟁이 두려운 것이다.핵의 가공할 파괴력이 강대국 간의 전쟁을 막았다는 역설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역설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누가 상호 절멸이 확실한 전쟁 개시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겠는가. 후루시초프나 케네디, 마오쩌둥이나 레이건도 핵전쟁 돌입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공포의 균형 속에 이뤄지는 평화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처럼 ‘불건전한 평화’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며,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전쟁 준비를 맨 앞에 두기 마련이다. 그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 북한은 물론, 한국과 미국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온갖 사악함에도 불구, 전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학자로 군사사(軍事史), 군사사상, 군사전략 분야의 대가인 아자 가트의 견해도 그런 비관론에 뿌리박고 있다. 대규모 폭력 분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였다는 것, 싸워서 얻고자 하는 대상과 인간 욕구의 대상이 줄곧 같았다는 점을 그는 주장한다.인류가 진화한 200만 년 중 199만 년 동안 모든 인간이 ‘자연선택’의 압력을 받으며 진화했다고 본다. 투쟁하는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를 살펴보려면 지난 200만 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방법론이다. 그는 ‘고결한 야만인’을 상상했던 루소보다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만인대 만인의 투쟁’을 벌인다고 보았던 홉스의 사상을 두둔한다.‘평화로운 야만인’은 허상이었고, 수렵채집인 집단 간에는 싸움이 만연했고, 습격과 역습이 일상이었으며, 싸우다 죽는 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본래 수렵채집 환경에서 진화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인공적·문화적 환경에서도 인간의 상호 적대행위를 계속 추동한다고 봤다.하이라이트는 제3부다. 근대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와 기술적 혁신을 성취한 군사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전쟁 능력의 혁명적 진화가 기존의 경제·군사 조직을 전 세계적 규모로 파괴하고 대체한 과정이다. 도덕적 열정과 감상이 일절 배제된 그 같은 분석에 독자는 전율한다. “평화의 승리를 점치는 것은 환상”이라는 단호한 경고 때문이다. 그 경고에는 인류의 역사가 ‘폭력의 승리’이며, ‘평화는 그 부산물’일 뿐이란 서글픈 메시지가 담겼다.- 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 glutton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