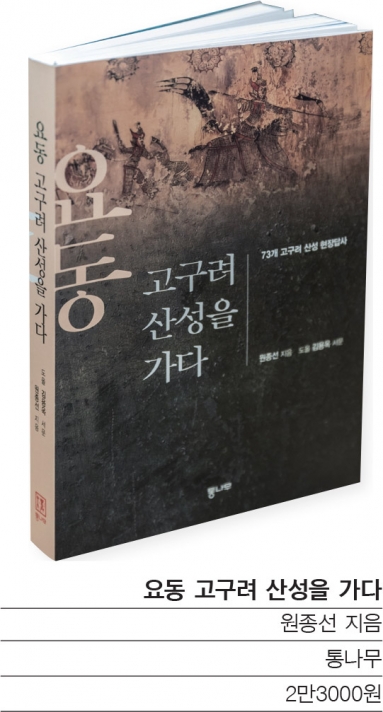고구려는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 주변국이나 후대에 기록한 사서를 통해 대략을 유추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인물의 영웅서사시에만 관심이 쏠린다. 고구려·수 전쟁이 단적으로 그렇다. 고구려를 정복하겠다며 운하를 뚫고 정병 113만 명을 동원한 수 양제(煬帝)는 ‘미치광이 폭군’으로, 살수대첩에서 적군을 몰살한 을지문덕은 ‘민족의 영웅’으로 묘사될 뿐이다. 이때 ‘고구려’라는 국가는 역사성을 잃고 신화로 전락하고 만다.‘요동’이란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저 ‘그곳에 요동이 있었기에 지켰노라’가 아니다. 요동은 대륙세력에게는 만주와 한반도, 나아가 대양으로 진출하는 입구이며,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그래서 수나라는 ‘미친 전쟁’을 반복했고, 구한말 러시아와 일본은 뤼순과 다롄을 놓고 일전을 벌였다. 요동이야말로 중국 동북부와 만주, 한반도의 패권을 상징하는 땅인 것이다.수·당은 물길을 통해 고구려로 진군했다. 고대 국가로서는 선박만큼 효율적인 수송 수단이 없었다. 마침 요동에는 수십 개의 강이 있었다. 이에 맞서 고구려는 요동에만 200여 개에 달하는 산성을 축조했다. 바다나 강 인근에 만들어 침략군 동향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한 것이다. 산성 한 곳이 공격받으면 인근 산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고안된 덕에, 적은 병력으로도 대군을 막을 수 있었다.이 책은 재중(在中) 사업가인 저자가 요동반도에 포진해 있는 73개의 고구려 산성을 두 발로 뛰어다닌 답사기록이다. 요동의 성터 하나하나를 답사하며 찍은 수많은 현장사진을 수록해 이해를 돕고, 현지의 지형과 지도는 직접 그려 설명을 덧붙였다. 대륙에 맞선 응전(應戰)의 현장들을 살피다 보면, 고구려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문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