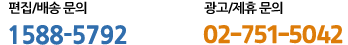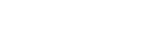만 55세 이후 언제든 수령...
은퇴 크레바스 건너는 징검다리 효과
회사원 박모(51)씨 지난해부터 연금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자 개인퇴직연금(IRP)을 가입했다. 새로 늘어나는 한도 300만원은 전액 IRP에 한해 허용된다. 그의 IRP 계좌에는 벌써 500만원이 넘는 잔액이 쌓여 있다. 금융회사가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내용을 알고 있다.IRP 공제 한도가 추가되면서 연금계좌를 통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지난해부터 최대 700만원이 됐다. 세액공제 환급액은 최대 52만8000원에서 39만6000원이 추가되면서 연간 92만4000원으로 늘어났다(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세율 16.5%가 적용돼 115만5000원까지 세액=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씨는 “자동이체 해놓고 잊고 있었는데 2년 사이 공돈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박씨처럼 되려면 IRP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IRP는 퇴직 연금사업을 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느 금융회사든 관계없다. 가입 경로는 두 가지다. 우선 금융회사 직접 방문부터 보자. 구체적 절차는 일반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와 다를 바 없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불입금을 정하고 가입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해 놓으면 매달 저절로 연금이 쌓인다.또 다른 경로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다. 이른바 ‘IRP 전자 청약’인데 전혀 어렵지 않다. 공인인증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 IRP는 가입자 자신이 상품을 운용하도록 설계돼 있어 전자청약이 갖는 장점이 많다. 어차피 IRP 계좌를 가진 후에는 언제든 홈페이지에 들어가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펀드를 바꿀 수도 있어서다. 전자청약을 통한 계좌 개설은 10~20분가량이면 절차를 마칠 수 있다.IRP가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퇴직연금과 다른 것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는 기존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놓는 상품이고, DC는 개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운용에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IRP인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관건이다. 운용 방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안정형부터 공격형까지 크게 달라진다. 연금 관련 세액공제 전체 한도 7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본인 선택에 달려 있다.IRP의 운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사실상 예금이나 다름없는 원리금보장형과 펀드처럼 투자 성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실적배당형이다. 원리금보장형은 안정성에선 장점이 있지만 저금리 기조와 0.3~0.5% 수준의 운용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수익률이 1%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실적배당형은 수익률을 높일 여지가 크다. 실적이 좋은 금융회사에서는 연 2~3%대 수익을 내기도 한다.IRP는 만 5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 이후 언제든지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은퇴 크레바스(빙하지대의 거대한 틈새)’를 건너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얘기다. 다만 IRP는 부분 인출은 불가능하다. 모두 연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언제라도 중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원금과 총 운용수익은 16.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 1200만원 이하까지는 3.3~5.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필자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다(d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