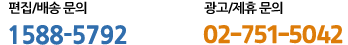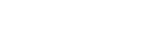보통 한국의 성인은 하루 100~200g의 변을 배출한다. 이와 달리 육류를 즐기는 서양인은 하루 100g 미만의 변을 배출한다. 변의 양이나 모양, 색깔은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 채식을 주로 하면 배변량이 많고 배변에 수분이 많다. 육식을 주로 하면 배변량이 적고 수분도 적고 단단한 편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제된 가공식품 섭취가 늘고 섬유질 섭취가 줄어들면서 변의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변의 냄새도 먹는 음식에 따라 다양하다. 초식동물의 변은 냄새가 덜 나고 순하다. 육식동물의 변은 고약한 누린내가 난다. 초식동물은 위의 크기도 크면서 오랫동안에 걸쳐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길다. 육식동물은 육식에서 나오는 독소가 많아서 체외로 독소를 빨리 빼내야 하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짧다. 한국인은 주로 채식을 하던 민족이라 서양인에 비해 장의 길이가 길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식과 고지방 식사를 자주하면 장에 음식물이 쌓여서 독소를 만들게 되고, 장의 근육을 무력화 시켜서 변비를 유발한다. 독소는 장내부의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용종이나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남성 중에 대장암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식습관과 관련이 많다.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영화 [광해]를 보면 임금 행세를 하는 가짜 광해(이병헌)이 시녀들 앞에서 대변을 보는 장면이 인상 깊게 나온다. 당시 임금의 변은 관리의 대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과 왕비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어의가 변의 색깔을 확인하고 맛까지 봤다고 한다. 임금의 변은 ‘매화’라고 불렀다. 임금은 이동식 좌변기인 매화틀을 사용하여 변을 누었다. 볼일을 보고 나면 어의들이 ‘매화’를 살펴 임금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