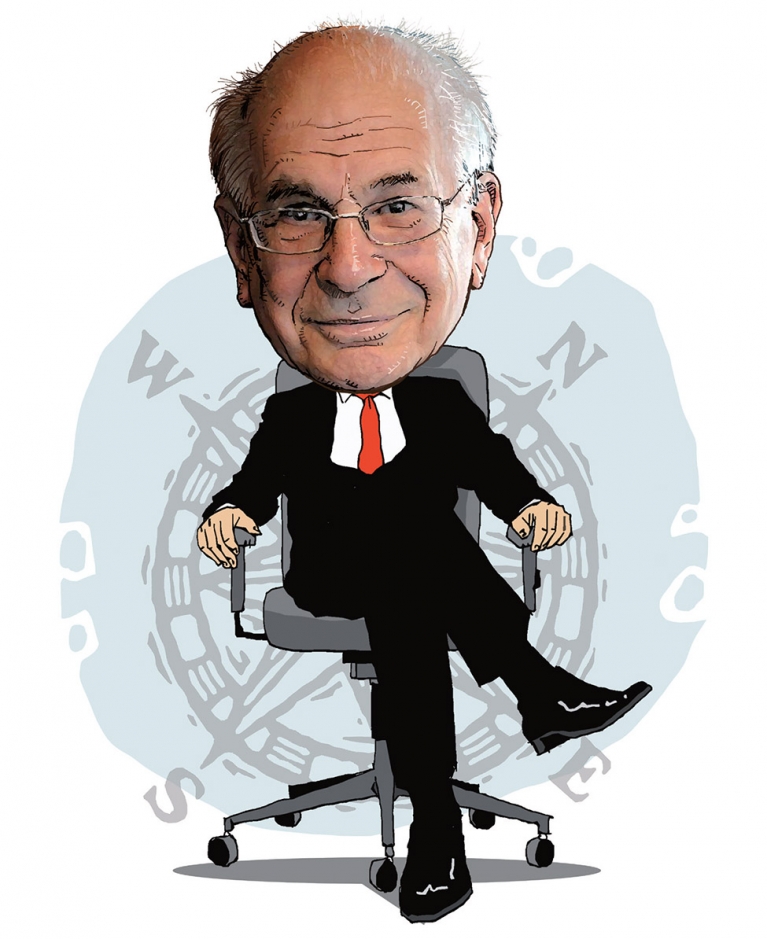|
벼룩시장서 중고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소유효과는 오래 소지한 물건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중고품이 거래되는 벼룩시장에선 판매자가 가격을 높게 부르는 바람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일반 시장의 상인은 판매할 상품을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효과의 영향을 덜 받는다. 상품권처럼 추상적인 물건도 소유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기업들은 소비자의 소유효과를 마케팅 전략에 이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체험 마케팅이다. 김치냉장고 딤채는 제품 출시 초기인 1996년 약 200명의 품질평가단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3개월 간 무료로 김치냉장고 제품을 사용해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100% 구매로 이어졌다. 이는 딤채의 좋은 품질만으론 설명할 수 없다. 일단 체험하게 되면 소비자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소유효과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소유효과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거의 소유할 뻔한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백화점에서 어떤 상품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상품을 가져가버리면 마음이 쓰린 것이 그런 예다. 이런 심리를 ‘가상 소유권’이라고 한다.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소유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송모씨 이야기다. 그는 12년 전 은행 빚을 동원해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5억원 주고 샀다. 이 아파트는 한때 12억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집값이 9억원으로 떨어졌다. 노후준비를 하려고 집을 내놨지만 문의조차 없었다. 다행히 최근 아파트 호가가 오르더니 최근엔 11억50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집을 팔면 6억5000만원의 차익이 생기지만 최고 시세보다는 5000만원을 덜 받는다. 송씨는 집을 팔 수 있을까.간단히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다. 아파트 처분에 따른 손익만 따지면 된다. 집을 팔면 전체 자산이 늘고 원하는 노후준비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팔면 된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에겐 12억원이란 추억의 가격 때문에 소유효과가 생겨 매도를 머뭇거리게 된다. 결국 부동산 경기 하락과 함께 집값도 떨어지면서 팔 타이밍을 놓치고 만다. 송씨뿐만 아니라 대개의 내 집 소유자들이 소유효과의 함정에 빠져 집 처분에 실패한다.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상승기에 어떤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는데, 왜 내 집은 오르지 않느냐며 속앓이를 하는 건 그래서다. 여기서 도가 지나치면 아파트 주민들끼리 얼마 이하로는 내놓지 말자며 방을 써 붙이는 담합 행위를 하기도 한다. 다 소유효과에 빠져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소유효과 함정에 빠진 내 집 보유자들주식은 어떨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구체적인 물건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종잇조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보유한 주식이 발행된 회사를 ‘내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유효과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 무언가에 개인적인 감정을 이입할수록 헤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구입한 주식의 가격이 자꾸 떨어져도 쉽게 팔지 못한다.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며 희망고문을 하다가 급기야 큰 돈을 날릴 수 있다. 워런 버핏의 일등 참모 찰리 멍거는 소유효과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젊은 시절 그는 돈벌이가 되는 투자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전 재산을 투자한 상태여서 여유 자금이 없었다.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일부를 팔아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유효과가 그를 주저하게 만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멍거는 5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주식투자에서 소유효과를 벗어나는 길은 주식을 소유하는 물건으로 보지 말고 잠시 머물렀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종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애착이 사라져 쉽게 헤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은 초심으로 돌아가기다. 보유한 주식을 팔기가 망설여진다면 ‘이 종목에 투자하기로 했던 당시로 돌아간다면 과연 지금 시점에도 이 종목을 살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소유 효과에서 벗어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필자는 중앙일보 ‘더, 오래팀’ 기획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