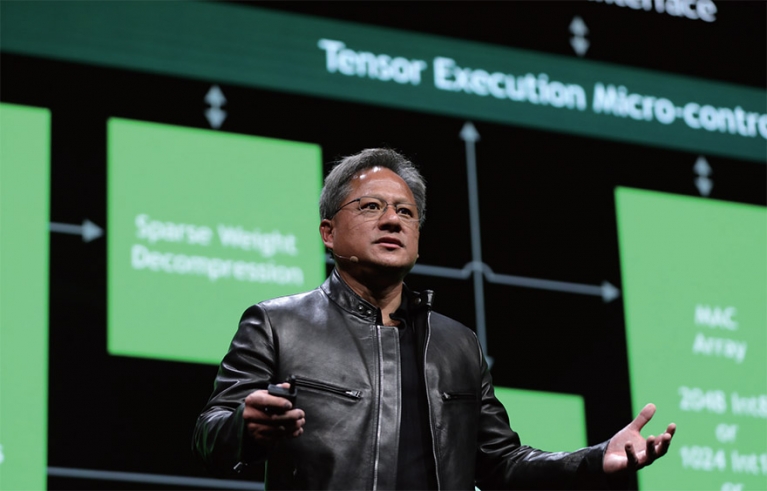|
다가오는 IoT 시대 대비 위해 암 인수기업의 합병이 상보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라고 본다면 이 둘처럼 이론상 잘 어울리는 조합은 드물다. 우선 GPU와 CPU의 결합이다.엔비디아는 늘 CPU를 만들고 싶어 했다. 암 기반의 테그라 시리즈가 있어서 닌텐도 스위치나 테슬라 등에 채택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성공이라고 말하기엔 많이 모자라다. 이 정도의 국지적 존재감을 원했던 체급이 아니다. 모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작동하려면 결국 CPU가 있어야 한다. 어느 소프트웨어도 GPU만으로 완결될 수 없다. 엔비디아는 GPU밖에 없는 삶의 불안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도전을 계속해 왔다.암은 반도체 회사라기보다는 판권 매니지먼트 회사에 가깝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라이선스를 받거나 협업을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인수하려 할까? 엔비디아가 CPU 보완 정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 그 돈을 쓸리가 없다.지금까지의 경험상 저 미래의 코너 뒤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어서다. PC가 퍼질 때, 인터넷이 퍼질 때, 스마트폰이 퍼질 때 요동친 것은 PC나 스마트폰뿐만이 아니었다. 업계 전체의 질서도 함께 흔들렸다. 지금의 강자도 원래부터 강자는 전혀 아니었다. 지금 서버의 표준이 된 인텔 칩(x86)은 닷컴 붐 때만 해도 그저 변방의 PC 서버였을 뿐이다. 중요한 업무의 서버에는 스파크(솔라리스)나 파워PC(AIX) 등이 쓰였다.엔비디아는 비트코인 채굴과 알파고의 등장 후 본인들의 성장 스토리를 잘 알고 있다. 또 한 번 변화의 파고가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민하고 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이미 포화상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아니라 미개척의 IoT 시장이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CPU 들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가.지금은 클라우드와 스마트폰의 시대. 클라우드는 엔비디아와 인텔이, 그리고 스마트폰은 암이 점령하고 있다. 엔비디아 매출의 절반은 이미 데이터센터에서 나온다. 이 분야의 점유율은 벌써 87%, 인공지능 분야에서 엔비디아는 사실상 표준이다. 게다가 데이터센터의 인텔 칩을 암 기반 칩들이 야금야금 파고들고 있다. 아마존 등 클라우드의 큰손들도 암 기반 자체 칩을 만들고 있다.서버에서 PC까지 암 명령 기반 기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텔 칩이 선배들의 서버 칩들을 대체해 버린 것처럼, 암 기반 칩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인텔을 몰아낼지도 모른다. 맥은 자체 암 칩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서피스에 비 인텔칩도 출시했다. 혈맹 윈텔(윈도-인텔)의 조합도 영원하지 않다. 한번 분위기가 밀리면 속수무책인 것이 납품업의 세계다.IoT 기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중앙집중에서 분산으로 트렌드가 이동할 수 있다. 마치 주전산기의 일부가 PC로 대체되듯 말이다. 기지국처럼 사방팔방에 작은 데이터 및 프로세싱 센터, 즉 엣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람은 아무리 잘해야 한두 개의 스마트폰만 휴대할 수 있지만 웨어러블에 스마트홈, 그리고 공장과 사무실 등 그 한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기계의 수는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그 기계들은 대부분 암의 명령어로 구동될 것이다.학습은 클라우드의 학습공장에서 하고, 추론은 IoT의 엣지에서 하는 일이 당연시될 수 있다. 엔비디아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인수가가 보유 현금의 4배 이상이라도 상관없다.
장밋빛 미래 위해 해결할 숙제 많아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건을 소프트뱅크는 왜 팔까? 흥미롭게도 2016년 7월 당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40% 이상의 프리미엄을 얹어주면서 호기롭게 암을 구매했을 때 똑같은 논리를 폈다. “미래는 IoT에 있다”고. 하지만 암의 이익률은 그때가 정점이었다. 매출은 다소나마 늘고 있지만, IoT가 정말 기하급수적 성장을 했다면 이럴 리 없다.사실 IoT 시장의 성장 속도는 생각처럼 빠르지 않다. 게다가 IoT 시장은 소비자 욕망의 집결체인 스마트폰 시장과 다르다. 스마트폰의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에서 암이 가져갈 몫과 IoT 장비의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인텔에서 암으로의 이행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에서 일어날지 미지수다. CPU 변경은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도구가 완비되어야 한다. 앱들도 새로 다시 컴파일해야 한다. 애플과 아마존의 결단이 큰 변수가 되고 있지만, 그들이 전부는 아니다.문제는 이번 인수가 성공적일 때 모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지금처럼 암에 올인하는 현 상황을 껄끄럽게 느낄 수밖에 없다. 모든 암 기반 회사는 RISC-V라는 오픈소스 대체재가 있기는 있다. 암이 변하는 날을 위해 만지작거리고만 있는 카드로 지금은 누구도 적극적이지 않지만 태도가 바뀔 수 있다.그보다 더 걱정해야 할 일은 영국과 중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이 합병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에 캠퍼스를 두겠다는 식으로 영국 규제 당국을 위로할 수 있겠지만, 암이 미국의 무역 분쟁용 병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퀄컴이 NXP를 사는 것을 막은 경험이 있다.이번 거래의 완결까지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가 암에 쓰게 되는 비용은 디즈니가 픽사(74억 달러), 마블(40억 달러), 루카스필름(40억 달러)을 사는 데 쓴 돈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현재 암의 수익으로 이 비용을 벌충하려면 100여 년이 걸린다. 다행히 충분히 오른 엔비디아의 주가가 있고, 반 이상을 일반주로 지불하게 되어있다.그럼 승자는 손정의일까? 그는 이제 엔비디아의 10% 남짓을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4년 전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의 10분의 1이었다. 같은 돈이면 엔비디아의 50%도 소유할 수 있었다.※ 필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겸 IT평론가다. IBM,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쳐 IT 자문 기업 에디토이를 설립해 대표로 있다. 정치·경제·사회가 당면한 변화를 주로 해설한다. 저서로 [IT레볼루션] [오프라인의 귀환] [우리에게 IT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