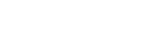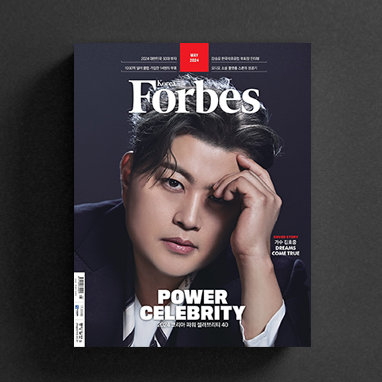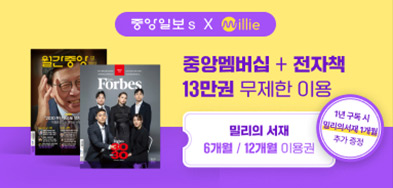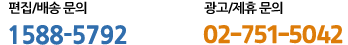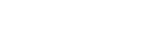얼마 전 국내 중소기업의 젊은 오너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대부분 가업을 승계한 사람이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되는 ‘기업승계’(succession planing) 문제에서 이들은 일단 성공적인 케이스다. 또 취업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 실업자에 비해 이들은 분명 행운아처럼 보였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들의 고민은 현실로 다가왔다. 고뇌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아버지 세대와 생사고락을 같이해 온 회사의 창업 1세대와의 갈등 극복이었다. 젊은 CEO로선 무언가 새로운 시도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혁신은커녕 작은 개선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괜히 일만 벌인다”며 곱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불안이었다. 기존 사업구조로는 망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대에 계속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신규 사업에 대한 목마름은 너무나 절실해 보였다.
최근 국내 경제의 재도약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에는 상생(相生)은 없고 오직 상전으로 모시는 상생(上生)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현실은 자못 심각한 상황이다.문제는 시장에 돈이 없어서도 정책이 없어서도 아니다. 상생에 관한 한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호환성 없는 컴퓨터 그 자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다. 실업률이 몇 십 %에 달하는 나라가 수두룩한 유럽에 비해선 양호하지만 8%대를 훨씬 넘는 국내 청년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기업 간 상생이 잘된다고 해서 지금의 청년실업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