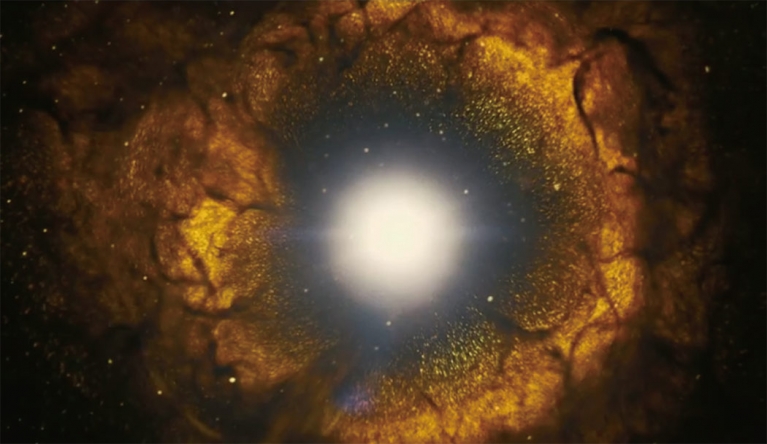영화 [오펜하이머]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양자역학의 대가 닐스 보어가 등장한다. “대수(代數/Algebra)는 악보 같은 거야. 중요한 건 악보를 읽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음악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지. 로버트(오펜하이머), 자네는 음악을 들을 수 있나?”

▎1946년의 오펜하이머.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던 그는 후두암으로 62살에 사망했다. / 사진:위키피디아 |
|
[오펜하이머]는 미국인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삶을 다룬 영화다. [배트맨] 시리즈, [덩케르크], [인터스텔라] 등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한 영국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1970~)의 최근 작품이다. 로버트 오펜하이머(1904~1967)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모였던 미국 과학자 그룹의 리더였다. 하버드대 학사에 독일 괴팅겐대학교 물리학 박사로서,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이해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교양이 넘쳐났던 이 독일계 유대인 천재의 삶은 영화가 잘 보여주듯이 파란만장했다. 덴마크인 닐스 보어(1885~1962)는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을 주도했던 인물로서 오펜하이머가 존경했고 원자폭탄 제작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 그룹에서 그가 같이 일했으면 했던 물리학자다.[오펜하이머]에서 위 대사가 특히 와닿았다는 이들이 있다. 천재 물리학자들이 음악을 거론하며 대화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놀란 감독은 어떤 의도로 저 장면을 집어넣었을까. 감독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문서를 찾을 수는 없었다.영화 초반부에서 보어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힘들어하던 오펜하이머를 만난다. 케임브리지에는 실험물리학과 수학을 중시하는 학풍이 있었던 것 같다. 오펜하이머는 그 수학과 실험물리학 역량이 좀 부족했다. 이론물리학자였던 그는 통찰과 직관은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대수, 악보, 음악’ 운운은 물리학을 제대로 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 오펜하이머에게 부족하다고 말했던 영국인 물리학자 패트릭 블래킷에게 보어가 했던 말이다. 보어는 이 말과 함께 독일 괴팅겐으로 가보라고 오펜하이머에게 권한다. 보어의 충고를 따랐던 오펜하이머는 괴팅겐에서 성과를 보였다.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강점을 잘 살려주는 학교를 찾아가라고 권했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닐스 보어의 유연함과 배려심이 인상적이다.보어가 했던 위의 말에 따르면 대수는 악보 같은 거고, 대수를 잘하는 건 악보를 잘 읽는 것과 견줄 수 있다. 보어가 이 논리들과 함께 대수를 잘하는 능력이 덜 중요할 수도 있다는 암묵적 가정까지 제시한 걸까. 이 가정에 힘을 보태주는 논리로써, 보어는 음악과 관련해 악보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보어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음악 듣기는 통찰과 직관을 바탕으로 물리학적 본질에 접근하는 것에 견줄 수 있는 것 같다. 그가 했던 이 말들과 그의 말 속에 전제/암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논리들이 옳을까? 보어의 명시적/암묵적 논리들에 대해 하나씩 간단히 생각해보자.
1. 대수학은 악보 같은 것(Algebra is like sheet music)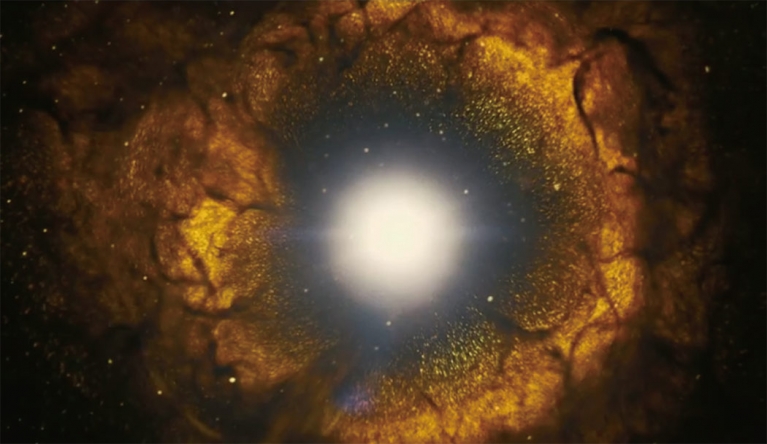
▎[ 오펜하이머] 속 오펜하이머의 양자역학과 핵무기 개발 기술에 대한 상상 속 이미지. / 사진:영화 [오펜하이머] |
|
이것은 학술대회에서 어떤 맥락과 함께 제시된, 엄밀하게 정의된 학문적 주장은 아니다. 보어가 실제로 한 말인지, 했다면 어떤 의미로 했는지, 영화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장면을 만들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대수학을 포함한 수학 분야와 음악학 분야에 공통으로 쓰이는 용어가 꽤 있다는 것과 수학적 방법론과 개념들이 음악을 연구하는 음악학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특히 현대적 음악학의 일부는 전문적 수학자이기도 한 서양 음악학자들에 의해 꽤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수학은 음악과 같은 것’이라는 비유는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보어는 대수가 음악이 아닌 악보 같은 거라고 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대수가 곧바로 물리학이 되지는 않는다. 대수는 물리학적 개념이나 이론을 표현하거나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 대수로 표현하기 어려운 물리학자의 직관적 영역이 있을까? [오펜하이머]는 종종 오펜하이머의 마음속 사유 과정을 시각화해 보여주는데, 그런 장면들에서 보이는 추상적 이미지들이 그의 직관과 통찰의 시각적 표현이 아닐까 추측해본다.대수와 물리학의 관계처럼, 악보가 곧바로 음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악보는 음악을 표현하고 기록해두는 한 수단에 불과할까? 악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악상의 직관적 영역이 있을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보어가 대단한 천재이긴 하지만, 그가 했던 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이 명제들이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공리는 아닌 것 같다. 증명된 정리도 아니다. 우리의 사유를 자극하는 상상력 넘치는 문제의식이기는 하다.
2. 대수를 잘하는 능력은 악보를 잘 읽는 능력과 견줄 수 있다두 능력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형이상학적일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두 능력이 뇌의 같은 부위에서 발원하는 것 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건 안다. 영국의 음악 인지학자 로렌 스튜어트는 사람들에게 악보 읽는 방법을 가르쳤다. 잘 배운 이들이 이후 악보를 읽을 때 뇌의 두정엽 부위가 활성화됨을 확인했다. 두정엽은 원래 공간표상 능력을 담당하는데, 이후 계산 능력을 담당하는 쪽으로 이용되었다고 신경과학자들은 말한다(사라제인 블랙모어 외, 『뇌, 1.4킬로그램의 배움터』, 해나무, 2009). 그런 두정엽이 이제 악보 독해 능력을 개화하는 데도 이용된 것이다.
3. 대수를 잘하는 능력이 덜 중요하다?이는 물리학적 사유를 할 때 대수학을 통하는 게 유일무이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이 아닐까? 실제로 몇몇 위대한 물리학자가 다른 방식으로 사유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영화 속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묘사되었으며, 아인슈타인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프랑스 수학자 아다마르는 그의 사유 세계가 언어적인지 시각적인지를 물었던 적이 있다. 상대성이론의 대가는 마음속에서 모호한 상들이 서로 유희하듯 관계 맺으며, 여기에 논리적 개념들에 이르려는 욕구가 가세해 사유가 추동된다고 답했다(재인용: 잔 루프너, 『지식과 감정에 대하여』, 자음과 모음, 2010).수학적이지 않은 사유가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유가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과를 냈고, 수학에 능통한 물리학자들은 그들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것 아닐까. 비슷하게, 악보 독해 능력이 출중한 음악가들과 악보 독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음악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적 경험을 하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4. 중요한 건 악보를 읽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음악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important thing isn’t can you read music, its can you hear it.)물리학자 보어가 고전하고 있던 젊은 오펜하이머를 앞에 두고, 물리학적 사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언가에 대해 말을 하다가,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음악 분야에서 참이라고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명제를 제안한 것이다. 핵심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물리학적 진실에 있다. 계산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그 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음악에 관한 이 명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 듯하다. 음악적 경험과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음악적 경험/행위를 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전문적 음악가에게 음악을 듣는 문제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며, 이 중요한 문제들과 악보 독해 능력의 문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일반인 중에서는 악보를 읽지 못하면서 음악을 잘 듣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보어는 음악을 잘 듣는 이를 높이 평가하며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
5. 로버트, 자네는 음악을 들을 수 있나?(Can you hear the music, Robert?)복잡한 악보라는 늪(?)에 빠지지 않고서 그것을 연주할 때 생성되는 음악의 큰 줄기를 오펜하이머 자네는 듣나? 그런 비슷한 능력을 물리학적 사유 과정에서도 동원할 수 있는가? 즉, 대수학이나 실험물리학적 현실성과 디테일을 웃도는, 상위의 무언가를 사유할 수 있나?보어가 오펜하이머에게 말하고 싶었고 당부하고 싶었던 건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오펜하이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그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분절화된 전문가들의 연구를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오펜하이머는 당시에는 새로운 유형의 과학자였던 것 같다. 자유로운 토론, 설득, 양보, 유보, 차이의 인정, 거래, 연결, 융합, 통섭으로 이어지고 상승하는, 엄청난 과학적/사회적 집단지성의 창발을 유도/생성했던 과학자. 이런 유형의 과학자를 역사상 가장 먼저 배출했고, 지금도 그런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해내는 미국이 멋져보인다.
※ 김진호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와 동 대학교의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4대학에서 음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안동대학교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매혹의 음색』(갈무리, 2014)과『모차르트 호모 사피엔스』(갈무리, 2017)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