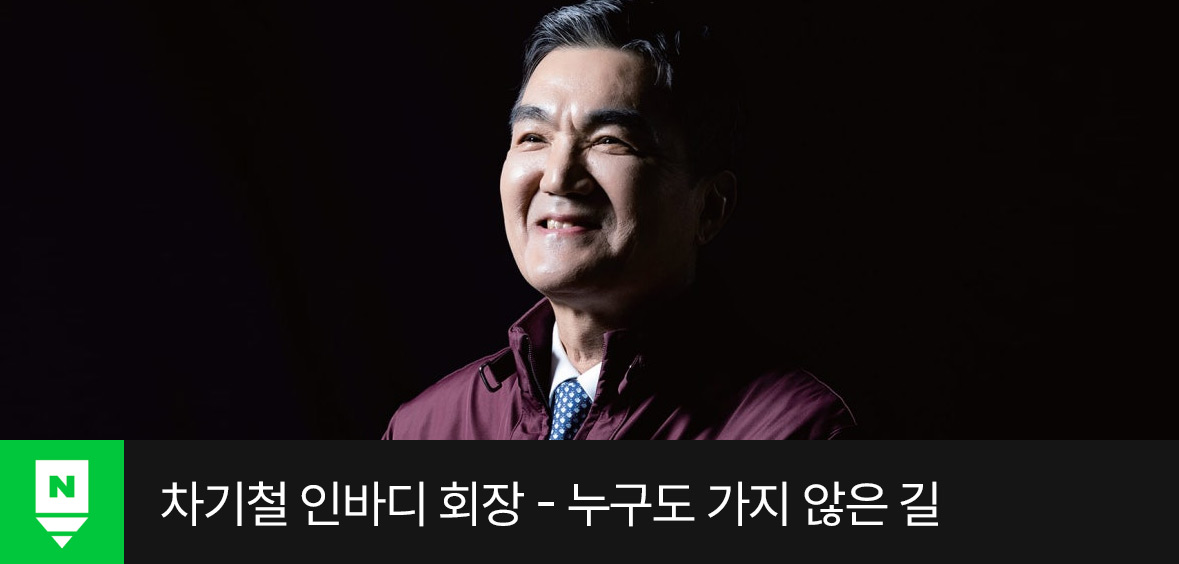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벤처·스타트업을 ‘유니콘(unicorn)기업’이라 부른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CBInsignts)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기준 전 세계 유니콘은 총 1220곳이며 이 중 한국 기업은 14곳이다. 이를 두고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혁신’에 뒤처졌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유니콘 또는 차기 유니콘기업 개수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그리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 최근 업계의 중론이다. 여기에는 국내 최초로 조(兆) 단위 상장에 성공한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업체) 파두의 저조한 실적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다. 상장 당시 파두의 시가 총액은 약 1조3000억원이었지만 지난 6개월(4~9월)간 매출액은 4억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파두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 벤처투자업계의 혹한기는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기업가치 평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벤처캐피털(VC)이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아기 유니콘이나 예비 유니콘, 미래 유니콘 등을 발표하며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장밋빛 전망을 선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선정한 차기 유니콘의 실적에서 파두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유니콘이나 차기 유니콘에 이름을 올리는 데 연연하지 말고 업종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벤처·스타트업 역시 기업으로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모의 성장과 수익 창출 사이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조성익 텔레픽스 대표와 김재면 메이크스타 대표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과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유니콘이 최종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유선 기자 noh.yous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