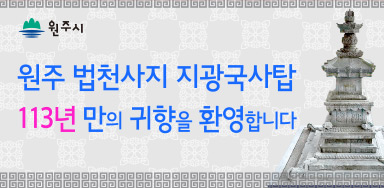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 51년 만에 처음 개최한 서예전인 ‘미술관에 書’가 열린 덕수궁에 가면 그림인 듯 글씨인 듯 오묘한 두 점의 작품을 볼 수 있다(코로나19로 4월 20일 현재 온라인 공개만 한 상태다). 하석(何石) 박원규(73) 선생이 지난 1월 쓴 ‘협(協)’과 ‘공정(公正)’이다. 각각 은나라 갑골문과 서주시대 청동 제기에 새겨진 글자를 재해석한 이 작품에는 ‘공명정대’를 외치고 ‘단합’을 부르짖던 정부에 진정 그렇게 해왔는지 따져 묻는 예술가의 기개가 서려 있다.
“서예는 메시지”라는 하석을 만나기 위해 서울 압구정동 ‘석곡실(石曲室)’을 찾았다.

▎서울 압구정동 ‘석곡실’에서 만난 하석 박원규. 그의 작품 ‘나무’를 앞에 두고 이중노출 방식으로 찍었다. 각종 붓과 글씨책, 그리고 25년 동안 매년 출간한 작품집 25권이 보인다. ‘석곡(石曲)’은 스승인 강암 송성용과 독옹 이대목 선생의 당호에서 한 자씩 따서 지었다. 그는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북을 치고, 사진을 찍으며, 커피 내리는 것을 즐긴다. 골프 실력도 나이가 무색한 ‘에이지 슈터(age shooter)’다. |
|
서울의 강남 하고도 한복판, 최고 부촌의 아파트 상가 건물 3층에 묵향 가득한 서실이 있다는 사실은 좀 놀라웠다. 하석이 이곳에 둥지를 튼 것이 1983년이니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정진해온 셈이다. 대만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두 달 만에 고향인 전북 김제를 떠나 상경한 그다.“고향에 있다가는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세월 다 가겠더라고요. 지방에서 아무리 유명해져 봐야 ‘지방 작가’일 뿐이고… 서울에서도 제일 부자 동네에서 뿌리를 내리겠다고 마음먹었죠. 사실 문화예술은 부자들의 후원으로 자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서예는 최고의 엘리트 문화 아닙니까.”
서예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운명이죠. 고향을 떠나 검사이던 이종사촌 형님 댁에 머물며 이리 남성고를 다녔는데, 그 집에서 본 석당 고석봉 선생이 쓴 ‘인지위덕(忍之爲德)’이라는 현판에 그만 꽂히고 말았어요. 그 글씨를 따라 써보고 특히 전각을 흉내 내다가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일요일마다 시내 병원과 식당을 돌아다녔어요. 거기에 좋은 작품이 많았거든.
어떤 선생님께 배우셨나요.사촌 형님 소개로 원광고 한문 교사였던 남정 최정균 선생님을 모셨죠. 나중에 원광대 한문학과 교수가 되신 조두현 선생님께도 배웠고요. 지금 전북도지사를 하는 송하진 지사를 중학교 다닐 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부친이 바로 강암 송성용 선생님이셨어요. 국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받아 전북일보에 대서특필된, 묵죽으로 한수이남에서 최고라 불리던 분이죠.
전북대 법학과를 나오셨던데.취직이 잘된다고 해서 법대를 갔는데, ‘직업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마다 집으로 형님을 찾아와 애원하는 범죄자 가족들의 곡소리를 매번 들어야 했으니. 교수님들께도 제가 갈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수업은 빼먹지 않고 들은 덕분에 친구들로부터 시험 경향을 잘 안다며 ‘출제위원’이라는 별명도 얻고, 법대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글씨 공부를 계속하신 거군요.심지어 군대에 가서도 붓을 놓지 않았어요. 인사처 상벌계에 있다가 어찌하여 장군 붓글씨 선생이 됐는데, 월남까지 따라갔죠. 복학한 뒤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1979년 ‘동아미술제’가 처음 열린 겁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죠.
제1회 동아미술제 대상이 삶의 터닝포인트
▎1. 하석이 직접 맞춘 벼루 ‘무문석우’. 금강송으로 만들고 주칠 장인이 칠한 함에 넣어둔다. / 2. 털이 많이 빠진 몽당붓. 그는 “붓은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대로” 쓴다. / 3. 하석이 중국 갈 때마다 사온다는 인주. 주황색이 최고급 주표(朱磦), 붉은색이 미려(美麗). / 4. 중국 국영 브랜드 영보재(榮寶齋)의 귀한 붉은 먹. / 5. 4월 초 쓴 최근 작 ‘독립불구 / 사진:국립현대미술관 |
|
그 무렵 국전 심사 결과를 두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구설이 생기자 민간에서 국전을 대신해 개최한 첫 행사였다. 해서·예서·행서의 세 가지 서체로 총 석 점을 내야 했는데, ‘작품 크기 제한 없음’이라는 문구가 하석의 상상력에 그만 불을 지피고 말았다. 가로세로 70×136㎝짜리 화선지 전지를 이어붙여 보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예전 ‘미술관에 書’에 출품한 ‘공정(公正)’(2020). 종이에 먹, 250×120㎝, 개인소장 / 사진:국립현대미술관 |
|
각각 24매, 12매, 4매를 이어 붙이고, 집 짓는 대목수에게 의뢰해 액자까지 만든 뒤, 12t 트럭에 싣고 와 덕수궁 석조전 정원 앞에 내려놓았다. 작품이 너무 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급기야 심사위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 중 제일 작은(!) 작품이 그에게 대상을 안겨주었다.주최사인 동아일보는 서른두 살짜리 대상 작가를 잘 보살폈다. 문화센터를 만들고 강사로 내세웠다. 그동안 대만 작가 초청 전시회를 개최하며 쌓아둔 작가 인맥도 선뜻 제공하며 유학도 권했다. 덕분에 3년간 타이베이에 살면서 대만을 대표하는 서예가들과 교제를 하고, 고궁박물관에서 중국 최고의 작품들을 종일 감상하고, 고서점을 뒤지며 글씨 관련 서적들을 그러모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독옹 이대목 선생을 스승 삼아 전각을 익혔다. 필담이 통했기에 큰 불편은 없었고 전각 공부 등 세심한 대화에서는 통역을 썼다. 그렇게 내공을 쌓고 귀국한 뒤 곧바로 압구정동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지만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만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은공 덕분”이라고 하석은 지금도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산다.
상경해서 남다른 각오를 하셨겠습니다.뭘 갖고 나를 내세울까 하다가 우선 ‘매년 작품집을 내자’ 마음먹었죠. 그다음엔 ‘그걸로 5년마다 대형 전시를 하자’ 다짐했어요. 특히 ‘입장료를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공들여 쓰고 또 준비한 전시인데 공짜는 좀 아니잖아. 유료 서예전은 아마 내가 우리나라 처음인 듯싶어요.
이듬해인 1984년부터 작품집을 내신 건가요.그렇죠. 그 뒤 꼬박 25년간 25권을 냈어요. 매년 설날을 기점으로 D-100일이 되면 약속은 물론 전화도 받지 않고 오로지 집과 서실만 오가며 글씨만 썼습니다. 스님들 동안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2009년 진갑을 맞아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한 달간 전시했죠. 25권 작품집과 다섯 번의 서울 유료 전시를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비용이 1억4000만원 들었는데, 대관료로만 8000만원을 썼죠. 그리고 세 번째 다짐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누가 불러주길 기다리자는 것이었죠. 마침 2010년 한길사에서 『박원규 서예를 말하다』라는 대담집을 출간하고 기념 초대전까지 열어주었어요. 2012년에는 한길사 창사 35주년 기념으로 학정 이돈흥, 소헌 정도준과 함께한 ‘서예삼협 파주대전’도 화제가 됐죠.
하석이라는 호는 누가 붙여주었나요.큰형의 절친인 전북대 불문과 유재식 교수입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를 잘 아는 분이죠. 방죽에 연꽃이 많이 피던 곳이라 연꽃 하(荷)에 돌 석 자를 주셨죠. 그런데 어린 마음에 연꽃과 돌이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두를 뺀 ‘어찌 하(何)’로 바꿨습니다. 왜, 어째서라는 말이 좋았거든요. 모든 것은 의문에서 시작하지 않나요. 너는 왜 돌이냐, 어떤 돌이냐.
글씨란 무엇입니까.글씨는 자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중 하나가 글씨지요. 그래서 글씨는 속일 수 없습니다. 흉내도 어렵고요. 아우라가 있거든요. 종이를 펴는 순간 압니다.
글씨를 쓸 때, 어떤 마음가짐입니까.첫째, 글자 갖고 장난하지 않는다. 글자는 인간과 인간의 약속입니다. 한 점도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근거가 없는 글자도 쓰지 않죠. 제가 쓰는 글자는 다 어딘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금문편(金文編)』 같은 책자를 보면서 청동 제기에 새겨진 상형문자들까지 연구하죠. 둘째는 오직 하석만이 쓸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며칠 전 『주역』의 28번 대과계를 쓴 ‘독립불구 둔세무민(獨立不懼 遯世無悶·혼자 있더라고 두려워 않고, 세상을 피해 있어도 근심하지 않는다)’만 하더라도 광개토대왕비 서체를 저만의 필법으로 구사한 것입니다(사진5). 마지막으로, 한 번 쓴 글귀는 다시 쓰지 않는다. 남들이 쓴 글귀도 안 씁니다. 그래야 저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니까요. 글귀는 곧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와닿은 문장을 글씨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감동하지 않으면 그걸로 작품을 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서예가 100이라면 붓질은 15 정도입니다. 85가 공부죠. 서예가는 한문 전공자 이상으로 한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서생에 불과하지만 내세울 자랑거리가 있다면 40년 넘게 한학을 공부해왔다는 겁니다. 긍둔 송창, 월당 홍진표, 지산 장재한 선생님께 차례로 배웠죠. 지산이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공부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 세대가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글자는 어떤 것입니까.모든 것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사람도, 작품도. 그런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화합할 화(和), 화합할 협(協), 화할 옹(雍)자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 정형모는… 정형모 중앙 컬처앤라이프스타일랩 실장은 중앙일보 문화부장을 지내고 중앙SUNDAY에서 문화에디터로서 고품격 문화스타일잡지 S매거진을 10년간 만들었다. 새로운 것, 멋있는 것, 맛있는 것에 두루 관심이 많다. 고려대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했고, 한국과 러시아의 민관학 교류 채널인 ‘한러대화’에서 언론사회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함께 만든 『이어령의 지의 최전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