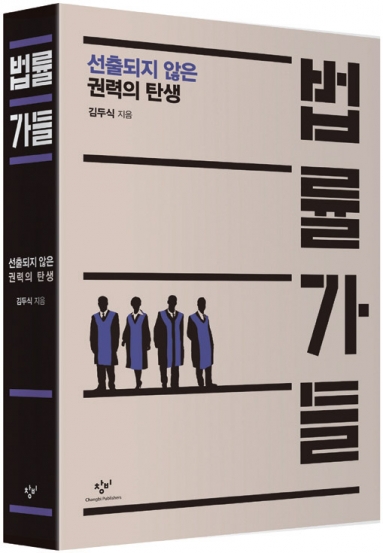해방기 사법공백 틈타 친일·무자격 법조인 대거 유입…돈봉투·브로커·전관예우 등 ‘관행의 역사’까지 규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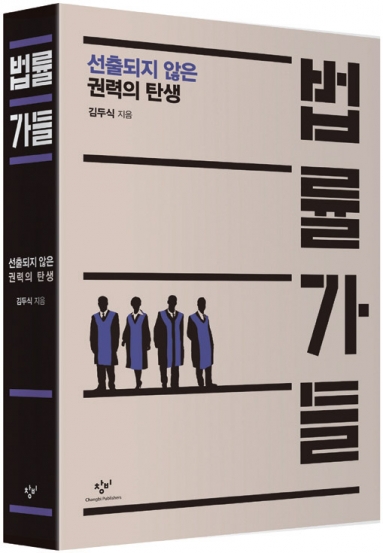
▎[법률가들-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지음 / 창비 / 3만원 |
|
물리학자들은 빅뱅 이후 첫 100만분의 1초, 첫 1초가 궁금하다. 우주 태초의 찰나(刹那)가 오늘의 물리적 환경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률가들]은 해방이라는 빅뱅 직후 벌어진 일들을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부한다. 돈봉투·브로커·전관예우·사법농단과 같은 부정적인 관행(이미 사라졌거나 바야흐로 사라지고 있는 관행이다)의 뿌리를 마치 탐정처럼 추적했다.691쪽 분량으로 저자가 복원한 그 시대는 카오스의 시대, 야만의 시대였다. 고문과 학살, 조작의 시대였다. ‘줄서기’를 강요하는 시대였다. 친일 의혹이 있어도 반공을 표방하며 극우파·우파 편에 서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좌파는 물론이고 자칫 ‘빨갱이’로 몰린 중도파는 이슬처럼 사라져야 했다.김 교수는 1차 자료를 중시하기에 관보·판결문·미군 노획문서 등 각종 자료를 뒤졌다. 저자가 법조계의 기원을 추적한 이유는, ‘친일과 독재는 대한민국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법조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라는 식의 상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일까. 아닌 것 같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사법농단 등 현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며, 누구를 비난하려는 의미가 담긴 책은 더욱 아니다.”기자들은 흔히 ‘사람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다”고 말한다. 법 이야기는 자칫 딱딱해질 수 있다. 김두식 교수는 “사람 이야기 중심으로 당시 법률제도와 시대상을 재현했다”고 말한다.김 교수는 광복부터 5·16까지의 현직 법조인, 즉 판사 596명, 검사 505명, 변호사 1904명으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의 ①고등시험 사법과 출신 ②조선변호사 시험 출신 ③서기 겸 통역생 출신으로 해방 후 판검사로 임용된 사람들 ④이법회 출신 등 해방 후 각종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다수는 구조적으로 친일파일 수밖에 없었다. 친일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원죄다. 게다가 그 중 ③④ 그룹은 무자격자였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친일, 무자격 법조인들은 콤플렉스 때문에 ‘빨갱이 만들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법률가들]은 1946년 5월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1949년 법조프락치 사건과 같은 우리나라 법조계의 ‘흑역사’도 밀도 있게 다룬다. 저자는 역사 서술의 터부(taboo)구역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갔다.카오스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성됐다. 우여곡절은 있었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1990년대 후반 법조 비리가 드러나며 ‘돈 안 받는 법원·검찰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희망의 근거를 역설적으로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대중서이지만 학술서 성격도 강한 책이다. 934개의 주석이 꼼꼼히 달렸다. [법률가들]은 저자에게 상당한 희생을 요구했다. 4년여에 걸친 집필 기간에 저자는 사회생활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다. 애독자들은 3공화국에서 6공화국 법조계 역사를 다룬 [법률가들 2]을 채근할 것이다.역사는 반복된다. 언젠가 남북통일이 성취된다면, 한국 법조계와 북한 법조계가 융합하는 가운데 적어도 초기에는 새로운 카오스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법률가들]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사람들의 참고문헌 목록에 반드시 올라야 하는 이유다.- 김환영 중앙일보플러스 대기자 whan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