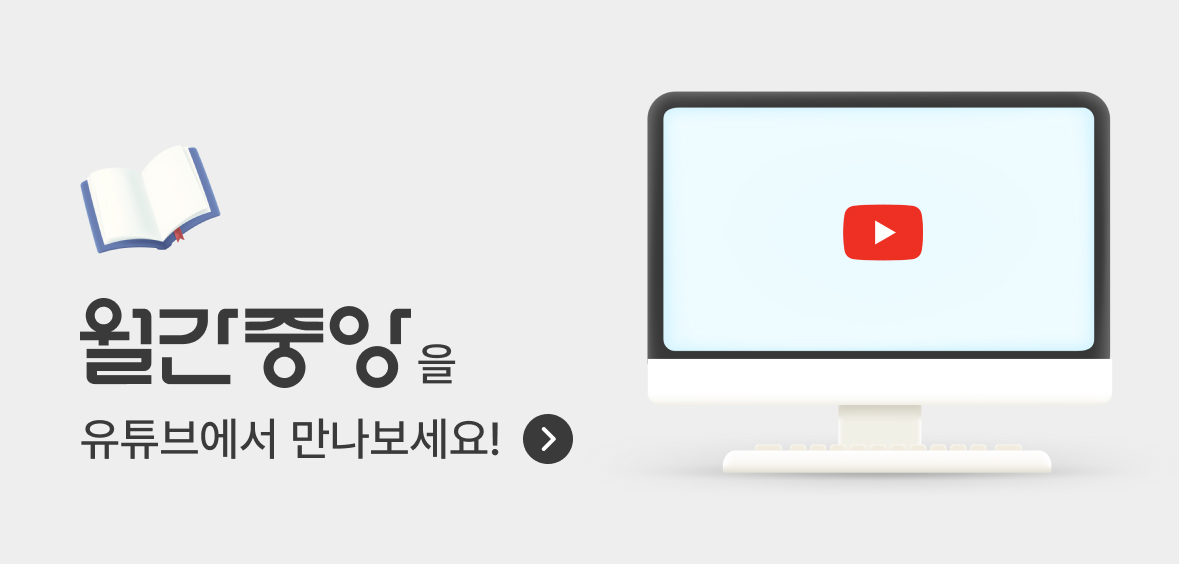한 해 수백 명 이상 물려 죽어, 별도 부대까지 두고 사냥·포상한반도에서 멸종돼 공포 사라지자 용맹·지혜의 상징으로 숭배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기증한 백두산 호랑이 수놈 ‘두만’. |
|
미국의 프로야구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 놈 캐시(Norm Cash)라는 선수가 있었다. 필자가 이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1962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대표팀과 벌인 경기에서 그의 경기 모습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이다.그날 경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볼을 관중석으로 던져주던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당시 동대문야구장에서는 관중석으로 날아온 파울 볼을 받으면 달려온 볼 보이에게 도로 돌려줘야 했다. 이렇게 비싸고 귀한 야구공을 질겅질겅 껌을 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관중에게 던져주는 것을 본 기억은 필자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다. 그리고 야구팀 이름에 호랑이가 들어 있는 것도 신기했다.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프로야구팀에 ‘타이거즈’라는 이름이 들어간 야구팀이 없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KIA 타이거즈, 미국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일본의 한신 타이거즈, 중국의 베이징 타이거즈 등에는 모두 타이거즈가 들어간다. 아무튼, 야구 구단에서는 호랑이(타이거)를 좋아한다.호랑이를 마스코트로 쓰는 일은 야구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축구협회도 호랑이를 엠블럼으로 쓰고 있다. 그뿐 아니라 회사나 학교 등에서도 호랑이를 심벌로 삼는 곳은 매우 많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부터 마스코트로 사용한 ‘호돌이’는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의 마스코트로도 쓰였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은 호돌이의 연장 선상에서 백호를 모티브로 삼은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호랑이는 한 팀이나 학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으로도 쓰인다.
“인간 보살펴주는 신”… 국가와 각종 단체 상징으로 사용호랑이를 상징으로 삼는 이유를 보면, “한국의 민속 신앙에서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며 인간을 보살펴주는 신으로 자주 등장하는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함”(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이라거나, “우리나라의 상징이자 본교의 상징인 호랑이는 고려대의 용기·결단·민활·위엄 등을 표현”(고려대 홈페이지)한다고 하기도 하고, “용맹과 지혜를 겸비한 백수의 우두머리로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경외의 대상이면서도 정서적으로 친숙한 동물이다.”(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라는 등 여러 가지다.이렇게 현대에 와서 호랑이는 체육 관련 단체나 학교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호랑이는 두 가지 상반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값비싼 사치품의 하나였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호랑이 가죽은 사치품 중에서도 고가의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한 해에도 수백 명이 넘는 수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으니,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이었다.호랑이가 한국의 상징이 되기 시작한 때는 호랑이가 한국에서 거의 사라진 시기와 맞물려 있다. 호랑이가 한국 땅에서 멸종이 돼서 더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없어지면서 비로소 호랑이는 한국의 상징이 된다.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호랑이를 조선의 표상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은 최남선이라고 한다(목수현·박은정 등의 연구).최남선은 그가 발행하는 잡지 [소년] 제1호(1908)에 아래와 같은 그림을 넣고 “이 그림은 내가 생각해 낸 것인데, 맹호가 발을 들고 내두르면서 동아시아 대륙을 향해 날듯이 뛰듯이 생기 있게 할퀴며 달려드는 형상으로 대한반도를 그린 것”이라고 해설을 붙였다. 최남선은 일본 지리학자가 한반도 모양을 “중국 대륙을 향해 뛰어가는 토끼 같다”라고 한 것을 예로 들면서 토끼도 한반도 모양과 비슷하지만, 자신은 호랑이 형상으로 그렸다고 말했다.

▎육당 최남선이 그린 한반도 지도. / 사진:이윤석 |
|
최남선은 한반도의 모양을 호랑이 모습으로 그린 이후에도 많은 글을 썼다. 그리고 1926년 1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 호랑이에 관한 글을 7회에 걸쳐 연재하는데, 이 글에서 그는 호랑이를 ‘조선의 표상’으로 그려냈다. 최남선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글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 호랑이는 한국의 표상이 된다.현재 호랑이는 한국의 자연 생태계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러나 십이지에 따른 범띠 해가 오면, 사람들은 과연 호랑이는 남한에서 멸종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호랑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한국의 어딘가에 호랑이가 살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한국범보존기금’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 예다.우리는 때로 과거가 현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10년이나 20년만 보더라도,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는 확실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과거의 어떤 사물을 얘기할 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1953년 영국의 작가 하틀리가 쓴 [The Go-between]이라는 소설의 첫머리는 “과거는 다른 나라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르게 일을 한다(The past is a foreign country; they do things differently there)”고 돼 있다.이 소설은 계층이 다른 연인 사이에 오가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았던 한 소년이 수십 년 후에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 구절은 이후에 인간의 기억과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을 얘기할 때 자주 쓰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어구가 됐다. 호랑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 가진 호랑이에 관한 생각과 150년이나 200년 전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 동물원에 가면 직접 호랑이를 볼 수도 있으며, 호랑이 관련 캐릭터 상품을 손쉽게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랑이의 이미지와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호랑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거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현재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을 텐데, 조선시대 사람의 호랑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호랑이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는 구글 아트의 한국 호랑이 그림을 해설한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나타난다.“한국 미술 속 호랑이는 사납기보다는 근엄한 모습이나 해학적인 미소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에는 덕(德)과 인(仁)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낙천적이며 해학적인 한국인의 정서가 투영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인에게 호랑이는 신통력을 지닌 기백 있는 영물(靈物)이고 해학적이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친구였습니다.”([한민족의 신화, 한국의 호랑이] 해설에서)
조선시대 경기 지방에서만 한 달 새 120명 참변
▎대형 호랑이 모형을 띄워놓고 열광적인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KIA 타이거즈 응원단. |
|
이 해설은 현재 한국 사람이 ‘호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가진 평균적인 인상일 것이다. 현실적인 위험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호랑이라는 짐승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만 현재의 이런 호랑이 이미지를 조선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을 리는 없다. 조선시대 호랑이의 실상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조선시대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의 해학적인 모습이라든가 현재 구전동화라고 알려진 여러 가지 호랑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호랑이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단군신화’를 통해 호랑이가 사람들과 매우 친근한 동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실제와는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호랑이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두려운 존재였을 뿐이다.호랑이의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많지 않은데, 흔히 이용되는 자료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호랑이의 피해다. 예를 들면 1735년에 영동 지방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40명이었다든가, 1745년 경기 지방에서는 한 달 사이에 120명이 피해당했다는 것 같은 기사이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특별히 큰 피해를 본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수만 알려준다.조선시대에 호랑이의 피해가 크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는 것은, 조선사회의 자료 대부분이 지배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호랑이에게 물려죽는 사람은 지배층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만약 양반 사대부 중에 호랑이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았었다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조선시대의 기록은 이처럼 상류계층 위주로 돼 있으므로 일반 서민에 관한 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호랑이의 피해에 관한 자료도 마찬가지여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숫자가 대단히 많았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호랑이의 피해를 보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글을 쓰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를 확인했다. [각사등록(各司謄錄)]이라는 자료다.[각사등록]은 각 지방의 관아와 중앙 관청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놓은 것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붙인 이름이다. 각사등록은 조선왕조실록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료만 남아 있으므로, 어떤 사항에 대해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818년 5월부터 1826년 4월 사이에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상부에 보고한 문서인 ‘충청병영계록(忠淸兵營啓錄)’에 호랑이 피해에 관한 꽤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1818년 7월 20일 보고서의 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이번에 도착한 홍양 현감 조태영의 보고서에는 홍양현 오사면에 사는 과부 박씨의 아들 15세 김장옥이 지난 6월 16일 밤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했고, 정산 현감 이식의 보고서에서는 정산현 적곡면에 사는 18세의 유학(幼學) 민매득이 지난 6월 17일 밤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했습니다.”이 보고서에는 이 두 명 이외에도 서산군의 6세 여자아이, 충원현에서 28세의 남자와 35세 여자가 호랑이의 피해를 보아 7월에 충청도에서 보고한 호랑이에 의한 사망자는 총 5명이다.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상부에 올린 이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매달 20일에는 호랑이 피해를 따로 보고했음을 알 수 있다. 1818년 5월부터 1819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충청도 전역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수는 총 31명이다. 약 1년 동안 이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것이다.충청도의 호랑이 피해 보고서는 만 7년에 걸친 꽤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데, 이 밖에 황해도 자료도 19세기 중반 이후의 것이 약간 남아 있다. 충청도의 보고서를 통해서는 꽤 오랜 기간 호랑이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고, 황해도의 보고서에서도 단편적이지만 그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다.이 외에도 전라도 남원에서 1736년 12월 20일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약 두 달 사이에 11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이들은 대부분 땔나무를 구하러 산에 갔다거나 또는 산에서 열매를 따다가 물려갔는데, 어떤 사람은 자던 방으로 호랑이가 들어와서 물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산이 많은 강원도의 호랑이 피해는 다른 지방보다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 34년(1758)의 보고서에 의하면, 석 달 동안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73명이라고 했다.
민가 안방까지 들어와 사람 물어가기도
▎주인의 위용을 강조하기 위해 용맹한 호랑이를 그려 넣은 군호도(群虎圖). / 사진:한국민화뮤지엄 |
|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호랑이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은 노비나 중인 또는 하층 양반이고, 지위가 높은 양반층 사람은 없다. 대부분 땔나무를 구하러 인근 산에 가거나 밭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봐 호랑이 피해자는 조선의 하층 백성이었다.성종 때 간행된 [경국대전]은 조선시대 통치의 기준이 되는 법전인데, 이 책이 만들어진 후 약 400년 동안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됐다. 조선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률 서적인 [경국대전]의 군인 선발 규정에는 호랑이를 잡는 군사를 뽑는 규정이 있다. 이들을 착호갑사(捉虎甲士)라고 불렀는데, 문자 그대로 호랑이를 잡는 군사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호랑이를 두 마리 잡은 사람은 시험을 면제해줬으니, 호랑이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알 수 있다.조선 후기에 나온 [만기요람]에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규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잡은 호랑이의 크기와 활이나 창으로 잡을 때 첫 번째로 쏘거나 찔렀는지 두 번째인지 하는 그 순서로 상을 줬다. 이처럼 조선시대 초기부터 호랑이를 잡는 일은 매우 중요했으므로, 민심을 안정시키고 군인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호랑이를 잡는 부대를 따로 만들고 또 포상규정까지 정해둔 것이다.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위해서 없애야 할 해로운 것으로 도적과 귀신 그리고 호랑이를 들고,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 백성의 근심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포상 규정을 만들어서 호랑이 잡는 일을 독려했지만, 이 일을 실제로 맡은 각 지역의 관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앞에서 본 순조 18년(1818)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호랑이 피해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이 들어 있다.
호랑이 사냥꾼 강원도 관찰사 심수“못된 호랑이가 제멋대로 다니며 사람을 잡아먹으니 지극히 놀랍고도 참혹한 일입니다. 포수를 많이 징발하고 또 함정을 파고 쇠 화살을 설치해 반드시 악호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라고 각 해당 진(鎭)의 토포사(討捕使)와 지방관에게 엄하게 당부해뒀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대처 방안이 보고서의 끝에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매달 똑같이 들어 있는 것으로 봐, 대처 방안이라는 것이 매우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실하게 호랑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관리들도 있었는데, 영조 35년(1759) 강원도 관찰사 심수(沈鏽)가 그중 한 사람이다.강원도는 산이 많으므로 호랑이의 피해가 다른 지방보다 심했다. 심수는 호랑이 잡는 일에 특별히 힘을 쓰면서, 관내 각 고을의 수령들에게 호랑이 퇴치를 엄하게 지시했다. 그 결과 각 고을에서 40마리의 호랑이를 잡았다. 심수는 호랑이 가죽 40장과 머리를 서울의 해당 관청으로 보내면서, 호랑이를 잡은 여덟 명의 지방 무인들에게 상을 줄 것을 조정에 청했다.이렇게 지방의 수령이 포수를 시켜 호랑이를 잡고, 이들에게 포상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호랑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 호랑이를 사냥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고을에 민폐를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상당히 신중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됐다.민간에서 호랑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호랑이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설이 생기게 된다. 그중 하나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면, 호랑이에게 붙어 있으면서 새 먹이를 인도하는 귀신이 된다는 것이다. 연암 박지원의 [호질]에도 나오는 창귀(倀鬼)가 바로 이 귀신이다.강원도에는 호식총(虎食塚)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무덤이 있다. 먼저 뼈를 수습해 그 자리에서 화장하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덮은 다음 시루를 그 위에 엎어놓고 쇠막대기를 꽂아 놓았다. 1990년 무렵까지 강원도 태백과 삼척 그리고 정선에 200군데 정도의 호식총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민속적 의미가 있다(김강산, [호식총]).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호랑이에 붙어 다니는 귀신이 되지 못하게 불로 태우고, 시루에 쪄서 돌로 봉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시대 호랑이 이야기는 정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로, 88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 ‘호돌이’의 인상과는 전혀 다르다.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는 다른 나라”라는 말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 이윤석 - 한국 고전문학 연구자다.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6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정년 퇴임했다. [홍길동전]과 [춘향전] 같은 고전소설을 연구해서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30여 종의 [홍길동전] 이본(異本) 가운데 원본의 흔적을 찾아내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작품 해석 방법을 서술했다. 고전소설과 관련된 30여 권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최근에는 [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 아니다]와 같은 대중서적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