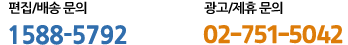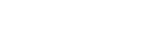또 직격탄을 맞았다. 1997년 몰아 닥친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전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금융위기를 탈출하고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을 바꿔야 할까?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경제학) 교수는 “IMF식 처방전이 우리 체질에 맞지 않았다”며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5일 한국에 잠시 귀국한 신 교수를 일산 자택에서 만났다.
시계추를 1997년으로 돌려보자. 당시 한국 경제가 시름시름 앓았던 원인은 기업 부채였다. 위기를 직감한 외국은행이 국내 기업에 원금상환 압력을 넣자,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었던 것이다. 자금줄이 막힌 기업들은 국내 은행의 외환을 빌려 외국은행에 상환했고, 외환이 부족해진 국내 은행은 외환보유고에서 돈을 꺼내 기업을 지원했다.
그러다 국가경제가 대외채무 상환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은 97.8%. 1997년 부채비율(393.3%)보다 무려 295.5%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라는 악몽에 또다시 시달리고 있다. 신장섭 교수는 “한국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위기에 휘말린 격”이라고 잘라 말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