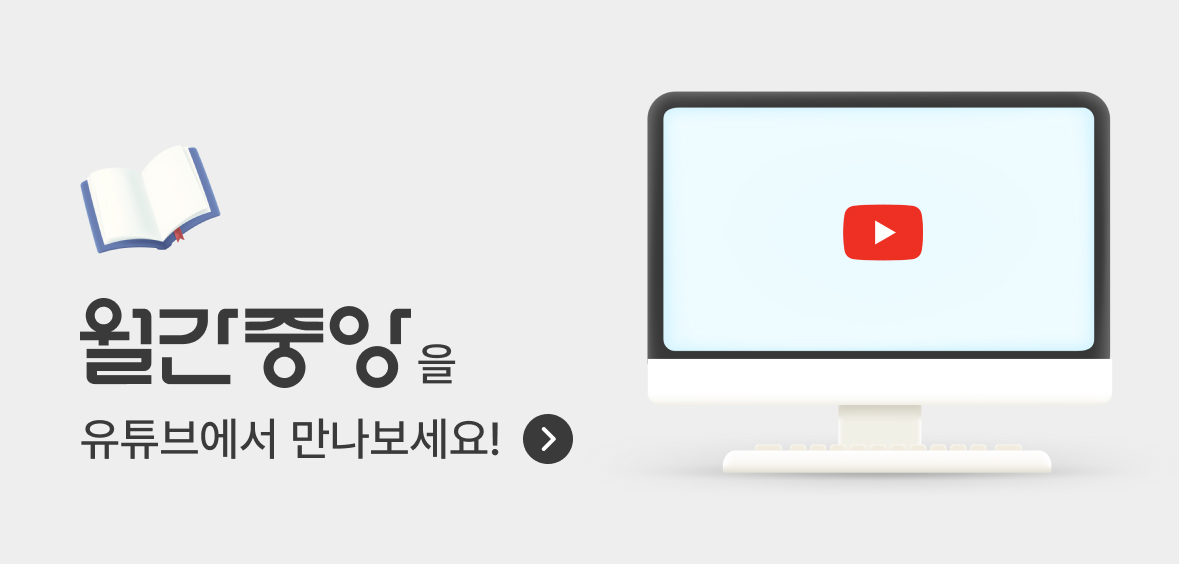우리는 종이를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러저러한 용도로 날마다 수많은 종이를 쓴다. 하지만 종이 덕분에 인류의 삶이 더 풍요롭고, 놀라운 문명의 번성을 이루게 됐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런 ‘위대한 발명품’이 종언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하루쯤 종이에 경의를 표해야 되지 않을까.
어둠이 걷히고 태양이 갑자기 중천으로 떠오른다. 그 찰나 지름이 140만㎞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구체(球體)에서 뻗쳐오는 노란색을 띤 밝은 빛이 온 누리에 가득 퍼진다. 지구는 이 구체 주변에서 쉼 없이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을 계속한다. 그 속도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700㎞이고, 공전 속도는 시속 11만㎞다. 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지구는 백색 광선으로 넘치는 낮을 맞는다. 밤새 골목을 밝히던 가로등이 꺼진 뒤 이제 골목을 밝히는 일은 태양의 업무로 바뀐다. 그 시각 우리는 창문을 암막 커튼으로 가린 저마다의 방에 놓인 침상에서 눈을 뜬다. 일어나 창문을 열면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그리고 빛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경대·의자·자명종 시계·휴대폰·조명등·그림·캐시미어 이불·베개·쿠션·침대·책·잡지·신문들….거실로 나가면 안락의자·TV·화분들·에어컨·책장·책들, 그리고 저 건너편 주방에는 식탁·의자·꽃병·냉장고·전자레인지·가스레인지·식기세척기·갖가지 접시들·컵들·개수대 따위가 한눈에 들어온다.
날마다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사물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눈을 뜬다. 이 사물들은 자명한 형태로 날마다 우리를 맞는다. 한밤중 혼자 있을 때 사물들이 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개수대에 가득 쌓인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접시와 그릇들은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안락한 소파는 종일 힘든 일을 처리하느라 피로에 지친 우리에게 와서 쉬라고 손짓하고, 뜨거운 커피가 담긴 찻잔의 온기는 마치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하다. 사물들은 먼저 말을 건네고, 응답을 기다리며, 더러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조종한다. 대체적으로 사람과 사물은 상호 소통을 하며 공존한다. 사람은 이 사물들의 세계 속에서 태어나서 먹고 마시며 관계를 맺고,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사는 것이다.
벽에 걸린 달력의 숫자들은 우리가 눈 뜬 새로운 날의 달과 날짜를 알려준다. 어제와 어제의 어제, 더 먼 어제들이 힘을 모아 오늘을 밀고 달려온다.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니다. ‘오늘’은 늘 새로운 날, 즉 두 번 되풀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날이다. 이 새 날의 시작과 함께 밀려온 우리의 시간 속으로 새로운 일과 사람들이 온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언가 내 시간 속으로 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한 시인은 이렇게 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정현종, ).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그의 일생이 함께 오는 일이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 생활
- 금주의 베스트 기사
- 01[작심토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
- 02[집중취재] 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외압’ 내막
- 03[직격 인터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언중유골
- 04[집중취재] ‘전기차 포비아’ 해결책 없나
- 05[글로벌 포커스] 빨간불 들어온 중국 경제, 비상구가 안 보인다
- 06[전문가 분석] 미국 대선과 글로벌 경제 전망
- 07[금융특집] 쌀(米) 산업 구하기에 나선 농협의 진심
- 08[우승 단장이 말하는 프로스포츠의 세계(7)] ‘2030 우먼 파워’ 1000만 관중 시대 이끈다
- 09[세태풍경] 개통 20주년 KTX, 명절 풍경도 바꿨다
- 10[배종찬의 민심 뚫어보기(31)] 빅데이터로 본 윤석열 정부 전반기 성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