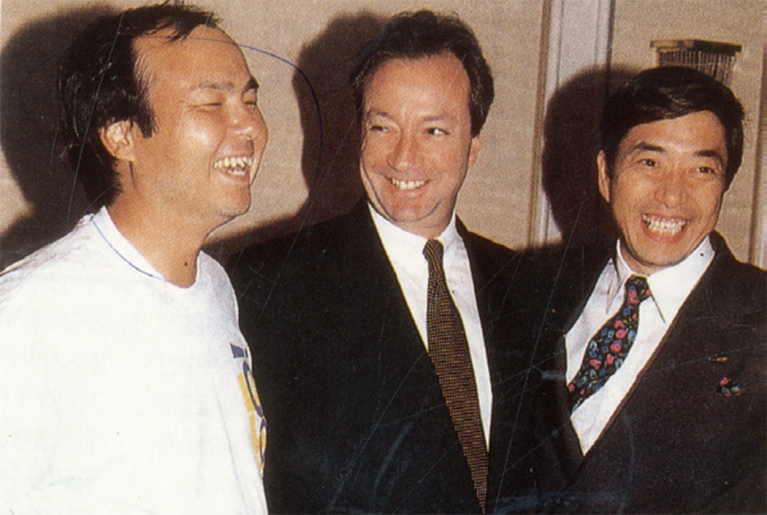위기를 기회로 삼아 고성장을 이어가는 일본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발상의 전환으로 기존 업계의
상식을 깨고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기업들이다.

▎1. 니토리 매장. 일본 전통적인 가구점과 달리 침구류, 커튼, 벽지 등 집 안을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 제품을 함께 판매한다. / 2. 돈키호테는 ‘ 정글 진열’방식이다. 고객이 마치 정글 속을 탐험하듯 원하는 물건을 찾는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했다. / 3. 레오팔레스21 이 관리하는 임대 건물.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래형 부동산 대책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얘기할 때마다 레오팔레스 21을 성공 사례로 꼽는다. |
|
최근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 국내 금융사 전문가들이 이들 기업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한국의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일련의 과제들이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와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의 장기불황을 이겨낸 기업들의 성공 비결에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일본기업 탐방을 다녀온 증권사의 일본담당 전문가 3인이 주목하는 5개의 게임 체인저의 성공 전략을 살펴봤다.니토리(NITORI)는 ‘일본의 이케아’로 불리는 홈퍼니싱(home furnishing·집을 꾸미는) 기업이다. 2001년 일본 가구업계 1위였던 오오츠카 가구를 제쳤고 매장은 430개(2016년 3월 기준)에 이른다. 스웨덴의 ‘가구 공룡’인 이케아가 2006년 일본에 진출했지만 니토리 아성을 깨진 못했다. 1967년 창업자 니토리 아키오 회장이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문 연 동네 가구점이 꾸준하게 성장한 비결은 뭘까.
‘친절 마케팅’으로 이케아 공룡 눌러바로 일본 가구 업계의 상식을 깬 ‘낮은 가격의 홈퍼니싱 기업으로 변신’이다. 아키오 회장이 1970년 초 미국 출장을 갔다가 저렴한 생활 소품을 함께 파는 가구 업체들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본 뒤 사업 전략을 확 바꿨다. 앞으로 일본 경제가 발전할수록 집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커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며 성장한 니토리에게도 이케아의 일본 진출 소식은 악재였다.니토리는 이케아에 ‘가격인하’로 맞섰다. 대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부터 생산·유통·판매까지 도맡는 제조·유통 일괄형(SPA) 생산방식을 도입했다. 인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산공장은 해외로 옮겼다. 특히 이케아가 ‘불편을 판다’는 것을 마케팅 전략을 내세울 때 니토리는 ‘친절 마케팅’으로 대응했다.정희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니토리는 도심 외곽에 창고형 매장을 짓는 이케아와 달리 역세권 중심으로 매장을 열고 배송 서비스도 마련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2015년 니토리 매출액은 4581억엔(약 4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730억엔(약 7500억원)이었다. 2009년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연평균 10%씩 성장했다.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니토리의 주가 상승세도 가파르다. 현재 주가(1월6일 종가기준)는 1만3530엔(약 13만8000원)으로 4년 새 326%나 올랐다.‘돈키호테’의 전략은 ‘없는 것 없는, 값싼 잡동사니 매장’이다. 일반적으로 유통 기업이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포장한다면 돈키호테는 ‘싼 물건’을 더 싸보이게 만드는 데 공을 들인다. 파산한 기업이 덤핑으로 처분하는 상품부터, 반품·B급 상품을 사들여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할인마트보다 약 10~15% 저렴하다. 2009년부터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정열가격(情熱價格)’도 내놨다. 이때 선보인 청바지 가격이 690엔(약 7080원)에 불과했다. 값싼 가격은 장기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진 일본의 20~30대 소비자의 발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좁은 공간에 뒤죽박죽 약 4만 개의 물건이 천장까지 쌓여있는 것도 돈키호테의 성공 비결이다. 일본 유통업계의 이단아로 통하는 창업자 야스다 다카오가 돈키호테 전신인 ‘도둑시장’ 을 직접 운영하면서 개발한 ‘정글 진열’ 방식이다. 고객이 마치 정글 속을 탐험하듯 원하는 물건을 찾는 ‘재미’를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산만해 보이는 진열에도 숨겨진 규칙이 있다.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통로 안쪽이나 고객 손이 닿지 않는 선반 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 옆에는 보다 가격은 싸지만 마진이 큰 PB 상품들이 놓여있다.권재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로 같은 공간은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시간소비형 점포”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드물게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야스다 창업자의 아이디어다. 심야 고객이 낮보다 지갑을 쉽게 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영업전략으로 삼았다. ‘싼맛’과 ‘재미’를 더한 독특한 전략은 외국인 관광객도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의 평균 지출액(2014년 기준)은 약 4만 엔(약 41만원)으로 일본 소비자의 16배 이상이다.
건설업 접고 주택임대 기업으로 전환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미래형 부동산 대책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얘기할 때마다 성공 사례로 꼽는 기업이 일본의 레오팔레스21(Leopalace21)이다. 이곳은 아파트 건설사였다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택임대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재기한 기업이다. 주목할 점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건물(땅)을 통째로 빌린 후 이를 재임대해 수익을 얻는 마스터 리스(Master lease)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주택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줄곧 하락했다. 따라서 연간 일정 수익(이자)만 보장한다면 장기간 땅이나 건물을 빌려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은 건물주와 분배한다. 특히 레오팔레스 21은 대도시의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펼친 게 성공 비결이다. 일반적으로 46㎡(14평) 규모의 방에 TV부터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모든 가전제품을 갖춰 놓았다. 세입자는 몸만 들어가면 된다.권재형 연구원은 “최근 도쿄 지역의 1인 가구수만 268만 가구로 10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처럼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용하기 편리한 소형 임대주택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1700만 임대주택 중 약 55만 채를 레오팔레스21이 관리하고 있다. 2012년 말 한국에 진출해 공동주택 시설관리 업체인 우리관리와 손잡고 합작사인 우리레오PMC를 설립했다.
IT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로 호응에스엠에스는 일본의 심각한 인구 고령화를 사업 기회로 삼았다. 간병이나 간호에 특화된 인력을 소개하는 일이 주요 업무다. 최근 일본에선 간병산업이 뜨면서 이온그룹·파나소닉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김보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일본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약 34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들이 75세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엔 38만 명의 간병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간병산업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에스엠에스는 2014년 간병관련 기업들의 경영 지원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주가는 더 놀랍다. 현재 주가(1월6일 종가기준)는 2665엔(2만7350원)으로 2013년 연초 이후 492%나 올랐다. 같은 기간 게임 체인저로 뽑은 5개 기업 중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엠쓰리는 IT기술로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을 깬 기업이다. 그동안 대면으로만 이뤄졌던 제약영업 활동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옮겨온 기업이 엠쓰리다. 약품 영업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제약사는 영업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줄이고, 병원의 의사들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는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얻었다. 엠쓰리가 2003년에 설립된 의료정보 사이트(m3.com)엔 현재 일본의사의 80%인 2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박스기사] 게임 체인저들의 공통점은…주력 사업 완전히 바꾸는 파괴적 혁신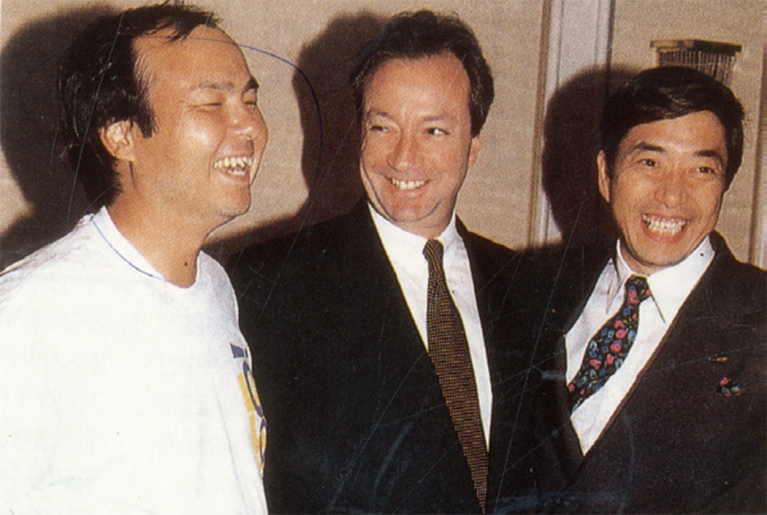
▎아후재팬을 설립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왼쪽). |
|
전문가들은 일본 게임 체인저들의 공통점으로 혁신을 꼽는다. 파이오니어와 소프트뱅크의 사례를 들어보자. 고급 음향기기 분야에서 선두 기업 가운데 하나던 일본 파이오니어는 2000년대 들어 TV로 사업 분야를 넓혔다. 음악 감상에서 홈시어터로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다. 초반에는 이런 전략이 잘 먹히는 듯 했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색상을 내는 플라즈마디스플레이(PDP)에 집중해 고가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액정(LCD) 기술의 발전에 눈을 감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품질 제품만 고수하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화질도 크게 뒤지지 않는 대형 LCD TV의 양산이 시작되면서 소니·삼성 등에 밀려났다. 영상 분야에서 철수하고 오디오 부문만 운영하다가 결국 2015년 3월 온쿄의 자회사가 됐다.같은 기간, 소프트뱅크는 신사업에 적극 나섰다. 1980년대까지는 PC 매니아를 위한 출판 사업에 주력했던 소프트뱅크는 1990년대 들어 이동통신, 인터넷 게임 등 정보기술(IT) 분야 전반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변신했다. 특히 1996년 손정의 회장이 미국 야후의 지분 49%를 사들여 야후재팬을 설립한 게 신의 한수였다. 인터넷 검색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꿰뚫어보고 투자에 나선 것이다.1996년이면 국내에서 네이버가 설립되기도 전이다. 당시 선제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일본 야후는 소프트뱅크 수입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주력 기업으로 성장했다.이처럼 게임 체인저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존에 통용되던 비즈니스 모델에 연연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정도의 파괴적인 혁신을 이뤘다는 점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파이오니아 등 1990년대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수많은 대기업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던 것은 시장 변화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반대로 세계 IT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한 소프트뱅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불황을 극복한 게임 체인저 기업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다.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격대비 효용을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 문화로 바뀐 것을 빠르게 파악한 돈키호테·니토리 등은 싼 가격에 재미와 친절 등을 입혀 성공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