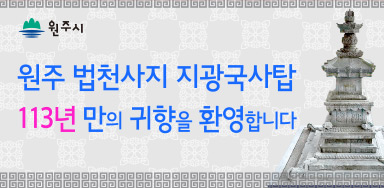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
인터파크 신성장 동력 마련하기 위해 복귀인터파크 대표 복귀 후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어떤 느낌인가?지난 6월 1일이 인터파크 사이트 오픈 22주년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질적 성장 여부는 아쉬운 면이 있다. 인터파크에 입점한 상품이 3000만~4000만 개 정도 되는데, 사용자가 사용하는 화면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조그마한 화면에서 훨씬 많은 상품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쇼핑 경험이 불편해진 것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창업 멤버로서 다시 인터파크에 돌아오는 데 부담은 없었나?물론 부담이 크다. 그렇지만 인터파크가 워낙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니까 뭐든지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토대가 탄탄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것을 만들 여지가 크다.인터파크 창업 멤버로서 목표가 뭔가?올해 목표는 이익을 내는 것이다. 경쟁사와 똑같은 출혈경쟁을 하기보다는 이익을 내면서 시장 성장률 정도로 맞추려고 한다. 지금은 소위 인공지능 쇼핑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시기다.‘인터파크’는 ‘인터넷 테마파크’ 줄임말이다. 한국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로, 1996년 6월 1일 사이트를 오픈했다. 인터파크는 데이콤 사내 벤처로 출발했다. 당시 같은 팀에서 일하던 선배 이기형 대리(현 인터파크 홀딩스 회장)와 함께 창업했다. 1997년 10월 데이콤에서 ‘스핀오프’해 ‘데이콤 인터파크’로 독립법인이 됐다. 데이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자본금은 10억원이었다. 미국 아마존이 문을 연 게 1995년, 미국 이베이는 1997년 설립됐다. 인터파크의 시작이 너무 빨랐던 탓일까. 직원 10여 명으로 시작했던 초반, 연 거래액은 3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비스를 유지하고 임직원 월급을 주는 것도 어려웠다. 돈을 벌기 위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쇼핑몰 구축 사업을 유치했다. 쇼핑몰 구축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인터파크를 운영하는 식이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데이콤에서도 구조조정을 이유로 다시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죽든 살든 알아서 할 테니까, 데이콤에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했다”면서 “지분을 사들일 돈도 없었지만 데이콤을 설득해 나중에 갚는다고 지분을 받았다”며 웃었다. 여행상품 판매, FIFA 월드컵 입장권 공식 판매 대행사 선정, 도서 및 화장품 무료 배송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불었던 인터넷 붐과 맞물려 코스닥 등록까지 하면서 고속성장이 시작됐다.
해외 진출 적극 시도 못 한 게 아쉬워‘벤처 붐’ 시대 상황이 어땠나?코스닥 시장에서 인터넷 기업의 주가가 폭등했던 시기다. 인터파크 주가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다이얼패드의 새롬기술 같은 곳은 난리도 아니었다. 벤처 붐 시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는 실제보다 과장된 곳이 많았다. 2000년대 초에는 더욱 심했다. 보통 투자금액이 백억 단위가 많았다. 기업공개를 하면 액면가의 100배가 되는 곳도 많았다. ‘묻지마 투자’도 많았고, 코스닥에 상장만 하면 돈을 벌던 시기였다.인터넷 서비스를 론칭했던 벤처기업이 수없이 많았는데, 왜 이들 대부분이 실패했는가?당시는 회원 숫자가 벤처의 가치였던 때다. 회원을 늘리면 나중에 광고나 뭐 이런 것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현실에서는 인터넷 기업이 인터넷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기껏해야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다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검색 서비스도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인터넷 서비스로는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벤처기업이 막대한 투자금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벤처 붐의 부작용도 컸다고 하던데.서울 강남의 룸살롱이 호황이었다.(웃음) 벤처 대표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직원들도 그렇게 룸살롱을 많이 갔다. 사회적 분위기가 흥청망청했던 때였다. 저녁 9시나 10시에 기업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룸살롱에 있을 정도였다. 창업가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 벤처기업과 창업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에서도 벤처 버블이 심했다.벤처 붐 시대를 기억할 때 아쉬운 점이 있나?당시 풍부한 자금을 이용해 벤처기업이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다. 인터파크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는 창업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롤 모델도 부족했고, 해외 진출 노하우를 물어볼 곳도 없었다.- 최영진 기자 cyj73@joongang.co.kr·사진 김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