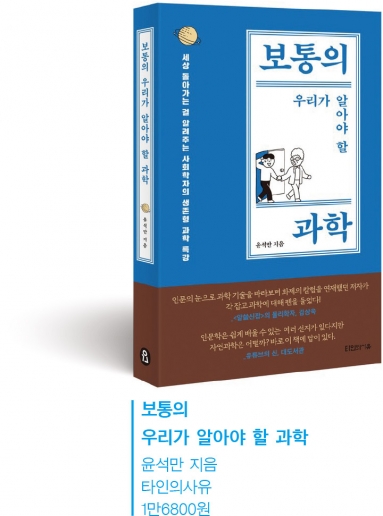영화 마블 시리즈는 사상 최고 흥행수익(221억 달러)을 올린 공상과학(SF) 흥행물이다. 시리즈에 속한 영화만 18편에 달한다.이야기의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과학이었다. 시리즈의 문을 연 [아이언맨](2008)부터 그랬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가슴팍에 박힌 ‘아크 원자로’가 초당 3GW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온다. 부산의 전기 사용량에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현재 핵융합 기술을 생각하면 ‘아크 원자로’의 실제 크기는 웬만한 행성보다 크리라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시리즈의 절정에서는 시간여행이 등장한다. 물리학의 ‘양자 얽힘’ 가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양자 세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밖에 있다는 데서 착안했다. 그러나 아직 가설일 뿐, 영화 [백 투 더 퓨처](1985) 식으로 그려지는 시간여행은 허구에 가깝다.저자는 이렇게 대중 매체에서 모티브로 활용한 과학이론을 소개하고, 때로는 검증한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겐 사실상 판타지나 다름없던 과학을 인문의 영역으로 안착시킨다. 앞으로 SF 영화를 보는 안목이 한층 깐깐해질 수 있다는 게 책이 주는 미덕이자 고민이다.머리 지끈한 과학을 굳이 왜 풀어썼을까? 과학이 경주마라면, 경주마의 고삐를 쥐고 속도와 방향을 정하는 기수(騎手)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말 관리법을 마부 수준으로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와 내야 할 속도는 어디까지나 기수의 몫이다. 그래서 저자는 “과학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