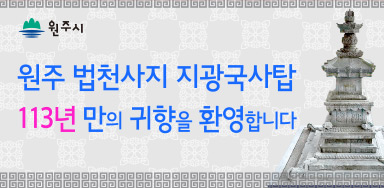아직도 겨울 바람이 매서운데 봄이 오려는 듯 눈 대신 비가 내렸다. 반가운 젊은 친구들이 찾아와 “딱 한 병만 마시겠다”며 제법 오래된 샴페인을 주문했다. 20년이 지난 것이었지만 그 기품의 자락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다. 엄격한 귀가 시간을 지정받은 이는 훌쩍 자리를 떠나고 나와 젊은 친구 두 명만 남았다.
“가거라, 아들 옆으로 가거라.”
“딱 한 병만 더….”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