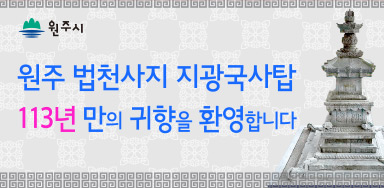지베르니의 정원은 모네에게 노년의 안식처이자 파라다이스였다. 또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예술적인 영감을 선사한 축복이었다.
‘내게도 나만의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해 볼 때가 있다. 하지만 땅뙈기가 없으니 그 안에 무슨 꽃을 심어야 할지, 무슨 먹거리를 키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 나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수많은 그림 속에 정원의 모습을 남긴 화가가 있는데, 바로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가 그 주인공이다. 모네의 정원은 자급자족의 현장이기도 했다. 축사가 있어서 닭과 칠면조, 돼지 등을 키웠고, 제법 큰 규모의 텃밭도 가지고 있었으며, 호수에는 배를 띄워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다. 매일매일 화구를 들고 거닐던 정원은, 모네에게 평화로운 안식처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있는 부족할 것 없는 파라다이스였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원에는 파라다이스의 이상이 녹아들어 있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낯선 자연이 아니라 에덴동산이나 무릉도원처럼 꽃이 만발하고 강이 흐르며,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먹을 것이 풍부한 파라다이스의 개념이 애초부터 정원에 스며있다는 뜻이다. 서양 중세의 그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정원은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인데, 이는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때나 죄가 묻지 않은 신성한 곳을 뜻했다. 담장 안에는 백합이나 수선화 등 순결한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온갖 꽃이 만발하고 과일이 풍성했으며, 가운데에는 구원을 뜻하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듯 정원은 몸에 병이 들거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호와 치유를 받는 곳이었으며, 나락에 빠진 영혼이 구원되는 곳이었다.
모네도 첫 아내인 카미유가 죽은 후, 마음 둘 곳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심난하게 스케치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 그가 정원이 있는 집을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다시 꿈꾸게 된 것은 알리스라는 여인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부터였다. 연약하고 의존적인 카미유와는 달리 알리스는 몸짓이 바지런하고 건강했으며 살림꾼이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ife
- 금주의 베스트 기사
- 01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 02반도체 섹터
- 03애국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셀럽은?
- 04배수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대표
- 05최희민·홍주영 라포랩스 각자대표-4050 여성 패션에 꽂힌 30대 청년들
- 06박상규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대표-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솔루션
- 07손욱-양인모의 ‘무한 품질’ 이야기(03) LG전자는 어떻게 글로벌 ‘가전 1등’ 됐나
- 08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영양제 시장 향한 임팩트 있는 혁신
- 09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매장 무인화 선도
- 10백희성 킵 건축 대표-기억을 담은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