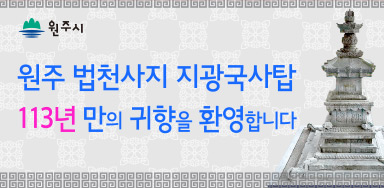SUV 시장 확대와 수입차에 대한 관심 증가로 국산 준중형차 시장이 갈수록 줄어든다.
현대차가 지난 9월 신형 아반떼를 내놓고 초특급 구원투수 역할을 맡겼다.
국산차의 승용 차종 분류는 매우 간단하다. 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가 전부다. 유럽은 A~F 여섯 단계로 구분한다. 미국은 유럽과 비슷한데 알파벳 대신 콤팩트·미드·라지·풀 등 설명적 단어로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 세그먼트를 쪼개서 세분화하기도 한다. 국산차를 네 개 등급으로 전부 표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만들어낸 구분이 준중형이나 준대형 같은 틈새 차종이다. 정부 기준이 아닌 업체의 마케팅 용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정규 세그먼트처럼 다가온다.
준중형은 소형차와 중형차 사이에 위치한다. 현대 아반떼, 기아 K3, 쉐보레 크루즈, 르노삼성 SM3가 대표적인 준중형차다. 현대 i30와 벨로스터, K3 유로 등 해치백도 마찬가지로 준준형에 속한다. 국산 준중형차의 시초는 1990년 나온 현대 엘란트라다. 당시 현대 쏘나타 같은 중형차는 ‘성공한 중산층’이 타는 차였다. 소형차는 가족차로 타기에는 작았다. 엘란트라는 그 사이를 절묘하게 파고 들었다. 중형차를 사기에는 부담이 되고 소형차로는 성이 차지 않는 사람이 준중형으로 몰렸다. 소형차와 준중형차는 엔진도 같았기 때문에 세금도 차이가 없었다. 소형차 살 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준중형을 살 수 있었다. 큰 차 좋아하는 심리를 자극해 젊은 사람들도 엔트리카로 준중형을 택했다. 준중형의 등장으로 소형차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준중형은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준중형은 가족차의 대명사로 꼽혔지만, 2000년대 들어 중형차에 자리를 빼앗겼다. 1998년부터 르노삼성이 SM5로 중형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형차 시장이 커졌다. 소득 수준 향상으로 큰 차 좋아하는 취향으로 바뀌면서 준중형에서 중형차로 옮겨갔다. 현대 쏘나타는 국민차라고 불릴 정도로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며 중형차의 번영기를 이끌었다. 지난 10년 동안 준중형과 중형의 판매량을 보면 준중형이 중형을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다. 2005년에는 준중형과 중형의 판매대수는 15만대와 22만4000대로 중형이 7만4000대 앞섰다. 2006~2008년에는 그 차이가 평균 10만대로 벌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준중형과 중형의 판매대수가 25만7000대와 26만7000대로 1만대로 바싹 좁혀졌다. 이후 4만대로 벌어진 2010년을 제외하고는 1만~2만대로 좁혀졌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