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먼 시넥(Simon Sinek)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다. 그의 2009년 TED 강연은 역대 TED 강연 중에서 4번째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저서 『Start With Why』와 『Leaders Eat Last』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시넥은 훌륭한 리더들의 사고방식, 행동양식, 소통방식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왜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라(Start with why)’라는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있다. 이상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가 직원들에게 ‘우리는 왜 일하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시넥은 애플이 새 역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 세계 스마트폰 2위인 삼성이 결코 애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WHY’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사이먼 시넥 제공 |
|
많은 한국 기업이 ‘왜(why)’에 대한 고찰 없이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에만 집중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시넥은 대다수의 리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벙어리가 된다고 지적한다. ‘why’가 없는 조직은 ‘what’과 ‘how’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리더를 따라잡을 순 있어도 새로운 리더가 되진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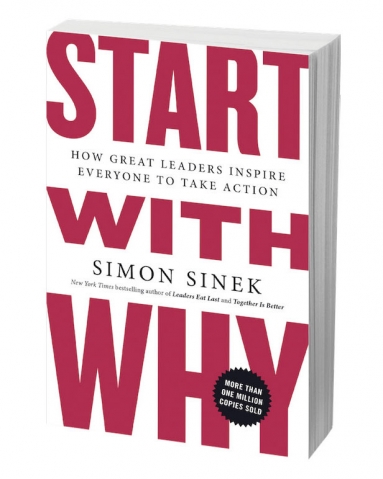
▎사이먼 시넥의 저서 『Start With Why(2009)』 |
|
‘WHY’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회사의 존재 이유가 단순한 수익 창출인가? 아니면 더 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인가? 조직의 리더들이 수익을 작게는 조직원들의 복지, 크게는 사회와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가? 조직의 리더들이 스스로의 안위보다 조직원들을 배려(care)하고, 조직원들이 사적 이익보다 서로를 더 위하고, 이 같은 기업문화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가? 만일 당신이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자신만의 ‘why’를 내부 직원들뿐 아니라 고객들과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조직입니다.
애플과 삼성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산맥이다. 이들의 차이점이 ‘WHY’의 유무에 있다고 보는 이유는?스티브 잡스가 이끌던 애플은 맥킨토시, 아이튠즈, 아이팟, 아이폰 등을 선보이며 컴퓨터 등 IT 기기를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소수의 기업 등 일부만 소유하던 컴퓨터를 모든 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잡스의 비전이었죠. 삼성뿐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갖기 위해서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애플이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오로지 집중했던 것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기(Think different)’였습니다. ‘애플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결국 애플은 기업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컴퓨터를 일반 시민들에게 보급하며 업계의 장벽을 깼습니다. 조직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조직이 남들과 다른 발상으로 현실에 도전하고, 조직원 개개인이 조직과 동등한 힘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서 『Start With Why』에서 삼성의 리베이트(환불) 프로그램을 문제 삼았는데.삼성전자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고객들이 제품들을 구입할 때 리베이트를 최대 150달러까지 제공하는 마케팅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계약서 뒷면에 아주 작은 활자로 한 주소당 리베이트가 한 번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객 여러 명이 신청하면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리베이트를 거부한 겁니다. 이 이유로 4000명이 넘는 고객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했죠. 이 소식은 뉴욕 검찰의 귀에 들어갔고, 삼성은 2004년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2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회사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근간에 ‘why’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삼성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리베이트를 미끼로 고객들을 유혹한 뒤 이들을 멋대로 실격처리 한 것이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을 저버린 겁니다.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본인과 본인이 속한 조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리더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리베이트: 판매자가 상품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이나 사례금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현금을 되돌려주는 일.한국은 삼성 같은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어 중소기업이나 벤처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대기업들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도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냅스터(Napster)는 마이스페이스(MySpace)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했고, 마이스페이스는 페이스북의 출현을 알 수 없었죠. 블록버스터(Blockbuster)는 넷플릭스(Netflix)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고요. 음반 시장도 애플의 아이튠즈의 파괴력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도 하죠.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사진 기술을 개발한 회사였지만 영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디지털 사진을 상업화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살길을 만드는 것은 대기업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소규모 업체들은 스스로 혁신해야 합니다. 스스로 시장에서 대체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AI가 인력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리더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예로부터 인류는 부족사회 문화를 바탕으로 진화해왔습니다. 100~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부족으로 뭉쳐 생활했죠. 부족 규모가 150명을 초과하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또 다른 부족이 생겨났습니다.현재 인간 사회는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부족사회에서의 생활 양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리더가 조직 내에 안전망(circle of safety)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care) 합니다. 동시에 조직원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사다리처럼 아래 조직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일 말단 직원들까지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어떤 조직에서나 가장 변하기 어려운 파트는 중간 책임자들입니다. 이들이 리더로서 아랫사람들을 먼저 케어한다면, 조직의 ‘안전망’은 신입사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조직이든 말단 직원들이 고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조직 내 안정적인 유대감을 만드는 것은 조직원들의 업무 효율은 물론이고, 고객 만족도까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부 결속을 강화해도 앞으로의 인력 감축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 않나?리더들이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량 해고 사태는 1980~90년대에 빈번하게 발생했고, 지금도 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대량 해고가 기업을 내부에서부터 무너트리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임직원들 입장에 서서 조직의 유대감을 형성한 사례들을 말해볼까요. 배리 웨밀러(Barry-Wehmiller)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에 2008년 하룻밤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주문을 허공에 날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밥 채프먼 CEO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휴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조직 내 모든 직원이 한달 동안 무급휴가를 썼죠. 주목할 점은 CEO가 이 프로그램을 발표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는 것이 우리 중 누군가가 많이 희생하는 것보다 낫다(It’s better we should all suffer a little than for anyone one of us to suffer a lot.)”는 명언을 남겼죠. 그리고 이듬해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뛴 결과, 2009년 연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전 AI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발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 세금징수 기관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세금 납부제도 운영의 핵심 부분을 자동화했습니다. 수천만 명을 해고하고 그들이 하던 일을 AI로 대체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었죠. 그러나 AI라고 공짜가 아닙니다. 장비, 도구, 디자인, 서비스 등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하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순비용 절감 효과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죠.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모두가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비전이 필요한가?이제 막 사회에 나서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1980~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어찌 보면 기성세대도 원하는 일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신세대는 사회에 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다만 밀레니엄 세대는 인터넷과 SNS를 활용해 즉각적인 희열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에는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기성세대는 이들이 장기적이고 인정적인,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리더들은 젊은 세대와 공존하기 위해 이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들이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하죠. 이건 밀레니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김민수 기자 kim.minsu2@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