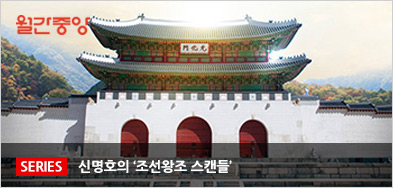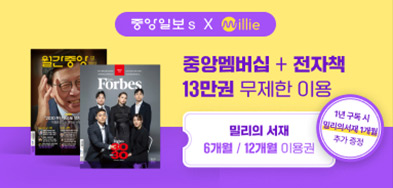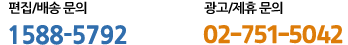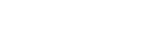시공을 뛰어넘어 옛사람들의 일상으로의 초대…
희로애락 교차하는 보통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소중함 일깨워
아무도 꽃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정말이다. 너무 작아서 그 진면목을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너무도 바쁘고,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 조지아 오키프 그림 속에 나온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나온 ‘시대’나 ‘일상’ 자체가 중요한 그림들이 있다. ‘누가’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그림들이다. 흔히 풍속화라 일컫는 그림들이기도 하다. 꼭 풍속화가 아니더라도,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이 시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나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은 정겨움을 느낀다. 특정 인물의 위대함이나 빛나는 성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나 자신을 그 그림 속에 슬쩍 끼워 넣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친근함. 익숙하고 만만해 보이지만, 그 커다란 화폭 안에 그 시대 사람들의 집단적 미의식이나 빛나는 시대정신이 촌철살인의 필치로 다가와 ‘숨은 그림 찾기’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 내 마음속의 아름다운 풍속화들, 그 첫머리에는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가 자리한다.
#1. , 김홍도, 18세기
김홍도가 그린 은 조선시대의 서당 풍경을 재현함과 동시에, ‘배움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보도록 하는 매우 철학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화면 가운데 아이는 훈장님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을 생각하니 눈물부터 뚝뚝 떨어지지만, 훈장님의 얼굴은 사실 전혀 무섭지가 않다. 아이를 벌주기 위해 단단히 무장을 한 듯한 심각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진 얼굴 표정이 웃음을 간신히 참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지만, 그 마음에는 학생에 대한 푸근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을 것 같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어제 배운 것을 다음 날 훈장님 앞에서 달달 외워야 했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했다. 이를 배송(背誦)이라 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 생활
- 금주의 베스트 기사
- 01[심층분석] SK하이닉스 vs 삼성전자… HBM(고대역폭메모리) 연장전 돌입
- 02[글로벌 포커스] 더 독해진 미국의 ‘중국 경제 때리기’
- 03[남성욱의 평양리포트] 문재인 회고록 팩트 체크
- 04[포커스 경기] 반환점 돈 김동연호의 도정 성과 총정리
- 05[이슈와 사람] ‘정치인’ 딱지 뗀 도종환이 밝히는 ‘인도 방문’ 내막
- 06[초대석] 평사리댁 5년, 농부가 된 공지영 작가의 인생 후반전
- 07[집중취재] 고물가에 웃고 의료계 파업에 울고… 저임금·고강도 노동현장
- 08[정치특집 | 배종찬의 민심 뚫어보기(2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과 빅데이터 민심
- 09[월간중앙이 주목한 22대 국회 뉴리더(2)] 尹 정부 ‘노동개혁 엔진’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 10[정밀취재] 中 알리·테무의 도 넘은 개인정보 수집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