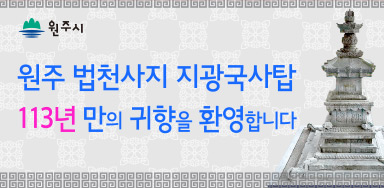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커플이 있었다. 여자는 심심한 일요일에 와인 강의나 같이 듣자고 남자를 꼬드겼다. 남자는 내키진 않았지만 “와인이 별거냐”며 시간을 보내거나 분위기를 만드는 데 나쁠 것 같지 않아 여자 손에 이끌려 나왔다. 하지만 와인은 어려웠다. 그냥 마시기만 해도 좋을 텐데 무슨 용어와 에티켓이 그리 많은지…. 여자친구에게 강의 시간에 들려주는 이야기 중 10%도 이해가 안 된다고 투덜댔다. 와인 강의만 시작되면 졸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시음 와인을 홀짝거리며 창밖으로만 눈을 돌렸다.
그러던 그가 불시에 이탈리아로 출장을 떠났다. 귀국할 때 의외의 사태가 발생해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현지 공관원의 도움을 받게 됐다. 공관원의 방에서 낯익은 와인 병을 발견했다. 라벨에 쓰인 이름이 ‘Chianti’였다. 강좌에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무심코 “이거 키안티네요”라고 외쳤다. 그 공관원은 와인도 모르는 무식한 비즈니스맨으로 봤던 청년이 정확한 발음으로 와인 이름을 부르자 자연스럽게 호의를 보였다. “키안티를 아네요”라며 이들은 같이 와인을 마셨다.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렸다. 그는 졸면서 들었던 와인 이름이 이국 땅에서 그토록 위력을 발휘한 데 대해 내내 감격해 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