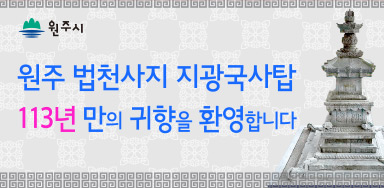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봉주르”로 시작되는 남태평양의 아침은 유쾌하다.
구릿빛 피부의 원주민들이 능숙하게 일상의 프랑스어를 쏟아내는 섬.
1600㎞ 산호바다를 간직한 뉴칼레도니아에 덧씌워지는 매력이다.
‘ 프렌치 파라다이스’. 뉴칼레도니아를 수식하는 별칭이다. 멜라네시안 원주민들은 프랑스어를 국어로 쓰고, 수도 누메아의 인구 중 절반이 유러피언이다. 해변에는 식탁보를 펼치고 앉아 갓 구워낸 바게트와 과일 몇 알을 햇살에 담는 풍경이 익숙하게 녹아든다. 그 발끝에서부터 연둣빛으로 차오르는 잔 파도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번져나간다.
섬 전체의 60%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이곳, 파라다이스라는 표현이 과언은 아니다. 섬에는 공룡이 살던 쥐라기 시대의 원시림과 꽃과 새들이 서식한다. 발을 담그고 몸을 내던지는 푸른 바다는 대부분 산호바다인 라군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뽐낸다.
남태평양의 숱한 섬들을 뒤로하고 뉴칼레도니아를 찾는 것은 프랑스 문화에 대한 연정, 혹은 산호바다의 터줏대감이었을 남태평양 원주민과의 조화에 대한 호기심이 한몫을 한다. 섬마을에서 만난 멜라네시안 원주민인 카낙은 꽃무늬 전통옷 ‘뽀비네’를 입고 “봉주르”와 “메르시”를 연발하며 미소를 건넨다. 해변을 걷다 보면 프랑스 남부 꼬뜨다쥐르에서나 마주쳤을 따사로운 햇살이, 남태평양의 훈풍이 부는 산호해변으로 슬며시 전이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ife
- 금주의 베스트 기사
- 01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 02반도체 섹터
- 03애국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셀럽은?
- 04배수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대표
- 05최희민·홍주영 라포랩스 각자대표-4050 여성 패션에 꽂힌 30대 청년들
- 06박상규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대표-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솔루션
- 07손욱-양인모의 ‘무한 품질’ 이야기(03) LG전자는 어떻게 글로벌 ‘가전 1등’ 됐나
- 08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영양제 시장 향한 임팩트 있는 혁신
- 09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매장 무인화 선도
- 10백희성 킵 건축 대표-기억을 담은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