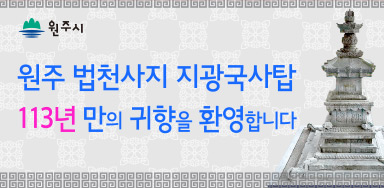베스트셀러조차 팔리지 않는다는 장기 불황이다. ‘새 책 팔아 헌책 산다’는 여승구 화봉문고 대표는
1억35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은 『진달래꽃』 초판본 경매를 성사시킨 주인공이다.

▎여승구 화봉문고 대표는 책을 ‘우주’라고 표현한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 나는 한낱 작은 미물일 뿐입니다. 수집은 블랙홀과 같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
|
“제 것은 아까워서 못 팝니다.” 지난 12월 1억3500만원에 팔린 『진달래꽃』이 여승구 화봉문고 대표(80)의 소장본인지 묻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답했다. 이번에 출품된 희귀본은 한 개인 소장자가 내놓았다고 했다. 2011년 문화재청 제 2011-61호로 고시된 등록문화재(제470-1~4호) 네 권과 동일한 판본이었다. 화봉문고가 소장하고 있는 『진달래꽃』은 문화재 4호다. 개인 소장자는 백석의『사슴』(2015년 11월, 7000만원), 한용운의 『님의 침묵』(2015년 1월, 4000만원) 등 근현대 문학시집이 경매에 나온 것을 보고 출품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 대표가 화봉문고를 통해 현장 경매에 내놓아 팔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현장 경매가 열리는 인사동 화봉갤러리에서 만난 여승구 대표는 “양장본 시집이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낙찰되는 현상은 기존의 한적(漢籍·한문으로 쓴 책) 위주의 고서경매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30년 넘게 희귀 서적을 수집해온 수집광이자 고서 전문회사인 ‘화봉(華峯)’을 이끌어온 경영자다. 그가 운영하는 갤러리, 서점, 책박물관, 고서 경매·쇼핑몰 앞에는 모두 여 대표의 호(號)가 붙어있다. 화봉문고는 고활자본부터 목판 귀중본, 문학서적, 고문서, 고지도, 도자기·공예품까지 취급한다. 고서뿐만 아니라 미술품도 사고파는 보물창고인 셈이다. 지난해
에서 역대 최고가인 25억원의 감정가를 받은 ‘채색대동여지도’도 그의 보물창고 속 애장품이다.보물창고 안에서도 그는 문학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1억원이 넘는 양장본 시집이 나왔다. 시집도 고서(古書)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라며 기뻐했다. 일제시대 골동품 판매 목록을 보면 문화재급 고서와 미술품의 판매 가격이 비슷한 값으로 매매되곤 했는데, 여태껏 책과 미술품 가격은 그와 달리 거래되는 등 큰 불균형을 이뤄왔다고 했다.여 대표는 어린 시절 문학소년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교하는 정문 옆 게시판에 현상문예작품 당선공고가 나왔는데, 거기 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꿈만 같아서 귀가 후 책가방을 던져두고 다시 학교로 와 공고문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 대표는 시인의 꿈을 키우며, 중학교 때만 200여 권의 시집을 모았다고 회상했다. 1955년 광주에서 상경해 재수생 시절부터 친척이 운영하는 헌책방 ‘광명서림’에서 몇 년간 일한 것이 결국 책장사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책을 팔던 화봉문고가 ‘경매’를 시작한 역사는 『진달래꽃』이 여 대표의 손에 들어온 시기와 궤를 같이한다. 수입해서 판매한 책들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사세가 확장됐고, 1982년 여 대표는 ‘서울 북페어’를 개최했다. 출판사상 최초로 열린 북페어였던 터라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됐다. 유명 학원 국어 강사였던 윤석창 씨가 여 대표를 찾아와 김소월의 『진달래꽃』, 만해의 『님의 침묵』 등 한국문학작품 초판본 200여권을 북페어에서 팔아달라고 했다. “좋아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 대표는 아직도 『진달래꽃』 초판본을 손에 넣었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여 대표는 그 자리에서 책을 사들였다. 그리고 북페어 안에 ‘한국문학작품 초판본’이라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처음부터 고서수집에는 관심도 없었기에 여 대표는 북페어가 끝난 뒤 이 책을 경매에 내놓았다. 때마침 연세대학교에서 구입의사도 밝혀왔다. 그렇게 경매가 성사될 무렵 여 대표가 우연히 언론사 문화부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경매 얘기를 꺼냈다가 “문학박물관이나 하나 만들지 뭘 팔려고 그러느냐?”는 말을 듣게 된다. 핀잔 같은 그 한 마디에 ‘왕년에 시 좀 썼다는’ 여 대표는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한다. 그는 결국 경매장에 나가 유찰을 단행한다. 그가 문학박물관 설립으로 선회한 배경이다. 결국 1982년부터 이 책들은 회사 장서로 남게 됐고, 오늘날 화봉 ‘현장 경매’와 ‘책박물관’의 모태가 됐다. 2003년 회사를 통합해 현재의 화봉문고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듬해인 2004년 10월에는 화봉책박물관을 세우고 고서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경매 쇼핑몰을 열었다. 2008년에는 모란갤러리를 인수해 화봉갤러리로 간판을 고쳐 달아 다양한 전시와 현장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봉문고의 주된 사업은 고서 전시와 판매(경매)이지만, 실제로는 화봉책박물관과 화봉갤러리가 중심축을 이룬다. 이후 화봉문고는 2015년까지 총 35번의 고서경매전을 개최해왔다.고서 수집으로 수십억을 쓴 여 대표는 가족과의 마찰이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집안에서 전시해놓고 바라만 봐도 흐뭇한 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싹 치워버린 적도 있었어요.” 물론, 잘 보이는 곳에서 구석으로 장소만 바꿨다는 이야기다. 여 대표는 IMF 외환위기 후 출판사가 경영난을 겪었을 때도 400여 평의 부동산은 처분했지만 고서만은 팔지 않았다. 고서가 유통되는 통로인 고서점과 옥션몰은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다. “격월로 하는 현장 경매로 얻은 수수료 등으로만 사업을 끌고 나간다”며 “10만권이 넘는 고서를 보관하고 새 고서를 구입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근대 문학도서도 문화재다”여 대표는 소장하고 있는 거의 모든 책에 일일이 파란색 포갑을 씌웠다. 그리고 한 획씩 또박또박 도서명을 새겨 넣었다. 보물급 이상의 귀중본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 대동여지도』 등 30년 동안 모은 장서를 낱장으로 빼팔지 않겠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대신 국가적인 고서박물관이 설립되면 소장한 전 장서를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근대문학도서는 도서관에서 훼손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서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합니다.”여 대표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데 책만큼 귀중한 자산은 없다고 강조한다. “전시·연구·출판·국제교류 기능을 더하면 문화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만 있다면 여 대표는 언제든지 보물창고의 열쇠를 넘길 준비가 돼 있다.- 글 임채연 기자·사진 오상민 기자PROFILE : 1963년 화봉문고 대표이사 취임/ 1976년 월간 독서 발행/ 1983~1987년 한국출판학회 부회장/ 1987~2000년 한국고서협회 부회장·회장·명예회장/ 2000~2002년 한국고전문화진흥회 회장/ 2004년~현재 화봉책박물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