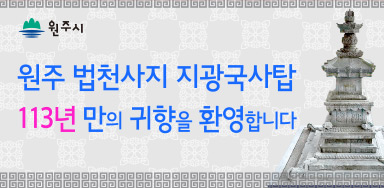원조의 귀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강남 개발 개척자가 주택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야기다. 1970년대 한강 이남의 ‘남서울’ 개발을 위한 교두보였던 반포동이 40여년이 지난 지금은 국내
최고가 부촌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불황 속 반포 불패 신화의 역사를 들여다봤다.
반포동은 과거 개울이 서리서리 굽이쳐 흘렀다고 해서 서릿개, 반포(蟠浦: 뱀처럼 휘감는 물가라는 뜻)라고 했다고 한다. 그 뒤 뜻이 변해 반포(盤浦)로 부르게 됐다. 한편으론 이곳이 상습 홍수피해 지역이어서 반포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1752년(영조 28)부터 1910년까지 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인 『일성록』에 1790년(정조 14년) “반포리 옆의 강가에 둑을 쌓아 막았다”고 쓰여 있다. 어쨌든 한강 옆이어서 물을 피할 수 없는 곳이다. 홍수라는 재난을 낳은 물이 이제는 ‘돈 덩어리’로 탈바꿈한 셈이다.
반포동이 주택시장에 고개를 내민 것은 1970년대 서울시의 강남개발 때다. 당시 서울시 당국은 한강 이남을 개발해 한강 이북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는 남서울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한강변에 하상을 정리해 매립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했다. 반포를 비롯한 6개 지구였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dviser
- 금주의 베스트 기사
- 01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
- 02반도체 섹터
- 03애국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셀럽은?
- 04배수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대표
- 05최희민·홍주영 라포랩스 각자대표-4050 여성 패션에 꽂힌 30대 청년들
- 06박상규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대표-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솔루션
- 07손욱-양인모의 ‘무한 품질’ 이야기(03) LG전자는 어떻게 글로벌 ‘가전 1등’ 됐나
- 08정지원 알고케어 대표-영양제 시장 향한 임팩트 있는 혁신
- 09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매장 무인화 선도
- 10백희성 킵 건축 대표-기억을 담은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