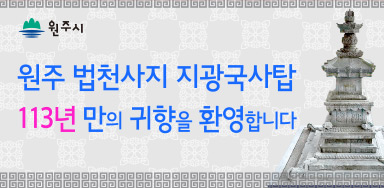제너럴모터스(GM) 111년 역사는 2009년 파산보호 신청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세계 각지에 공장을 세우며 사세를 확장하던 GM은 몸집 불리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수익을 올리는 데 소홀했고, 결국 비대한 규모를 주체하지 못해 무너져 내렸다. 이후 GM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 매진하며 군살 빼기에 주력하고 있다.파산보호 신청 이후 GM의 첫 CEO는 주요 자동차 업체의 첫 여성 CEO이기도 한 메리 바라다. 2010년부터 3년간 CEO를 역임한 대니얼 애커슨은 자동차 업계와 무관한 금융업자 출신으로, 파산 직전에 몰린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원투수 정도로 여겨진다.그로부터 배턴을 이어받은 바라는 18세에 고졸 생산직으로 GM에 입사해 CEO가 되기까지 34년간 GM에서만 일한 자동차 전문가다. GM 역사의 2막은 바라와 함께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바라는 단순함과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로 명성이 높다. 바라가 글로벌 인사 부문 부사장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직군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다르게 정해져 있는 회사의 복장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10쪽짜리 문서를 단 한 문장으로 바꿨다. “적절하게 입으시오(dress appropriately).”관리자들 사이에서 이 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옷을 너무 가볍게 입는다는 불만이 나오자, 바라는 말했다.“직원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관리자이지 규칙 집행관이 아닙니다. 팀을 이끄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딱딱한 규칙을 걷어내고 중간관리자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바라는 인사 보고서의 90%를 줄였다. 제품 부문 부사장일 때는 “거지 같은 차는 이제 그만(no more crappy car)”이라는 한마디 지시로 전 직원을 긴장시키고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일화도 전해진다.CEO가 된 뒤에도 바라의 성향은 그대로다. 바라는 “지금까지 GM은 지나친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파산은 100여 년간 고착된 문화를 혁신할 좋은 기회가 됐다”며 소통이 더욱 원활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첫걸음은 경영구조 효율화다. 바라는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과감하게 철수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매출이 소폭 줄었지만 GM은 갈수록 견실해지고 있다. 2014년 1%대였던 순이익률이 지난해 4분기엔 5%로 5배나 뛰었다. 바라는 기존 사업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여서 번 돈을 마치 IT 스타트업처럼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량공유 등 첨단기술에 투자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