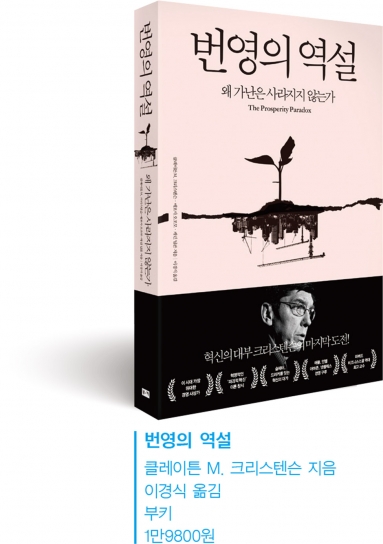나랏돈 가운데 주민이 직접 쓰임새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명 주민참여예산제도다. 이를 통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국가 예산의 0.1% 규모에 달한다.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으로 퍼졌다.그렇다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뭘까? 관이 주도할 때보다 다채로운 제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지난해 서울의 한 구청장을 만났을 때 기대완 다소 다른 답이 돌아왔다. “주민 제안 사업 절반은 건설·교통”이라는 것. “서울이라도 비교적 개발이 더딘 지역에선 기반시설부터 확충해야 한단 목소리가 크다”고 이 구청장은 덧붙였다.이런 목소리는 우리의 성공 경험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2000년 대 초고속 인터넷망 등 정부 주도로 마련했던 인프라가 경제성장을 이끈 기억 말이다.그러나 이런 성공이 당연한 건 아니다. 저자의 말처럼, “1960년 이후로 4조3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 지출”됐는데도 “(1인당 소득 하위) 20개국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저자는 묻는다. “어째서 어떤 나라들은 번영의 길을 찾는데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저자는 “인프라만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자본이 몰려들 것”이란 기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인프라는 가치를 저장하고 유통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인프라는 시장과 연결될 때만 그 기능을 다 한다고 강조한다. “수레(시장) 뒤에 말(인프라)을 매단들,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겠냐”는 이야기다.- 문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