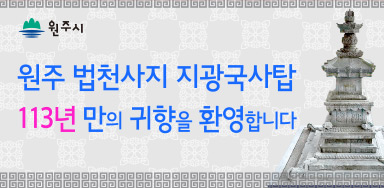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김영일 악당이반 대표의 오디오 수집은 매니어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다. 교과서에서나 만날 법한 오디오부터 최신 제품까지 100여 대를 소장하고 있다.

▎둘이 합쳐 1t이 넘는 스피커와 조그만 오디오 사이에서 촬영에 응한 김영일 대표. |
|
사전에 적힌 ‘컬렉터’의 정의는 이렇다.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오디오 컬렉터 김영일(54) 악당이반 대표는 이에 하나를 덧붙인다. ‘컬렉터란 이를 통해 그 제품이 지닌 역사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그렇기에 자신은 엄밀히 말해 오디오 컬렉터는 아니라고 고백했다. 단지 오디오를 좋아해 다른 것보다 그 세계에 좀 더 열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러나 100여 대의 오디오를 모은 이력은 그를 단순한 매니어나 수집가로 단정 짓지 못하게 한다.김 대표의 사무실은 한적한 서울 성북동에 자리 잡았다. 작은 정원이 있는 2층짜리 가정집 단독 주택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과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집에 들어서고도 김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마중 나온 그가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그의 사무실은 오른쪽 방이었다.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오디오가 있는 왼쪽 사무실로 이동했다. 둘을 합쳐 1t이 넘을 듯한 육중한 스피커가 시야를 압도했다. 좌우 스피커 사이로는 조그만 오디오가 보였다. 그 앞으로 또 다른 두 쌍의 스피커가 나란히 진열됐다. 턴테이블 등 오디오 세트와 CD·LP판·DVD·카메라 등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사진을 찍으려고 오디오 정리를 시작했다.김 대표 혼자 정리하는 게 버거워 보여 도와주려 했으나 곧바로 “괜찮다”고 한다. 이유는 무거우니 거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다. 방안 가득 놓인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 수집도 하는지 궁금해 물었더니 “원래 사진작가”였단다.알고 보니 직업이 세 가지다. 우선 사진작가. ‘그루 비주얼’이라는 회사를 운영한다. 10여 명의 직원을 뒀다. 원래 대학에서 사진학과를 나와 일찍부터 초상 작가로 출발한 경력이 있다. 전직 대통령과 내로라하는 재벌 회장들이 그에게 인물 사진 찍기를 청한다.둘째는 국악 전문 음반회사 악당이반의 대표다. 그가 제작한 ‘정가악회 풍류’ 국악은 그래미상 월드 뮤직과 녹음 기술 두 부문의 수상 후보에 올랐었다. 국내 음반 사상 처음이다. 서울에는 제작 사무실, 강원도 평창에는 녹음실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남에 1만6500㎡(5000평)되는 차 밭을 운영한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차 포장지부터 관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다.“일제시대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축음기로 음악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에서 평양으로 음반을 사러 갈 정도로 열성 애호가였지요. 한 장, 두 장 사기 시작한 음반이 100장이 넘었고 오디오도 새로 구입하게 됐죠.” 오디오 매니어가 된 건 집안의 영향이 컸다.그가 본격적으로 오디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결혼 이후다. 20년도 훌쩍 더 된 오래 전 이야기.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1961년 산 마란츠 7을 줬다. “마란츠 7은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오디오였어요.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마란츠 7은 그의 강원도 평창 녹음실에서 훌륭한 소리를 낸다.평균적으로 한 종류의 오디오 세트만 있는 여느 집과 달리 그의 집에는 오디오가 10세트다. 몇 술 더떠 성북동 악당이반 사무실에는 30세트, 강원 평창 스튜디오에는 60세트나 있다. 똑같은 음반인데도 오디오 세트가 다르면 소리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낀 뒤 수집벽을 이어갔다.“늘 듣던 음악인데,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날 이후 아버지가 소장한 오디오를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모은 오디오는 대부분 아메리카와 브리티시 제품이다. “당시 음악을 하도 많이 들어 지금은 아메리칸 사운드와 브리티시 사운드를 구별하게 됐어요.” 처음엔 각각의 오디오마다 내는 소리가 듣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독특한 취미는 점점 각각의 오디오 소리를 메모하고 분석하게 만들었다. 그는 분석한 기록이 빼곡히 적힌 아이패드를 보여줬다. 지금도 시간만 나면 하루 서너 시간은 음악을 듣는다.

▎(왼쪽부터) EMT 930 ST 오디오 , 미탄 오디오 켈렉션 , 토렌스 프레스티지 오디오 , 마란츠 10 오디오. |
|
오디오 수집광의 피 대대로 흘러한때는 국내에 있는 오디오 소리를 모두 들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 게다가 오디오를 구입하기 위해 외국에 나가는 건 물론 해외출장 갔다가 연장한 적도 있다. “최근 독일 출장 때 반덴헬 브랜드의 MC1을 구입했어요. 소장한 오디오 대부분 생산국에서 구했습니다”. 지금은 갖고 싶은 오디오가 해외에 있으면 굳이 나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수입상을 통해 산다.오디오는 소리를 들려주는 장치다. 기본적으로 앰프·스피커·플레이어 3개로 분리된다. 앰프는 프리 앰프와 파워 앰프로 나뉘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다. 플레이어는 음악을 작동시키고 조절하는 채널, 스피커는 소리를 전달하는 아이템이다. 오디오 박사 김 대표에게 어떤 오디오가 좋은지 물어 봤다.“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죠. 하나의 세트로 구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 조합을 해보고 조화를 이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당연히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오디오를 구매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거기에 부수적인 요소로 디자인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란다.오래된 오디오라 성능이 떨어지고 신 제품이라 좋은 건 아니라고 했다. 혈통과 족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의 오디오 중 가장 오랜된 건 1930년대 제품이다. 지금은 상표가 다 떨어져 나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없다. 튜브가 망가져 소리도 나지 않는다. “클래식 오디오가 신기한 건 나무를 사용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만들어진 오디오는 복잡하지 않아 고장이 잘 안 나고 고장이 나도 고치기가 쉽다고 한다.고교 시절 축음기에서 진공관 트랜지스터 오디오로 바꿨다. “음향 기술의 발전은 사실 1955년 진공관이 나오면서 끝이 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후 많이 발전한 듯하지만 발전이라기보다는 디지털화했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디지털 음향은 다이내믹하지만 인간미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찾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이 쌓인 오디오“아버지께 선물 받은 매킨토시 275 오디오는 그 존재만으로 힘이 됩니다.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프리앰프를 사려고 손수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들어봤을 정도로 애착이 가는 오디오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같죠.”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근엄함이 묻어난다고 했다.악당이반을 시작하면서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오디오는 프로 장비 시스템이다. 좋은 소리를 많은 사람에게 들려줘야 하는 입장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스위스 DCS사의 DSD 세트를 구입했다. 제품 한 개에 1억 정도로 모두 3세트를 구입했다.김영일 대표는 다른 컬렉터들과 달리 한 번 들어온 오디오는 팔지 않는다. 100대의 오디오를 소장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디오 하나하나에서 시간의 소중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오디오 애호가의 부류를 나눠 볼 수 있다. 흔히 오디오 매니어라고 하면 기기 자체가 좋아서 시리얼 넘버까지 신경쓰며 오래된 아이템에 빠져있거나, 디자인을 중심으로 모으거나. 의미가 부여된 기기를 모으는 사람이다. 김 대표는 좀 더 나은 음질의 음악을 즐기기 위해 오디오를 좋아한다.오디오 사랑은 음반 모으기에도 영향을 미쳐 LP 판 3000장 이상을 소장했다. LP 판을 모으기 시작한 건 중학시절부터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LP 판과 카세트테이프가 주류였다. 돈만 생기면 음반을 사들였다. 음반이 너무 많아 보관이 힘들게 되자 비닐 커버를 직접 주문해 음반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보관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도 LP 판을 꾸준히 모은다.LP 판은 강원도 평창에 보관한다. 대부분 고전음악·국악이나 1970~80년대 가요 음반이다. 초기에는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좋더니 지금은 국악과 흘러간 가요를 다시 듣는다. 그런 걸 보면 절대적인 음악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돌아보면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오디오 앞에 앉아서 오늘은 어떤 오디오로 음악을 들을까 고민하는 행복한 사치를 종종 누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과거에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듣고 싶은 그리움에 기존 오디오를 꺼내는 것을 보면, 오디오는 추억이고 그리움인 것 같아요.”